
한겨레 김창광 선임기자
“꿈에서도 그리운 목소리는 이름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아…”
가수 구하라씨가 세상을 등진 11월24일,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선 가수 아이유(이지은)의 콘서트가 진행되고 있었다. 연예계 동료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그는 “정말 이런 기분으로 노래를 부르게 될 줄은 몰랐어요”라며 한숨을 내쉰 뒤 콘서트 마지막 곡으로 자신의 노래 를 불렀다. 아이유는 전날(11월23일) 콘서트에서도 “되게 사랑하는 친구를 이제 못 보게 됐다”며 한 달 전 세상을 떠난 ‘절친’ 설리(최진리)를 추모하기도 했다. 이 장면은 콘서트에 참석한 관객이 촬영한 영상으로 유튜브에 계속 공유되며 두 젊은 여성 연예인의 죽음에 슬퍼한 많은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다.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추모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안타까운 죽음이 더는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누군가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간 사회를 바꾸겠다는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이다. 무언가 바뀌지 않는 한 이름은 계속 불릴 수밖에 없다.
12월8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첫 내한공연을 한 아일랜드 출신 세계적인 밴드 유투(U2)도 이름을 불렀다. 유투는 무대 뒤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 세계를 움직인 여성들의 얼굴을 띄우면서 설리를 추모했다. “우리 모두가 평등해질 때까지는 우리 중 누구도 평등하지 않다”는 메시지와 함께.
12월10일 어머니 김미숙씨와 노동자들은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앞에 서서 아들이자 동료인 김용균의 이름을 불렀다. 김용균은 1년 전 이날 발전소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졌다. 그가 떠나고 그의 이름을 딴 법이 생겼다. 하지만 가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받은 자료를 보면 김용균이 숨진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11일부터 올해 10월30일까지 모두 523명이 작업장 사고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가 떨어지거나 어딘가에 끼이거나 깔려 생명을 잃었다. 김용균의 죽음을 세상에 처음 알렸던 발전노동자 이태성씨는 추모 발언에서 “2주기에는 (김용균에게) 약속을 지켰다고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용균의 1주기였던 이날, 국회에서는 또 다른 부모가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패스트트랙 법안 충돌로 공전을 거듭하던 국회는 이날 오전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9살 민식이의 부모는 법 통과를 지켜본 뒤 “민식아, 너를 다시 못 보는 그 아픔에서 엄마·아빠가 평생 헤어나올 순 없겠지만, 그래도 너의 이름으로 된 법으로 다른 아이들이 다치거나 죽거나 그런 일은 막아줄 수 있을 거야”라고 말하며 눈물을 쏟았다.
세상을 떠난 이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아이유는 온 힘을 짜내 를 부르며 콘서트를 마무리했다. 마치 우리 모두에게 부탁하는 것처럼. “수없이 잃었던 춥고 모진 날 사이로 조용히 잊혀진 네 이름을 알아. 멈추지 않을게. 몇 번이라도 외칠게. 믿을 수 없도록 멀어도 가자. 이 새벽이 끝나는 곳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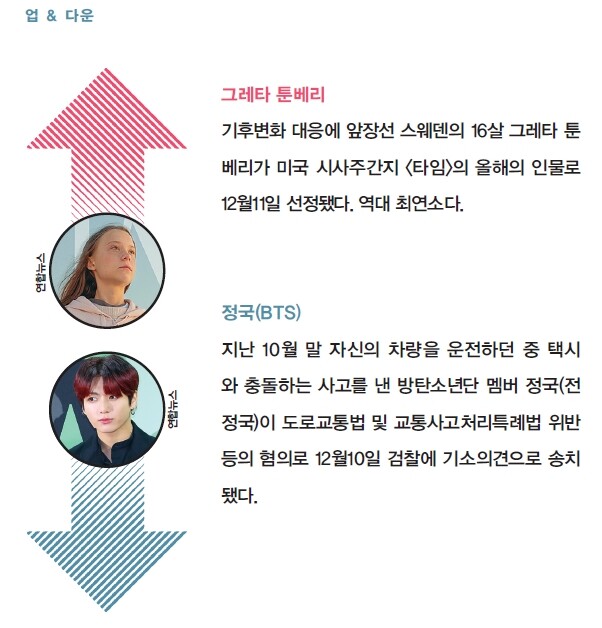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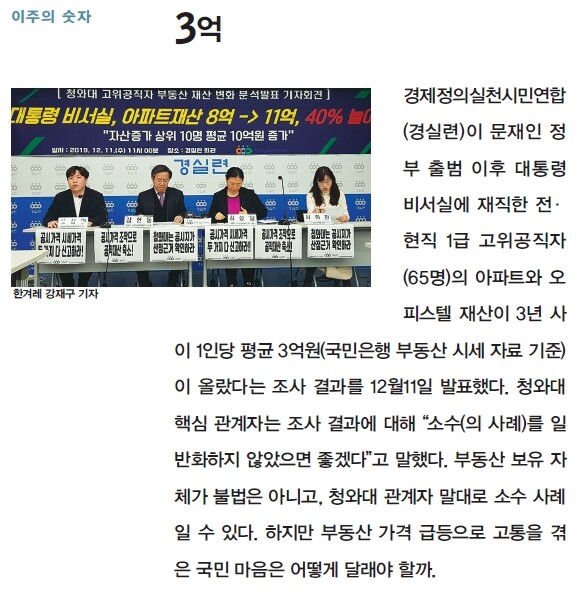
.
블라블라
문학동네 101호

.
계간 는 지금은 대형 출판사로 성장한 문학동네를 견인해왔다. 문학평론가 서영채의 회고( 100호)에서 나오듯 2호는 문인들이 경제적으로 도움을 줘서 무사히 나올 수 있었다. 그런 감춰진 사정에 비하면 1호의 호기는 대단했다. ‘어떤 새로운 문학적 이념이나 논리를 표방하지 않으면서 대신 현존하는 여러 갈래의 문학적 입장을 다양하게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문학의 광장이 되겠다는 말이지만, 사회와 문화가 한 몸이던 시대에선 이단아로 비쳤다.
1990년대는 가 인지한 대로 ‘적이 사라진 시대’였다. 서태지와 아이들이 1992년 데뷔하며 ‘신세대 담론’까지 등장한 이른바 ‘문화 폭발의 시대’였다. 그에 맞춰 젊은 잡지가 쏟아져나왔다. 1990년은 사회문화에서 문화로 그리고 문화 분야 전문지로 수렴해가는 방향이었다. 사회과학지 (1993년 가을), 사회문화지 (1994년 겨울), 영화 전문 월간지 (1995년 5월), 영화 주간지 (1995년 4월14일), 문화 월간지 (1996년 6월20일)이 연이었다. 2019년은 어떤 시대인가. 사반세기가 지나서 다시 문학과 사회를 함께 생각하는 ‘레트로’인가. 발 빠르던 계간지의 변신에서 유추해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구둘래 기자 anyone@hani.co.kr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박정훈, ‘항명’ 기소 군검사 재판서 “권력의 사냥개들” 비판

동사무소 직원 ‘점 하나’ 실수로 남동생이 남이 되었다
![[단독] “새벽 2시 출근” 강동구 26살 청소노동자, 일자리 잃고 거리로 [단독] “새벽 2시 출근” 강동구 26살 청소노동자, 일자리 잃고 거리로](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25/53_17720019159043_20260225502317.jpg)
[단독] “새벽 2시 출근” 강동구 26살 청소노동자, 일자리 잃고 거리로

국힘, 지방선거 1·2호 인재 영입…손정화 회계사·정진우 원전엔지니어

‘농지 전수조사’ 준비 착수…매각명령, 매해 1000명서 대폭 늘 듯

스케이트 날이 휘면 다시 펴서…아픈 누나 곁 엄마에게 메달 안긴 아이

3차 상법개정안 통과…‘자사주 소각 의무화’ 증시 더 달굴 듯

“이 대통령, 어떻게 1400만 개미 영웅 됐나”…외신이 본 K-불장

공군 F-16 전투기 추락…대책본부 구성, 조사 착수

“누가 반대했나 밝혀라”…통합안 보류에 국힘 TK 의원-지도부 충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