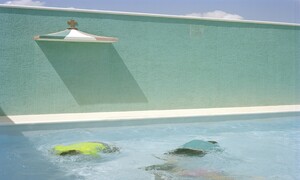지난 4월6일 한겨레신문사 4층 회의실에서 <한겨레21> 교육연수생 3기 한채민, 이채연, 구은모, 김혜인씨(왼쪽부터 시계방향)가 정은주 기자가 진행하는 특강을 듣고 있다. 박승화 기자
정은주 기자는 스스로 게을러졌다고 느낄 때 목욕탕을 간다.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다. 때를 밀어주는 아주머니의 손길에서 깨닫는다고 했다. 표정을 볼 수는 없지만 몸에 닿는 손길 끝에서 마음이 느껴진다. 상대가 나에게 마음을 두고 때를 미는지 말이다. “하물며 이게 느껴지는데 글은 어떻겠어요.” 그가 현장에 한 번이라도 더 방문하는 이유다.
정 기자는 익숙함에 속아 게을러지는 것을 경계하라며 특강을 시작했다. ‘내가 열심히 하는가?’ 이 질문을 끊임없이 물었기에 그나마 다른 이에게 보여줄 만한 기사 서너 개를 쓸 수 있었다고 정 기자는 말했다. “그렇게 14년이 쌓여 쓸모 있는 기자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특종은 어떻게 나오는 것 같아요?” 가장 묻고 싶었던 질문을 정 기자가 먼저 교육연수생에게 했다. “특종은 99번의 낙종을 견뎌야 오는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면 기회가 오지 않는다. 하지만 실패를 개인적 차원에서 받아들이지 말라고 그는 당부했다. 기자는 환영받는 상황보다는 거절당하는 상황을 마주할 가능성이 많다. ‘저 사람은 기자를 싫어하는 거지 나를 싫어하는 것이 아냐’라고 되뇌었다고 그는 말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다.
기자의 생활은 대부분 특종과 거리가 먼 ‘일상적 기사’로 이뤄져 있다고 했다. 기삿거리를 고민해 발제하고 기사를 쓰고, 다시 발제하고 기사를 쓰는 반복 속에 쓰는 대부분의 기사는 일상적 기사다. “매일 그렇게 일상적인 기사를 쓰고 견디고 또 해내다보면 다시 큰 기획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는 일상에서 일을 잘해야 하는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쉽지만 쉽지 않은 비법. 인내와 끈기, 관찰의 힘이 필요하다.
교육연수생들은 취재에 대한 현실적인 질문들을 던졌다. 세월호 사건처럼 취재원 인터뷰를 하기 힘들 때는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 “토요일 새벽 차로 전남 진도에 갔는데 월요일 아침에 올라올 때까지 한 명도 인터뷰를 하지 못했어요.” 슬픔에 잠겨 있는 유가족들에게 질문을 건네기는 힘들었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는 ‘펜 기자’이기 때문에 그 공간의 공기를 서술해도 돼요. 방송은 그림을 찍지 않으면 보도하기 힘들지만, 펜 기자는 서사 방식을 활용할 수 있어요. 밤인지 낮인지 모르는 환한 불, 엄마들이 쓰러졌다가 울었다가 앉아 있다가 하는 장면을 그대로 옮겨 기록해도 돼요.”
‘글을 못 쓴다고 느낄 때는 어떻게 하냐’는 질문에는 “기자는 소설가가 아니잖아요”라고 정 기자는 말했다. “그러니 취재를 더 많이 해야 해요. 100을 취재하면 20이 기사로 들어가요. 언론사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취재죠. 기자는 미문을 쓰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그는 공부가 중요하다고 했다. “인터뷰에선 좋은 질문을 해야 해요. 내가 묻지 않으면 저 사람은 말하지 않아요. (취재할) 분야를 공부해서 가야 해요. (인터뷰이도)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채요. 인터뷰는 일종의 소개팅이에요. 취재원에게 관심을 가져야죠. 내가 많이 알면 전문가들이 인터뷰를 하며 나와 상의하게 돼요.”
교육연수생들의 질문은 이어졌다. “소재만 보고 글의 방향을 어찌 잡을지 모를 때는 어떻게 하죠?” 정 기자는 이렇게 말했다. “자유무역협정(FTA) 기사를 쓸 때는 협정문의 번역 오류를 잡아야겠다고 생각해서 기사를 쓴 게 아니라, 공부하다보니 보인 거예요. 모든 주제는 내가 공부를 하다보면 나와요.”
‘자신의 실력이 부족하다 느낄 때 이겨내는 방법은 뭐냐’는 질문에 정 기자는 “바닥을 보며 올라가라”고 답했다. “산에 오를 때 산꼭대기를 보면 못 오르지만 바닥을 보며 꾸준히 걷다보면 올라갈 수 있잖아요. 나는 리스트를 적고 하나씩 지워가며 일을 해요. 아주 디테일한 것부터 지워요. 관련 기사 모으기, 사례 모으기 등 세세하게 말이죠. 날짜가 많으면 미루게 되는데 하루하루 할 일을 적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할 것을 내일로 미루지 않고 해요. 근데 일은 너무 욕심내서 잡지 마요. 그러면 그게 또 일이 되니까.”
정 기자는 “취재할 때 머뭇거리지 말라”고 당부했다. “질문을 하는 건 기자의 권한이기 때문에 예의를 갖춰 질문하면 돼요. 이거 물어도 될까, 이런 자기검열을 너무 많이 하지 마요. 내가 남의 시간을 뺏는 것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만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한마디를 해도 (취재원이) 알아요.”
그렇게 일상적인 기사를 쓰며 준비하고 공부하며 쓴 글 가운데 정 기자는 “나 자신에 대한 칭찬 같은 기사가 있다”며 하나를 예로 들었다. 제952호에 실린 ‘살인했다 아무도 죽지 않았다’ 기사다. 2007년 충남 보령에서 발생한 허위 자백 사건에 관한 기사인데, 허위 자백의 허점에 대해 총 6부작으로 다룬 기획의 첫 표지이야기였다.
사건이 발생한 시기는 2007년이고 사건에 대해 들은 것은 2009년이지만, 기사로 보도된 해는 2013년이었다. 정은주 기자는 취재원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4년을 참고 기다렸다고 했다. “당시 재판 중이었고 이를 보도하면 취재원이 다치기 때문에 보도하지 않았어요.” 당시엔 비보도 조건으로 재판 관계자에게 이야기를 들었다. 정 기자는 ‘특종’을 쓰며 한 번으로 소비하는 대신, 사건을 마음에 품었다고 했다.
이후 그 재판 관계자는 허위 자백에 대한 논문을 썼고 이와 관련된 다른 이들의 논문도 나오기 시작했다. 정 기자는 기다린 끝에 논문을 작성한 사람들을 만나 취재를 시작했다. “방법은 생겨요. 모든 사람이 안 다치게 쓸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정 기자는 “기자는 외로운 직업”이라고 말했다. 기자는 사건을 주도하는 이가 아닌 사건을 ‘따라다니는 이’다. 그렇기에 개인적 약속을 어기는 것은 다반사다. “맨날 약속을 어기니까 어느 순간 친구가 없어져요”라고 정 기자는 웃었다. 그럼에도 그는 말한다. “난 기록하는 자인 내가 좋으니까, 나머지는 다 포기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일이기에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끊임없이 마주한다는 정은주 기자. “저는 이 일이 너무 좋고, 잘하고 싶어요. 좋아하는 일인데 못하면 속상하니까 계속 몰두하는 것 같아요.”
※카카오톡에서 을 선물하세요 :) ▶ 바로가기 (모바일에서만 가능합니다)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윤석열 출국금지’ 국회 보고했다고…박성재 “야당과 결탁했냐” 질책

트럼프 “대법 결정 갖고 장난치는 국가, 훨씬 더 높은 관세 부과”

‘사법개혁 3법’ 통과 앞…시민단체들 “법왜곡죄, 더 숙의해야”

배현진 지역구 공천, 중앙당이 하기로…친한계 공천권 제한
![그렇게 형이 된다...감독 김남국, 주연 정청래 [그림판] 그렇게 형이 된다...감독 김남국, 주연 정청래 [그림판]](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6/0223/20260223503467.jpg)
그렇게 형이 된다...감독 김남국, 주연 정청래 [그림판]

몸에 피 한방울 없는 주검이 되어 돌아온 새 신랑

의료 공백 메웠던 간호사들, 6개월째 여전히 전공의 일 떠맡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대낮 음주운전…감봉 3개월

김혜경 여사·브라질 영부인, ‘커플 한복’ 맞추고 친교 활동

‘노스페이스’ 영원그룹 회장, 82개 계열사 은폐해 고발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