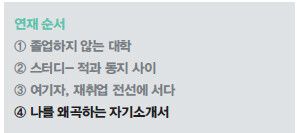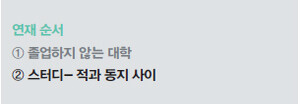한국 대기업은 다 비슷하다. 조직문화는 경직돼 있고 상하관계는 분명하다. 아침 6시에 출근해 일찍 퇴근해봤자 밤 11시인 경우도 수두룩하다. 직장인들이 밤늦게까지 환하게 불을 켜놓고 일하는 모습.한겨레 자료
| |
“돈 버는 기계로 살까봐 두려웠어요.”
대우건설에서 2년6개월간 일하다 사표를 낸 이종수(28)씨가 말했다. “흔히 대기업은 돈 주는 만큼 일을 시킨다고 하잖아요. 새벽에 출근해서 새벽에 퇴근했어요. 젊을 땐 견디겠지만 평생을 이렇게 살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토목공학과를 나온 종수씨는 댐을 만들고 도로를 닦느라 지방으로만 다녔다. 아침 6시에 출근해 일찍 퇴근해봤자 밤 11시고 보통은 12시, 새벽 1시에 끝났다. 월·화·수·목 그렇게 일하다 금요일에는 저녁 7시에 KTX를 타고 수도권으로 올라왔다. 그래야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금요일에 야근을 못했으니 일요일 저녁에 기차로 내려가 밤 11시부터 이튿날 아침 6시까지 철야를 했다. 월요일은 자연스럽게 퇴근 없이 출근했다.
어느 날 선배가 물었다. “힘드냐?” 그 순간 종수씨는 무너져내렸다. “네, 못하겠어요.” 공무원 준비할 거라며 사표를 냈다. 몇 년씩 준비해도 될까 말까라며 동료가 뜯어말렸다. 이런 대기업에 다시 취업할 수 있을 것 같냐고도 했다. 두려움에 종수씨는 사표를 돌려받았다. 하지만 2개월 뒤 다시 흔들렸다. 역시 살인적인 업무 강도 탓이었다.
지방 국립대 출신인 종수씨는 취업할 때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GS·코오롱·대우 등 건설사에 지원했는데 다 붙었다. 수석졸업자인데다 토목 관련 자격증만 3개가 있었다. “건설회사가 충북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면 평가를 지역 교수가 맡아요. 그 학교 출신 직원을 보내서 부탁해야죠. 서울대 출신이라고 해도 교수는 만나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방대학 출신을 꼭 뽑죠. 어정쩡한 수도권 대학 나온 것보다 합격률이 높아요.”
종수씨가 두 번째 사표를 내자 본사에서 경기도 평택으로 보내줬다. 집이 가까워지고 업무도 많지 않았다.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다시 지방이나 해외 건설현장으로 가야 했다. “평생 가족과 떨어져 살긴 싫었어요.” 8개월 만에 공기업에 합격했다. “입사 동기 중 30%가 사표를 냈어요. 건설사업을 발주하던 공기업으로 많이 옮겼죠. 한국도로공사·한국수자원공사 같은. ‘갑질’하던 발주처에 한이 맺혀서요.” 공기업에 들어가서 가장 좋은 건 무엇일까. “서울에서 친구를 저녁에 만날 수 있다는 거요. 월급은 이전 회사의 60%지만 전혀 불만이 없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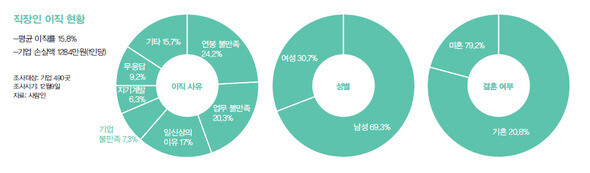
1
다 만족하는 건 아니다. 공기업에 다니는 김종범(28)씨는 이직을 준비한다. 불명확한 관료문화, 낮은 연봉이 싫어서다. “인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요. 승진도 성과를 많이 내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줄서기 문화라고 하죠? 거기에 좌지우지됩니다.” 낙하산 인사도 짜증난다. 현업을 모르는 외부 인사가 경영진으로 와서 조직을 마구 개편한다. “몇 년 새 일이 많아진 부서인데 인원은 자꾸 줄여요. 야근은 늘어나는데 시간 외 보상은 없고.” 종범씨는 안정적인 직장만 찾지 말라고 했다. “대기업 직원처럼 일하는데 연봉이 1천만원 이상 적어요. 이 돈 받으려고 야근하나 싶을 때가 많죠.”
반대로 조민혁(27)씨는 연봉 1천만원을 줄여 ‘안정적인 직장’으로 갈아탔다. 첫 직장은 미래에셋이었다. “돈은 많이 받았죠. 문제는 고용불안이었어요. 최근 금융권 인원 감축이 엄청 심해요. 한화투자증권도 250명 줄였잖아요. 전 직원이 2500명밖에 안 되는데 10명 중 1명꼴이죠. 보험업계 1위인 삼성생명도 감축한다고 하고. 나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항상 불안했죠.” 민혁씨도 공기업으로 눈을 돌렸다. 퇴근해 공부했다. 술 먹고 들어와도 그랬다. “스펙이 평범한 편이에요. 토익은 800점 후반이고 자격증은 8~9개예요. 다행히 수석으로 졸업해서 성적표에 ‘1등’이라고 쓰여 있는 게 유일한 장점이죠. 그래도 서류전형에서 엄청 떨어졌어요.”
공기업 지원자의 스펙이 워낙 빵빵해서 민혁씨는 인턴 시험을 먼저 봤다.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있으니까 말이다. 한국수자원공사에 합격해 5개월간 다녔다. 나이도 있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대기업 마케팅 분야에도 지원했다. 운 좋게도 붙었다. 입사해보니 입사 동기 300명 가운데 지방대 출신은 50명도 안 됐다.
대기업에 입사하는 지방대 출신이 적다는 데 종수씨도 동의했다. 하지만 바라보는 관점은 민혁씨와 달랐다. “지방 국공립대 출신 중에서 10%만 대기업에 들어가죠. 나머지는 이름도 모르는 중소기업에 가요. 그런데 원하는 분야라면 그게 나아요. 대기업은 정말 능력 계발이 안 되거든요. 그냥 소모품으로 쓰다가 버려져요. 반면 작은 기업에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하지만 중소기업을 다녔던 도지성(28)씨는 손사래를 쳤다. 학사장교(ROTC) 출신인 지성씨는 중소 물류회사의 사무직으로 취업했다. “조급한 마음에 쉽게 아무 곳이나 들어갔죠. 막상 해보니 사무직인데도 지게차까지 몰아야 했어요. 바쁠 때는 아무 데서나 인원을 빼서 지원해야 하는, 체계도 안 잡혀 있는 곳이었죠. 새벽 1~2시까지 일하는데 월급은 150만원 받았어요.” 회사를 때려치우고 6개월간 준비해 농협에 입사했다.
‘대책 없는 퇴사’는 사회 초년생이 잘 저지르는 실수다. 삼성·효성·두산을 거쳐 다른 대기업에 안착한 최기훈(32)씨도 그랬다. 기훈씨는 2008년 삼성에 입사했다. 취업난을 뚫었다는 기쁨도 잠시, 그는 상하·종속 관계가 뚜렷한 조직문화에 적응하지 못했다. “상사와 내가 다르고, 그가 직급이 높으니까 인정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자꾸 상사가 틀렸다고 생각했죠.” 갈 곳도 정하지 않고 1년 만에 사표를 냈다.
이후 삼성 출신임을 밝히면 면접관이 왜 그만뒀느냐고 집요하게 물었다. 결국 기훈씨는 경력을 숨기고 신입사원으로 입사지원서를 냈다. 150곳에 지원해 30곳에서 면접을 봤고 5곳에 최종 합격했다. 그중 효성이 가장 큰 기업이었다. 효성은 사원에게 책임과 권한을 많이 줬다. 자기 성장의 기회가 많았지만 한편으론 업무 강도가 셌다. 대내외 수상 경력이 쌓이자 기훈씨는 이직을 검토했다. 헤드헌터를 통해 10개 회사에 원서를 냈고 3곳에서 최종 합격했다. 두산이 그중 하나였다. 기훈씨는 삼성과 효성의 경력을 인정받아 그곳으로 옮겼다. 두산의 조직문화와 맡은 일 등에 상당히 만족했다. 하지만 더 높은 연봉을 제시하는 다른 대기업이 나타났다. 1년8개월 만이었다.
2008년으로 돌아간다면 삼성을 그만둘까? “그때는 세상을 몰랐죠.” 기훈씨가 말했다. “한국 대기업은 다 비슷해요. 조직문화는 경직돼 있고 상하관계는 분명하죠. 그때는 처음이라 몰랐던 것뿐이고요. 그때 너무 쉽게 그만뒀고 혹독한 재취업 과정을 경험했죠. 삼성의 연봉이나 처우를 생각하면 참아야 했죠.” 이은미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트럼프, 새 ‘글로벌 관세’ 발효…일단 10%로 시작

스케이트 날이 휘면 다시 펴서…아픈 누나 곁 엄마에게 메달 안긴 아이

‘어디서 3·1절을 팔아?’…전한길 콘서트, 허위 신청으로 대관 취소

전남·광주 행정통합법, 법사위 통과…충남·대전, 대구·경북은 보류

이 대통령 “다주택 자유지만 위험 못 피해…정부에 맞서지 마라”
![[속보] ‘건진법사’ 전성배 징역 6년…김건희에 통일교 금품 전달 [속보] ‘건진법사’ 전성배 징역 6년…김건희에 통일교 금품 전달](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24/53_17719136432313_20260224502580.jpg)
[속보] ‘건진법사’ 전성배 징역 6년…김건희에 통일교 금품 전달

쌓여가는 닭고기, 못 받는 쿠팡 주문...‘배민온리’에 갇힌 처갓집 점주들

이 대통령 “농지 값도 비정상…투기용 보유 무의미하단 인식 만들어야”

‘무기징역’ 윤석열 항소…“1심 모순된 판단, 역사에 문제점 남길 것”

이 대통령 “촉법소년 연령 낮추자는 의견 압도적 다수…두 달 뒤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