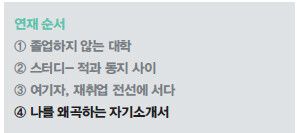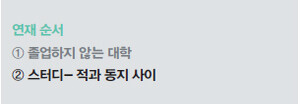“선생님, 남자친구랑 자봤어요?” 당황한 나는 못 들은 척 길을 건넜다.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혼내는 소리가 났다. “어린 게 발랑 까져서.” 나는 서울의 한 사회복지관에서 한 학기 동안 자원봉사를 했다. 공부방에서 저소득층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었다. 대학이 졸업 요건으로 정한 자원봉사 시간인 36시간만 채우면 그만둘 작정이었다. 일주일이 지나 아이를 만났을 때 불쾌감이 다시 올라왔다. ‘말도 섞지 말자.’ 꽤 살갑게 지내던 아이였지만 나는 외면했다. 아이를 지도해야 한다는 책임감도 사명감도 내겐 없었다.
우리 자원봉사자를 관리하던 사회복지사가 말했다. “10~20대 자원봉사자는 모두 스펙 때문에 오죠. 잘 아는데도 한숨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엄마가 아들·딸의 시간을 채워주려고 대신 올 때 그렇죠. 스스로 나서지도, 남을 돌보지도 않았는데 ‘자원봉사 확인서’를 써달라고 하니까요.” 나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공부방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나는 끊임없이 벽시계를 쳐다봤다. 그렇게 꾸역꾸역 시간을 채우며 조금 더 취업에 가까워졌다고 생각했다.
지난 8월 나는 새로운 자원봉사에 지원했다. 세계영상위원회가 주최하는 씨네포지움 총회. 대기업 엔터테인먼트 계열사에 지원할 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국제영화제에는 항상 지원자가 몰린다. 그래서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과해야 자원봉사할 기회를 얻는다. 나는 프로그램팀을 선택했다. 통역을 해야 하는 초청팀보다 선발 가능성이 높을 듯싶었다. 서류전형은 통과했다. 면접은 20분간 진행한다고 했다.
면접장에 들어서니 외국인 면접관이 앉아 있었다. 함께 들어간 22살 여학생은 몸을 떨었다. 나에게 먼저 말을 걸까봐 외국인에게 시선을 주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말을 걸었다. “씨네포지움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가요.” 머리가 새하얘졌다.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옆 친구는 불문과라는 말에 프랑스어까지 시켰다. 그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면접장을 나올 때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였다. 기운과 맥이 다 빠졌다. “영어 면접 본다는 거 알았어요?” 내가 물었다. “아니요. 불어 면접 본다는 것도 몰랐어요.” 여학생은 울 것 같은 표정이었다. 내가 불문과가 아니라는 게 순간 고마웠다. 최종 결과는 나도 불합격이었지만. 이은미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호르무즈 봉쇄 직전 한국행 유조선만 ‘유유히 통과’…사진 화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식으로 국민을 속이나 [박용현 칼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식으로 국민을 속이나 [박용현 칼럼]](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04/53_17726118413306_20260304503108.jpg)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식으로 국민을 속이나 [박용현 칼럼]
![[단독] ‘왕사남’ 엄흥도 실제 직계후손 출연했다…누구지? [단독] ‘왕사남’ 엄흥도 실제 직계후손 출연했다…누구지?](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04/53_17726139703969_20260304503247.jpg)
[단독] ‘왕사남’ 엄흥도 실제 직계후손 출연했다…누구지?

‘순교자’ 하메네이에 ‘허 찔린’ 트럼프…확전·장기전 압박 커져

김성태 “검찰 더러운 XX들…이재명, 말도 안 되는 것들에 엮여”

팔 잃은 필리핀 노동자와 ‘변호인 이재명’…34년 만의 뭉클한 재회

한국인 선원 186명, 페르시아만서 발 묶인 선박들에 탑승 상태

‘이재명 대선후보 자격 박탈’ 향해 초스피드 질주한 조희대 코트

하룻밤 공습에 1조원…트럼프는 “전쟁 영원히” 외치지만

국방부, 장군 아닌 첫 국방보좌관 임명 나흘 만에 업무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