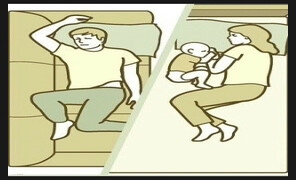<한겨레> 김태형
신기하게도 임신 사실을 인지함과 동시에 임신 증상이 죄다 나타나기 시작했다. 알기 전엔 괜찮더니 알고 나니 왜 이런가 해서 나 스스로도 꾀병인가 싶을 정도였다. 경찰서 기자실에 앉아 있노라면 하염없이 졸음이 쏟아졌고, 점심시간이면 건물 안에 퍼지는 구내식당의 반찬 냄새에 구역질이 났다. 특히 고기 냄새가 미치도록 싫었다. 배가 당기고, 취재원 한 명만 만나고 나도 쉽게 피로해졌다.
경찰서 휴게실에 몸을 눕히는 날이 많아지던 어느 날, 함께 영등포 라인(서울의 강서·영등포·구로·양천경찰서를 뜻한다)을 출입하는 기자단의 회식이 있었다. 장소는 삼겹살집. 고기 냄새를 맡기가 두려웠으나 (임신 사실을 몰랐을 때) 내가 설레발을 쳐서 만든 자리니 안 갈 수 없었다. 지글지글 익는 고기를 앞에 두고 다 같이 건배, 원샷을 했다. 술잔을 그대로 내려놓는 내게로 시선이 쏠렸다. 타사 후배 기자가 매서운 눈초리로 나를 살피며 묻는다. “선배, 혹시 임신했어요?”
무서운 기자들. 덕분에 순식간에 임신 사실을 고백했다. 거의 모든 언론사 기자들이 다 있으니 상황은 마치 임신 발표 기자회견과 같았다. 타사 기자들은 큰 리액션으로 임신을 축하해주었다. 결혼한 줄도 몰랐는데 임신이라니 물먹었다는 반응부터 일부러 밖에 나가 담배를 피우고 오는 모습까지 다양한 감동을 맛본 뒤, “임신부는 빠져줄 테니 2차는 편하게 즐기라”는 말을 남기고 귀가했다.
다음날부터였다. 타사 여기자들이 내게 은밀히 말을 걸었다. “선배 회사는 임신하면 내근 부서로 바꿔주나요?” “임신했다니까 회사에서는 뭐래요?” “회사에서 육아휴직은 줘요?” “결혼에, 임신까지 하다니 선배 용기가 대단해 보여요.” “저는 결혼도 자신이 없어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는 ‘커리어우먼’들의 가슴 아픈 모습이었다.
한 방송사 여기자는 이렇게 푸념을 늘어놓았다. “우리 회사는 임신하면 야근 하나 빼준 지도 얼마 안 됐어요. 전설적인 아무개 선배 있잖아요. 그분이 임신했을 때 “남자랑 똑같이 일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며 부서도 안 바꾸고 야근까지 다 해버렸거든요. 그 모습을 본 뒤 회사에서는 임신해도 야근까지 하는 걸 당연시해요. 몇 년 전 참다못해 한 선배가 “임신했으니 야근을 빼달라”고 투쟁한 끝에 요즘에는 간신히 야근을 빼주는 수준이 됐죠. 그러니 임신하는 게 무서워요. 눈치도 보이고, 힘들어서 일을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여기자는 이렇게 말했다. “회사 선배와 연애하고 있어요. 연애 사실이 알려지고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 쪽은 손해 보는 게 없겠지만 저는 어떻게 될지 두려워요. 일로 성공하고 싶은데… 그래서 결혼도 자신이 없어요. 선배는 어떻게 결혼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임신까지 해요?”
너무나도 똑똑하고 예쁘고 당차 보이는 후배들의 이런 심경 고백에 무척 공감하면서도 매우 당황했다. 모두들 호수 위의 백조처럼 이리도 힘겹게 발버둥치며 버티고 있었단 말이냐. 임신을 확인한 뒤 엄습한 불안감은 나만의 것이 아니었구나. 좋다, 내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세상과 투쟁하리라. 임신한 나를 조직과 사회가 단순히 ’질 떨어진 노동자’로 취급하지 않도록 내가 먼저 나서리라.
물론 는 대한민국의 어떤 언론사보다 임산부의 인권을 보호해주는 곳이다.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기자들도 아이의 양육을 위해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기도 한다. 모두 10여 년 전부터 몇몇 선배들이 투쟁적으로 노력한 덕분이다. 어찌됐든 이 조직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임신부 투쟁’을 펼쳐보리라. 이러한 투쟁 결심은 의외의 결과를 낳았으니… 그 이야기는 다음회에 계속하겠다.
임지선 한겨레 기자 sun21@hani.co.kr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이준석-전한길 ‘끝장토론’…“25년간 극비로 부정선거 구축” 황당 주장

이 대통령 “개 눈에는 뭐만”…‘분당 아파트 시세차익 25억’ 기사 직격

민주 “응답하라 장동혁”…‘대통령 집 팔면 팔겠다’ 약속 이행 촉구

송언석, 천영식 8표차 부결에 “당 의원 일부 표결 참여 못해, 사과”

동사무소 직원 ‘점 하나’ 실수로 남동생이 남이 되었다

트럼프 “이란 관련 큰 결정 내려야”…“가끔은 군 활용해야” 언급도

이진숙 “한동훈씨, 대구에 당신 설 자리 없다” 직격
![왜 부자는 수돗물을 마시고 가난한 사람이 병생수 마실까 [.txt] 왜 부자는 수돗물을 마시고 가난한 사람이 병생수 마실까 [.txt]](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27/53_17721459993113_20260226504293.jpg)
왜 부자는 수돗물을 마시고 가난한 사람이 병생수 마실까 [.txt]
![한밤중 다리에 쥐나는 ‘하지정맥류’…“자연 회복 불가능, 빨리 치료” [건강한겨레] 한밤중 다리에 쥐나는 ‘하지정맥류’…“자연 회복 불가능, 빨리 치료” [건강한겨레]](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27/53_17721570592077_20260227501013.jpg)
한밤중 다리에 쥐나는 ‘하지정맥류’…“자연 회복 불가능, 빨리 치료” [건강한겨레]

파키스탄, 아프간에 전쟁 선포…탈레반 집권 후 최악 충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