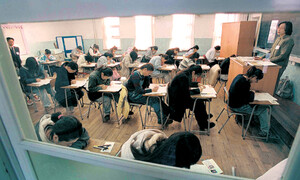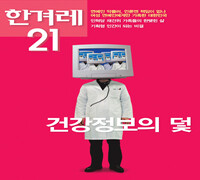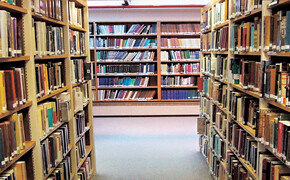▣ 김창석 기자 kimcs@hani.co.kr
‘불가근불가원’(不可近不可遠).
수습기자 시절부터 귀에 박히도록 들은 얘기다. 기자와 취재원 사이의 이상적인 관계로 말이다. 너무 가까워도, 너무 멀어도 안 되는 사이라니….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지. 솔직히 말하면 현실에서는 실현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종종 했다. 주변 동료, 선후배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실제로 기자들은 ‘친한 취재원’과 ‘친하지 않은 취재원’의 단순분류법을 쓰고 있었다.
‘근묵자흑’(近墨者黑).
검은 흑먹을 가까이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검어지는 것처럼 사람도 주위 환경에 따라 쉽게 변할 수 있다는 이 경구는 기자들의 인식이 출입처에 얼마나 좌우되는지를 설명할 때 제격이다. 내가 경찰서를 출입할 때 가족들은 내게 “형사처럼 말하고 행동한다”고 했다. 내가 검찰청 출입기자였을 때 가족들은 “검사 같다”고 했다.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알게 모르게 그런 분위기가 풍겼나 보다. 얼마 전 한 후배 기자가 이런 고민을 털어놓은 적이 있다. “정치권을 출입하게 된 입사 동기의 어깨에 힘이 너무 들어가 있어요.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가 정치인이 된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다 그렇게 되는 건가요?” 첨예한 정치적 사안이 불거졌을 때 여당 출입기자와 야당 출입기자가 언성을 높여가며 토론하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한다.
‘간담상조’(肝膽相照).
간과 쓸개를 꺼내어 서로 내보이다. 이렇게 되면 기자와 취재원은 마음을 툭 터놓고 격의 없이 사귀는 친구 사이가 된다. 자고로 사람 사이의 관계는 밥과 술을 함께 먹으면서 깊어진다. 만고의 진리다. 기자들이 출입처에 나가게 되면 그곳으로 출근하고 그곳에서 퇴근하게 된다. 한마디로 ‘동거동락하는’ 시스템이다. 출입처의 논리에 빠지지 말라는 충고를 아무리 들어도 취재원과 같은 우물에서 하늘을 보는 개구리 신세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표변’(豹變).
취재원은 기자에게 마냥 잘해줄 수 있지만, 기자가 취재원에게 영원히 그럴 순 없다. 남을 비판하고 잘잘못을 따지는 건 기자의 숙명이다. 아무리 친한 취재원이라도 중대한 사건이 터지면 어쩔 수 없이 ‘배신’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 20~30년의 공직생활 전부가 기자가 쓴 몇 줄짜리 기사로 완전히 망가지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 기자들은 기사를 써놓고 휴대전화를 꺼놓은 채 ‘잠수를 탄다’. 비판적인 기사를 쓰고도 다시 취재원을 만날 수 있는 뻔뻔스러움이 기자의 필수요건이라지만, 치명적인 기사일 때는 예전의 관계로 돌아가기 힘들어진다.
‘복차지계’(覆車之戒).
앞수레의 엎어진 수레바퀴 자국이 뒤에 오는 수레엔 교훈이 된다. 앞선 선배들 가운데는 취재원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해 패가망신하거나, 기자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래서 언론사들마다 취재윤리나 직업윤리의 기준과 마지노선을 정해놓은 ‘윤리강령’이나 ‘취재준칙’ 같은 것을 만들거나 개정하고 있다.
기자라는 직업이 문득 허무해질 때가 있다. 1천 장하고도 수백 장은 더 쌓여 있는 명함더미 가운데 이름이 기억나는 취재원이 10% 안팎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때나, 내가 기자란 직함을 버리면 나에게 먼저 연락할 이는 얼마나 될까 하는 식의 생각을 할 때면 더욱 그렇다. 겉으로만 친한 척하던 취재원들이 내게 등을 돌리며 표변하는 순간을 맞을지 모를 일이다.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홍준표, 이 대통령 부동산 정책 맞장구…“부동산 돈 증시로 가면 코스피 올라”

이진숙 “한동훈씨, 대구에 당신 설 자리 없다” 직격

민주 “응답하라 장동혁”…‘대통령 집 팔면 팔겠다’ 약속 이행 촉구

일본, 이제 ‘세계 5대 수출국’ 아니다…한국·이탈리아에 밀려나

이 대통령, 분당 아파트 29억원에 내놔…“ETF 투자가 더 이득”

러시아 “돈바스 내놓고 나토 나가”…선 넘는 요구에 우크라전 종전협상 ‘난망’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직 사의…사법 3법 추진에 반발

이 대통령, 분당 아파트 매물로 내놔…부동산 정상화 의지
![왜 부자는 수돗물을 마시고 가난한 사람이 병생수 마실까 [.txt] 왜 부자는 수돗물을 마시고 가난한 사람이 병생수 마실까 [.txt]](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27/53_17721459993113_20260226504293.jpg)
왜 부자는 수돗물을 마시고 가난한 사람이 병생수 마실까 [.txt]
![[속보] ‘재판소원제 도입’ 헌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속보] ‘재판소원제 도입’ 헌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27/53_17721899136893_20260227502632.jpg)
[속보] ‘재판소원제 도입’ 헌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