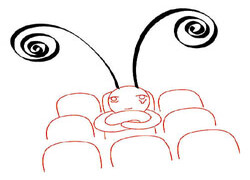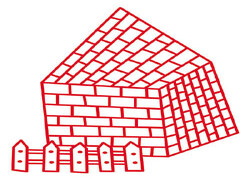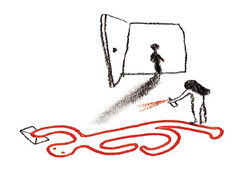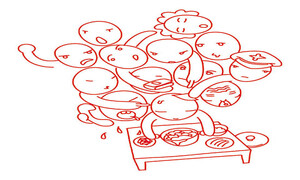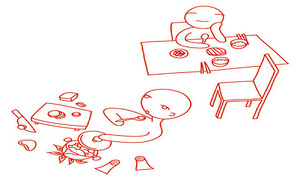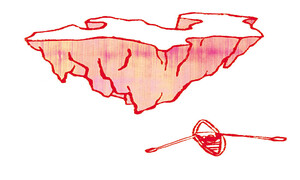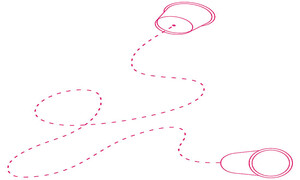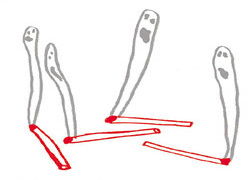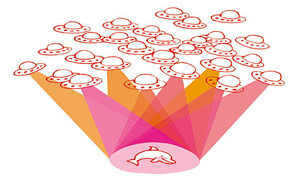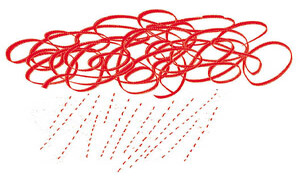[겸이 만난 세상]
▣ 겸/ 탈학교생 queer_kid@hanmail.net
깨어나니 오후 2시. 한 시간을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다 4시쯤 일어나 대충 옷을 입고 세수를 한 뒤 펜과 종이 한장을 들고 방을 나선다. 하염없이 대학로 거리를 떠돌다 맥주나 마시며 미뤄진 시나리오나 써야겠다며 호프집을 찾고 있을 때, 4번 출구앞 천정산 개발반대 집회 현장을 발견하곤 그쪽으로 가니 친구가 피켓을 들고 땅에 앉아 있다. 간만에 만난 친구에게 맥주 한잔하자고 꼬셔 근처 호프집으로 갔다. 아직은 늦은 오후라 바에는 우리 둘밖에 없었다. 반쯤 취한 난 소파에 거의 드러누운 자세로 애가 둘 딸린 유부남과 첫 섹스를 했을 때 섹스가 그리 재미없는 것인 줄은 몰랐다며 섹스보다 자위가 낫겠다는 둥의 시시껄렁한 농담을 해댔다. 점점 지루해지는 대화의 끄트머리에 사는 것도 지겨우니 홍익대 앞에 춤이나 추러 가자고 친구 한명을 더 불렀다. 홍대 앞 힙합 클럽에 들어가니 어쩜 하나같이 비슷한 복장과 서로의 눈을 의식한 군무 같은 동작들이라니. 게다가 줄기차게 나오는 곡의 레퍼토리는 왜 그리도 뻔한지. 하도 심심해서 간 클럽으로부터 지친 몸과 두통만을 얻은 채 다시 집으로 오며 던진 외마디. “너무 지루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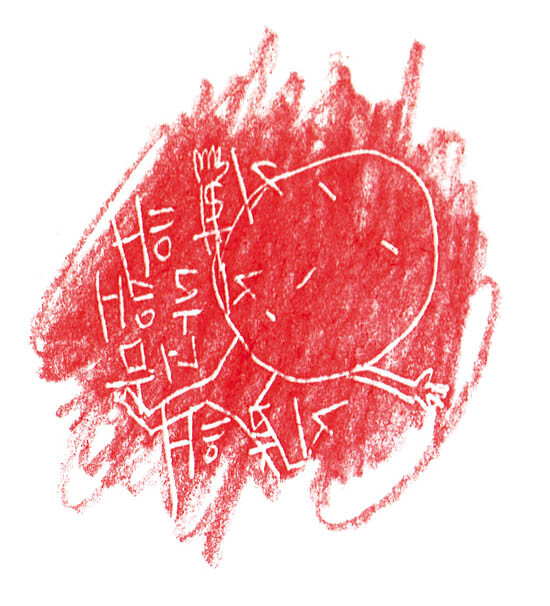
이 끔찍한 지루함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시작해 중학교 때 절정이었다. 중학교 1학년 방에 처박혀 라디오나 듣던 서늘한 겨울, 난 펜을 들고 일기장에 노트에 누런 벽지에 마음 한구석에 ‘20살이 되기 전에 죽어야지’라고 써댔다. 살아야 하는 이유조차 알 수 없던 때 20살이 된다는 건 혼자 독립을 해야 한다는 의미였고, 누군가의 보호 없이 세상을 헤쳐나가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도 섬뜩해 차라리 그전에 죽어버리는 게 나을 것만 같았다. 중학교 2학년은 더욱 절망적이었다. 교실에선 소년들이 포르노 잡지를 돌려보며 시시덕거렸고, 한쪽 구석에선 자기 성경험담을 자랑하듯 떠들어댔다. 아이들의 소원은 운동장에 나가 축구를 하거나 방과후 PC방에서 스타크래프트를 하는 것이었다. 도덕 시험에 제시된 사지선다형 문제에는 정답이 있었음에도 난 그것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체육 선생은 남자였고 양호 선생은 여자였다. 모든 것이 뻔했고, 난 변함없는 그 사실들이 지겨워 도서관 한쪽 구석에 앉아 지구종말론에 관한 책들을 탐독했다. 그러나 1999년 7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은 어처구니없이 빗나갔다. 차선책이던 Y2K 종말론은 소란스러울 뿐이었다. 중학교 3학년 졸업을 앞두고 고등학교는 달라도 우리는 진정한 친구 운운하는 애들을 냉소하며 어떻게 하면 이 지겨운 학교를 하루빨리 때려칠 수 있을까 고민하다 어쩌다 보니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그리고 얼마 뒤 자퇴했다.
그 뒤로도 삶은 너무 지루했고 세상엔 온통 멍청이들로 가득 차 보였다. 적어도 나를 바라보는 나르시시즘의 거울에 돌을 던져줄 만한 사람은 보이질 않았다. 종종 누군가 나의 뺨을 후려치며 “넌 쓰레기야”라고 말해주길 바랐지만 누구도 나의 마음을 흔들어놓질 못했고, 난 그저 내 뺨을 자신의 손으로 아프지 않을 만큼 힘을 조절해 때리는 시늉을 하곤 했다. 아주 가끔은 당신이 보는 내 얼굴이 거울에 비친 이미지에 불과하다는 걸 깨닫는 이가 있긴 했지만, 누구도 거울이 아닌 그림자에 나를 교묘히 숨겨놓은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다. 알아챈들 삶이 조금은 덜 지루했을까.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단독] 청와대, ‘사법시험 부활’ 검토…연 50~150명 별도 선발 [단독] 청와대, ‘사법시험 부활’ 검토…연 50~150명 별도 선발](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11/53_17732246670747_20260311503553.jpg)
[단독] 청와대, ‘사법시험 부활’ 검토…연 50~150명 별도 선발

미 민주당 “이 대통령 덕에 안정됐던 한미 동맹, 대미 투자 압박에 흔들려”

침묵하던 장동혁 “절윤 진심”…오세훈, 오늘 공천 신청 안 할 수도

“최후의 카드 쥔 이란…전쟁 최소 2주 이상, 트럼프 맘대로 종전 힘들 것”

법원, 윤석열 ‘바이든 날리면’ MBC 보도 3천만원 과징금 취소

이란 안보수장 “트럼프, 제거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장동혁에 발끈한 전한길, 야밤 탈당 대소동 “윤석열 변호인단이 말려”

이탈리아 야구, ‘초호화 군단’ 미국 침몰시켰다

청담르엘 14억↓·잠실파크리오 6억↓…강남권 매물 쏟아지나

이상민 “윤석열, 계엄 국무회의 열 생각 없었던 듯”…한덕수 재판서 증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