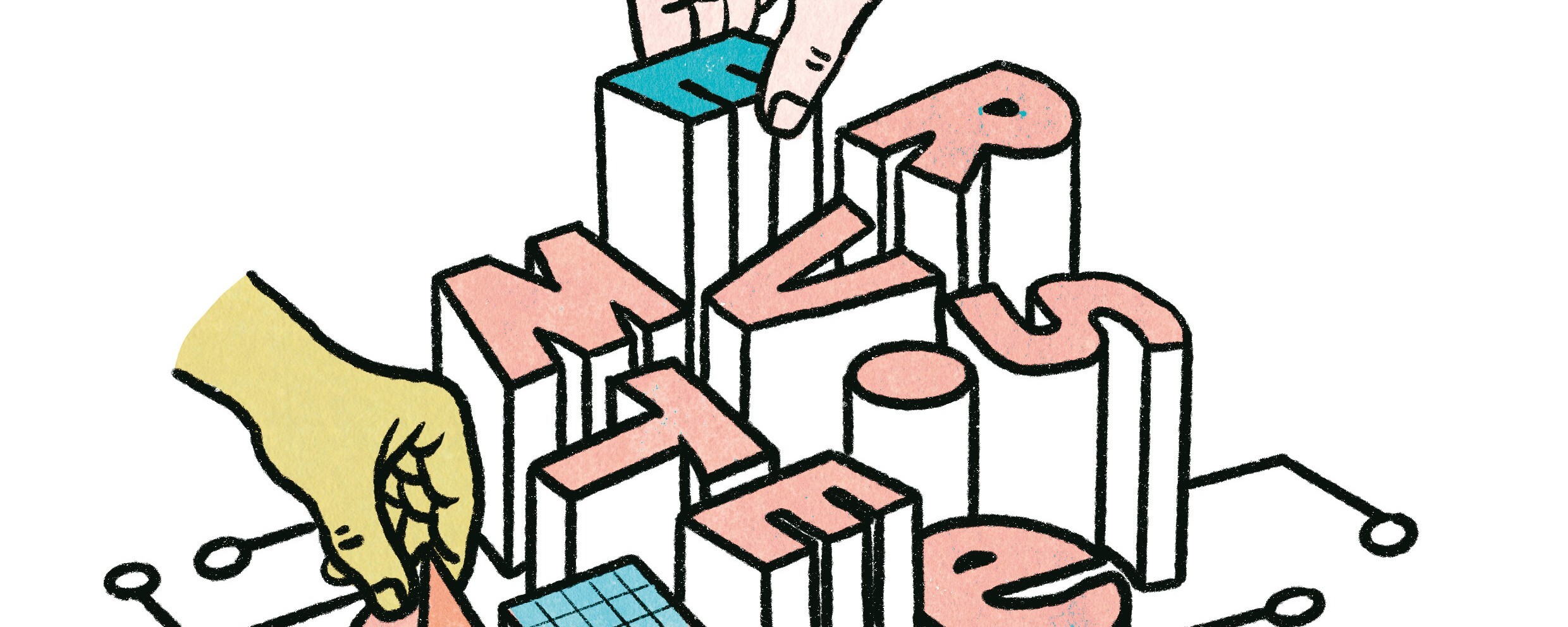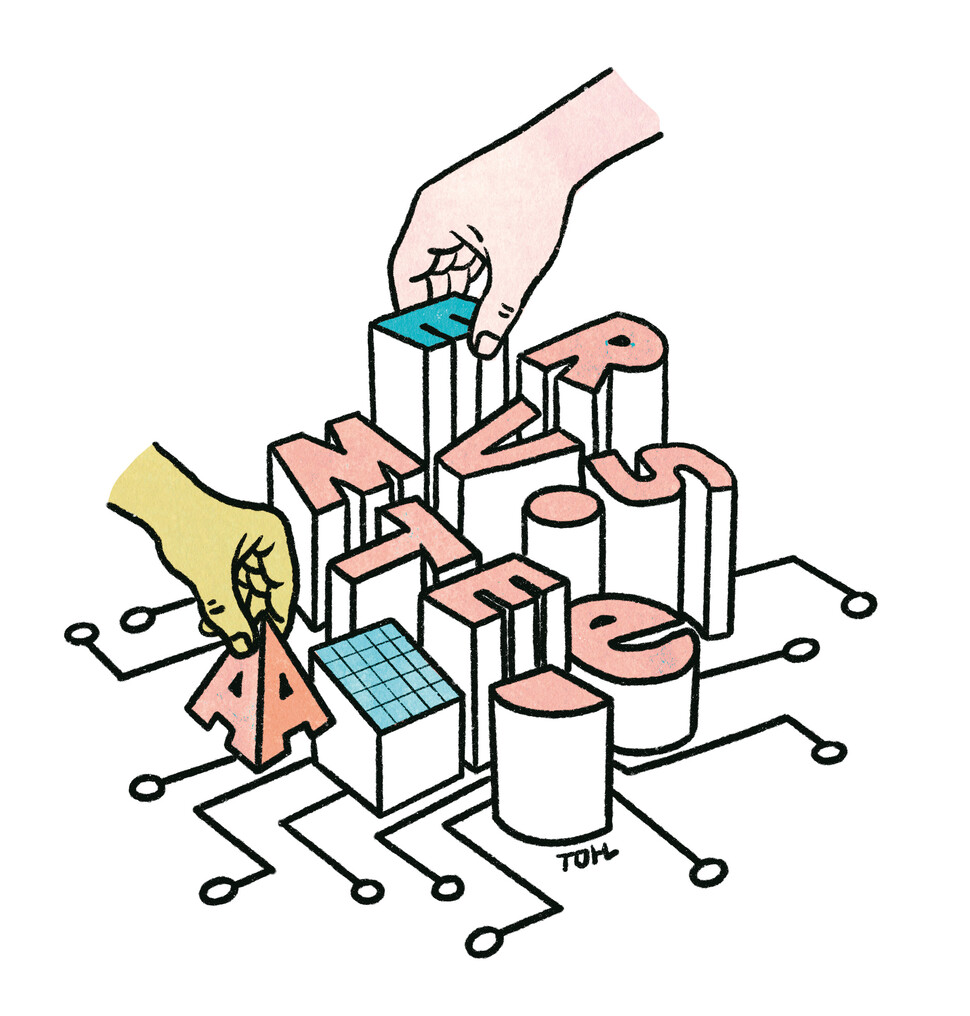
일러스트레이션 이우만
2016년 게임개발자 라이언 그린은 소아암으로 시한부 삶을 산 자신의 아들 조엘과 가족이 겪은 일을 <댓 드래곤, 캔서>라는 아트게임으로 만들었다. 일반적인 퀘스트(온라인게임에서 이용자가 수행해야 하는 임무)나 레벨업이 없는 게임으로, 플레이어가 그린이 겪었던 기쁨과 슬픔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도록 설계됐다. 게임 속에서 그린이 몹시 절망한 상태를 바닷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 상황으로 표현한 것이 인상 깊다. 플레이어는 그린의 캐릭터의 엉덩이를 몇 번씩 위로 밀어보지만 게임상에서 그는 절망해 다시 물에 빠져들었다. 당신이 게임디자이너라면 어떻게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게 할까?
놀랍게도 이 스테이지의 해결 방법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였다. 몇 분 정도 마우스 클릭을 하지 않으면 스테이지 내 그린은 바다 밑으로 침잠해 들어가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간다. 고통받는 자가 스스로 울도록 놔두고, 다만 곁에서 지켜봐주는 것이 플레이어의 몫이었다. 응원의 말은 손쉽지만, 같이 울어주는 일은 어렵다. 같은 고통을 체감하며 인내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게임 기술은 재미나 놀이를 위한 방식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직접 플레이해보도록 하는 장르로도 진화하는 중이다. 게임이 소설이나 영화의 읽기 방식과 다른 지점은 어찌 됐거나 플레이어가 직접 커서를 옮기고 클릭하며 사건에 개입하게 한다는 점이다. 직접 버튼을 누르는 행위는 그래픽의 사실성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연루의 감각을 준다. 당신이 게임에 들어온 순간 개입자가 되고 책임감에 빠진다.
<댓 드래곤, 캔서>는 시종일관 플레이어가 그린의 삶을 플레이하도록 유도한다. 그들의 단란한 한때 연못의 오리가 되어 조엘이 던져주는 빵을 쪼아먹을 수도 있고, 조엘이 다니던 병원 복도를 같이 걸어볼 수도 있다. 여기서 우리에게 허용된 것은 공감과 위로의 자유다. <댓 드래곤, 캔서>의 개발자는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을 디지털 시공간으로 재현해 언제든 방문할 수 있는 기억으로 바꾸었다.
얼마 전 수업 중 학생들에게 유년 시절 중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한 장소와 그곳에서의 사건을 소재로 짧은 에세이를 써달라 요청했다. 멋지고 화려한 경험만 쓸 것 같지만, 의외로 그들이 선택한 것은 본인이 살았던 집이나 가족 사이에 있었던 소소한 추억이었다. 귀가 잘 들리지 않는 할아버지와 필담으로 소통하며 맘껏 했던 낙서질, 일요일 아침 알람처럼 울리던 원두 가는 소리, 부모를 따라간 외국에서 짧은 영어로 ‘트릭 오어 트릿’ 장난을 치며 지새웠던 핼러윈의 밤, 한강변에서 처음 가족과 함께 폭죽에 불을 붙여본 순간이 학생들의 마음속에 아직 남아 있다는 아름다운 추억이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간단한 게임까지 만들어 디지털 지구본 위에 학생들 각각 추억의 조각이 문장과 게임으로 구동되도록 했다. 기술적으로 허용되는 한 누구라도 접속해 지구본을 돌리며 그들의 과거를 경험할 수 있다. 60여 명의 학생이 소중히 생각했던 일상을 디지털로 보존하게 된 것이다.
게임 기술이 누군가의 삶을 시뮬레이션하는 방법론이 될 수 있다면 먼 미래에는 사진첩을 여는 것만큼이나 보편적인 기록술이 될 것이다. 메타버스가 자유로운 아바타의 놀이터뿐 아니라 생생한 타인의 과거로 가득 찬 공간이 된다면, 당신은 타인의 삶을 함부로 평가하지 않고 직접 플레이해보는 경험을 통해 그들의 고통과 기쁨을 직접 이해하는 자가 될지도 모르겠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게임 기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자꾸만 든다.
오영진 테크노컬처 연구자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태진아 “전한길에 법적 대응”…일방적으로 콘서트 참석 홍보·티켓 판매

몸에 피 한방울 없는 주검이 되어 돌아온 새 신랑

트럼프, ‘슈퍼 301조’ 발동 태세…대법원도 막지 못한 ‘관세 폭주’

‘어디서 본 듯한’....국힘 이정현 야상 점퍼 ‘시끌’

내란 특검 “홧김에 계엄, 가능한 일인가”…지귀연 재판부 판단 ‘수용 불가’
![지귀연 ‘무죄 판결문’ 썼다 고친 흔적, 변심한 계기는? [논썰] 지귀연 ‘무죄 판결문’ 썼다 고친 흔적, 변심한 계기는? [논썰]](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6/0220/20260220502864.jpg)
지귀연 ‘무죄 판결문’ 썼다 고친 흔적, 변심한 계기는? [논썰]
![[단독] 군 특수본, ‘선관위 장악 지시하달’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 기소 [단독] 군 특수본, ‘선관위 장악 지시하달’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 기소](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22/53_17717357343273_20260222501198.jpg)
[단독] 군 특수본, ‘선관위 장악 지시하달’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 기소

아내 이어 남편도 ‘금메달’…같은 종목서 나란히 1위 진풍경

‘2관왕’ 김길리, ‘설상 종목 첫 금’ 최가온 제치고 한국 선수단 MVP 올라
![“저긴 천국이네”…집에서 삶 마감 가능한 일본 시스템 [.txt] “저긴 천국이네”…집에서 삶 마감 가능한 일본 시스템 [.txt]](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6/0212/20260212504997.jpg)
“저긴 천국이네”…집에서 삶 마감 가능한 일본 시스템 [.t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