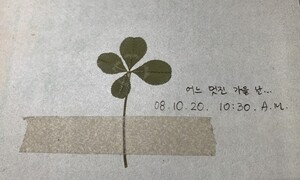2014년 가을, 퇴근길에 찍은 은행나무.
은행잎 하나가 ‘툭’ 하고 떨어졌다.
정말 ‘툭’ 하고 땅바닥에 처박히는 소리가 났다. 땅으로 꺼지는 바람을 탔던지 은행잎이 떨어지는 속도도 무척 빨랐다.
아침 출근길이었다. 이어폰을 귀에 꽂고 음악을 들으며 출근하던 내 마음도 ‘쿵’ 하고 내려앉았다. 정말 ‘쿵’ 하고 세상이 두 쪽 나는 소리가 들렸다.
아팠다. 은행잎이 내 마음에 떨어져 박힌 것도 아닌데 그렇게 아플 수가 없었다.
중력에 이끌려 떨어진 은행잎을 보고 그 잎을 놓아버린 나뭇가지를 떠올렸다. 잎을 놓지 않으려고, 중력에 지지 않으려고, 때이른 겨울바람에 파르르 떨며 은행잎을 마지막까지 붙잡았을 나뭇가지를…. 그 나뭇가지처럼 계절을 건너지 못하고 생명을 놓아버린 사람들, 죽음들….
가을 아침, 버스를 타고 출근하는 길이었다.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다.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가을철 은행나무 열매 냄새를 못 견디겠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자 은행나무 가로수 중 수나무만을 남기고 암나무는 뽑아 수나무로 바꾸거나 아예 다른 나무로 교체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창밖으로 노란 은행나무를 응시하며 ‘멍때리던’ 내 미간에 순간 힘이 빡 들어갔다. 꼬물꼬물 지렁이가 기어가는 것 같았다.
얼마나 폭력적인가. 그저 사람에게 역한 냄새가 나는 열매를 맺는다는 이유 하나로 하나의 성(性)만을 남기겠다니. 그런 아이디어를 낸 인간들은 가을철 포장마차에서 구워 파는 은행 열매를 술안주로 먹기도 하면서 말이다.
무수히 밀려드는 민원 앞에선 산림청 고시도 무력했다. 산림청은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 고시’에서 가로수 생육이나 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들은 가을철이면 날마다 은행잎을 쓸고, 떨어진 열매를 치우면서도 나무잎과 열매를 떨어내지는 않았던 게 아닌가.
2018년 기준 서울 시내 가로수 30만 그루 중 은행나무가 11만 그루인데 이 중에서 암나무는 2만9천 그루 정도 된다고 한다. 정부는 미세먼지 등 대기 정화 능력이 뛰어나고 병충해에 강해 가로수로 적합하다는 이유로 37%에 이르는 가로수를 은행나무로 심었다. 그런데 인류는 은행나무의 묘목 단계에서 성별을 구분하는 기술을 2011년께야 개발했다. 그전까지는 수십 년을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암수를 구별하지 못했다. 가로수에서 열매 맺는 나무가 불규칙하게 심긴 이유다.
이제는 은행나무의 암수를 구분할 수 있다고 해서 수나무만을 심어야 할까? 이미 심었던 암나무를 모두 뽑고, 수나무만 남기면 이 도시는 쾌적해질까? 쾌적해지기만 하면 암나무를 뽑아 다른 나무로 교체해도 되는 것일까? 이 땅에서 은행 암나무는 무용한 것일까? 은행 열매의 냄새가 사라지면 이 도시의 가을 거리에선 어떤 향기가 날까? 어느 질문에도 시원하게 답할 순 없지만 이 가을 꼭 던져보고 싶은 말이다. 어떤 질문들은 답이 없더라도 묻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으니까….
회사 근처에 살면서 도보로 출근하다 최근 1시간 거리로 이사했다. 3년 만에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 버스 안에서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이 부쩍 늘었다. 옆구리에 끼고 나온 신문과 책을 끄적이다 곁눈질로 타인의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니 드라마, 게임방송, 버라이어티쇼, 개인방송 같은 프로그램이 많다. 이른 아침 출근길 버스에서 이를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어떤 일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까? 신문과 책이 사라진 이 버스는 암나무가 사라진 길을 달려 어디로 가는 걸까?
글·사진 이재호 기자 ph@hani.co.krundefinedundefined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배현진 “참 어렵게 산다, 장동혁”…징계 중단하잔 말에 SNS 글

‘미국 vs 일본 4강전 용납 못 해’…또 대회 중 바뀐 WBC 대진표
![관세와 미사일, 양손에 쥐고 과대망상에 빠진 독재자 [아침햇발] 관세와 미사일, 양손에 쥐고 과대망상에 빠진 독재자 [아침햇발]](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12/53_17733006909357_20260312502955.jpg)
관세와 미사일, 양손에 쥐고 과대망상에 빠진 독재자 [아침햇발]

이란 새 지도자 모즈타바 첫 연설…“호르무즈 봉쇄, 미군기지 공격 계속해라”

이하상 “특검 안 나온 재판은 불법” 트집…재판장, 17초 만에 “기각”

이란, 종전 조건 ‘불가침·배상금’ 제시…미국과 평행선

오늘부터 휘발유 100원 더 싸게 산다…정유사 출고 최고액 ℓ당 1724원

오세훈, ‘장동혁 2선 후퇴’ 압박 초강수…서울시장 추가 모집 ‘버티기’
![[단독] 청와대, ‘사법시험 부활’ 검토…연 50~150명 별도 선발 [단독] 청와대, ‘사법시험 부활’ 검토…연 50~150명 별도 선발](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11/53_17732246670747_20260311503553.jpg)
[단독] 청와대, ‘사법시험 부활’ 검토…연 50~150명 별도 선발

이스라엘, 이란 정권 붕괴 기대했지만…“환호가 좌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