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러스트레이션 조승연
한 동물복지단체에 입양 신청 편지를 썼다. “개를 키워본 적은 없으나 TV 프로그램 전편을 시청했습니다. 혼자 살지만 프리랜서라 개랑 거의 항상 같이 있어줄 수 있습니다. 개가 아플 때는 병원에 데려갈 수 있을 만큼 통장 잔고는 있습니다.” 무슨 입사 원서도 아닌데 꽤 부풀려가며 정성을 들였다고 생각했다. 일주일 기다렸다. 답장이 왔다. “서류 검토에서 탈락하셨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장 뒤에 노란 얼굴 이모티콘이 웃고 있다.
‘이제 별별 걸 다 떨어지는구나.’ 슬슬 기분이 상했다. 개 ‘따위’에게도 퇴짜 맞은 거 같았다. 성질나 친구한테 하소연했다. “이유라도 말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이유가 네 집이 작아서 그렇다, 네가 독거라 그렇다, 그러면 네 기분이 더 낫겠냐? 싸움만 나지.” “면접이라도 한번 봐야 할 거 아니야. 알지도 못하면서.” “개 면접 보고 떨어지면 기분 더 나쁘지 않겠냐?” 맞는 말이다.
어린 시절, 스쳐 지나갔던 개들은 모두 처연한 눈빛으로 나를 봤다. 황구 붕붕이는 사촌이 잠깐 맡겨뒀던 개다. 단독주택 2층에 세 들어 살던 때다. 아래층 주인집 여자는 엄마랑 나이가 비슷했다. 그 집엔 텔레비전 드라마에나 나올 거 같은 카펫이 깔려 있었다. 실내 층계로 연결된 위층과 아래층은 다른 세상을 포개놓은 것 같았다. 그 집 물건은 되게 비싸 보였다. 붕붕이는 한동안 잘 지냈는데, 목욕할 때 귀에 물이 들어간 날 사고를 쳤다. 여기저기 뛰어다니더니 아래층으로 냅다 달려 내려갔다.
곧 주인 여자 비명이 터졌다. 달려 내려가보니, 붕붕이가 똥인지, 똥이 붕붕이인지 모르겠다. 카펫 위에 자기 몸만 한 똥을 싼 붕붕이는 다소곳이 앉아 있었다. 나는 엄마가 겉으로는 붕붕이를 혼내지만 속으로는 어쩐지 통쾌해하는 거 같았다. 하여간 붕붕이는 사촌 집으로 돌려보냈다. 몇 달 뒤, 다세대주택에 세 들어 사는 사촌 집에 가보니, 붕붕이가 담과 집 통로 사이에 짧은 끈으로 매여 있다. 그새 몸집이 자라 통로 사이에 끼었다. 자동차처럼 전진 후진만 할 수 있는 붕붕이는 날 보고 미친 듯이 꼬리를 흔들었다. 꼬리 끝이 장구를 치듯 두 벽을 오가며 쳤다. 앞뒤, 앞뒤, 앞뒤만 오가면서. 개니까.
시골 할머니 집 근처에서 비를 쫄딱 맞고 다리를 절뚝이던 흰색 개는 이름을 모른다. 한쪽 다리가 부러졌다. 부러진 다리 아래쪽이 휙휙 돌았다. 개 눈이 흐리멍덩했다. 쓰러질 것 같았다. 초등학생이던 나랑 사촌 동생은 개를 안아 집 마당 구석으로 데리고 들어왔다. 신문지 따위를 찾아 처마 밑에 자리를 마련하고 개를 눕혔다. 눈을 감은 개는 헐떡였다. 할머니한테 말했더니 다시 내보내라고 했다. 그 뒤로는 기억이 잘 안 난다. 우리는 저녁을 먹었던 거 같다. 개는 사라졌다. 어른이 된 뒤로도 문득문득 그 획획 돌던 종아리가 떠오른다. 그때 밥을 먹으며 개를 잊은 어린 나도 같이.
‘카레닌의 미소’. 제목만 봐도 머리가 지끈거리는 소설 의 마지막 장 제목이다. 카레닌은 개다. 1968년 체코 ‘프라하의 봄’을 전후로 인간 토마시, 테레자, 사비나, 프란츠의 사랑 이야기를 한참 풀어내더니 작가 밀란 쿤데라는 마지막 장을 개 카레닌에게 주었다.
카레닌의 하루는 이렇다. 매일 아침 테레자를 따라 빵집에 간다. 크루아상 하나를 받아먹는다. 테레자와 함께 소를 치고 집에 돌아와 잔다. 직선의 시간을 사는 인간과 달리 카레닌은 끝없이 순환하는 시간을 산다. ‘크루아상 따위는 지긋지긋하다고!’라고 하지 않는다. 거울에 비친 자신에게는 관심이 도통 없다. 테레자는 자기 생리혈을 혐오하지만 개 카레닌은 그렇지 않다. 스스로 만든 자아에 갇혀 있지 않고, 영혼과 육체를 나누지도 않는, 그저 지극히 친근한 눈빛으로 테레자를 바라보는, 그냥 개다.
소설 에서 이름을 따온 이 개는, 이름과 달리 고통 없는 사랑을 한다. “카레닌은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기 전) 아담이다. …어떠한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낙원에 대한 회상인) 전원시를 선사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짐승뿐이다. 왜냐하면 짐승은 낙원에서 쫓겨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간과 개 간의 사랑은 목가적이다. 그것은 갈등 없는 사랑이요, 가슴을 찢는 듯한 장면들이 없는 사랑이며, 발전이 없는 사랑이다.”
개 카레닌과 테레자의 사랑 앞에서 인간들의 사랑은 초라해 보인다. ‘행진’ ‘음악’ ‘고향’, 같은 낱말을 내뱉지만 프란츠와 사비나는 정반대 의미를 떠올린다. 상대에게서 자신이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싶은 방식으로 본다. 자신의 결핍을 메워줄 ‘어떤 것’을 상대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거라 믿지만, 사실 서로 하는 말도 이해하지 못한다. “강물에 띄워 버린 아기”처럼 토마시에게 온 테레자는 ‘약함’으로 결국 토마시를 길들이고, 토마시는 수많은 여자 사이를 오가며 테레자에게 상처를 준다. “몰아적인 사랑”은 테레자와 개 카레닌이 한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며, 누구도 강요하지 않는 사랑이다.
“인간 남녀의 쌍들을 괴롭히는 질문을 그는 한 번도 (카레닌에게) 하지 않았다. 그가 나를 사랑하는가? 그가 나보다 어느 다른 누구를 더 사랑했는가? …사랑을 문제 삼고, 사랑을 측정하고 탐사하며, 사랑을 조사해보고 심문하는 이들 질문은 모두가 사랑이 이미 싹도 트기 전에 그것을 질식시켜버린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없다는 것도 가능한 말이다. 바로 그 이유는 우리가 사랑받기를 갈구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아무 요구도 없이 다른 사람에게로 다가가 그의 현존 이외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대신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엇인가를(사랑을) 바라기 때문이다.” 나는 그래서 토마시도 테레자도 프란츠도 사비나도 아닌 ‘카레닌의 미소’가 이 소설의 마지막 장이라고 생각한다.
개 ‘따위’ 입양하겠다고 했다 퇴짜 맞아 기분 나쁘다고? ‘따위’는 얼마나 쉽게 새끼를 치나. 닭 따위, 소 따위, 개 따위, 너 따위… ‘따위’라니. 내가 언제 개같이 사랑해본 적이 있던가?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전임자도 “반대”…이성윤 ‘조작기소 대응 특위 위원장’ 임명에 민주당 발칵

앞뒤 다 비워…윤석열 ‘황제 접견’, 재구속 이후 278차례

‘트럼프 관세’ 90%, 돌고돌아 결국 미국인이 냈다

롯데 “나승엽·고승민 등 대만서 불법 도박장 출입…즉각 귀국 조치”

배현진 “장동혁 지도부의 공천권 강탈”…당내선 ‘선거 포기했나’

기상 악화에도 “치킨은 간 모양이네요”…이 대통령, 연평도 해병대 격려

“재혼 사유로 국가유공자 보훈급여 박탈…기본권 침해”

프로야구 롯데 선수들, 대만 도박장 CCTV에 ‘찰칵’…성추행 의혹도

양향자 “전한길·고성국, 당 폭력적으로 만들어…읍참마속으로 출당시켜야”

여자 500m 벽 높았다…쇼트트랙 최민정·김길리·이소연, 메달 획득 실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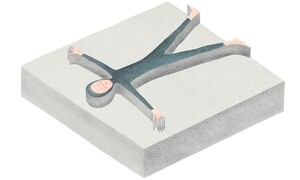











![[속보] 법원,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에 징역 7년 선고 [속보] 법원,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에 징역 7년 선고](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12/53_17708767345627_2026021250289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