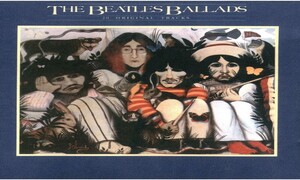‘인천 펜타포트 록페스티벌 2018’ 무대에 오른 린킨 파크의 멤버 마이크 시노다. 인천 펜타포트 록페스티벌 제공
록밴드 린킨 파크의 등장은 참으로 신선했다. 록에다 랩을 결합해 ‘뉴메탈’ 장르라는 음악을 들고나왔다. 이들이 2000년 발표한 데뷔 앨범 제목부터 《하이브리드 시어리》(Hybrid Theory), 다시 말해 ‘혼종 이론’이다. 밴드에는 체스터 베닝턴이라는 걸출한 보컬 말고도 마이크 시노다라는 래퍼가 있었고, 턴테이블을 이용해 스크래칭을 하는 디제이 조 한이 있었다. 거친 일렉트릭기타 사운드와 “지기지기 직직” 하는 스크래칭 사운드, 그르렁거리는 베닝턴의 보컬과 시원하게 내뱉는 시노다의 랩은 찰떡궁합처럼 잘 어울렸다. 《하이브리드 시어리》는 전세계에서 2500만 장 넘게 팔리며 21세기 최고 판매량을 기록한 데뷔 앨범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한국에서도 큰 인기를 얻어 2003년, 2007년, 2011년 세 차례나 내한 공연을 했다.
린킨 파크는 지난해 5월 7집 앨범 《원 모어 라이트》(One More Light)를 발표하며 건재함을 알렸다. 하지만 불과 두 달 뒤인 7월 베닝턴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최근 몇 년간 약물·알코올 중독과 싸워왔다. 앞서 5월 록밴드 사운드가든의 보컬리스트 크리스 코넬이 세상을 떠났다. 당시 베닝턴은 추모글을 남기고 장례식장에서 레너드 코헨의 를 불렀다. 절친이 사무치게 그리웠던 걸까? 베닝턴은 코넬의 생일인 7월20일 친구 곁으로 갔다.
전세계 음악 팬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누구보다 깊게 절망한 이는 20년 가까이 옆에서 노래한 시노다였다. 그는 자기 집에 틀어박혀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몇 주가 흘렀다. 시노다는 고통을 지우기 위해 뭐라도 해야 했다. 건반을 두드리며 음악을 만들었다. 그는 “스스로를 치유하기 위해 뮤직 테라피를 한 것”이라고 했다.
시노다는 지난 1월 아무런 예고 없이 3곡을 담은 미니앨범(EP) 《포스트 트라우마틱》(Post Traumatic)을 불쑥 발표했다. 자기 이름을 내건 첫 솔로 앨범이었다. 이전에 그는 ‘포트 마이너’란 이름으로 솔로 프로젝트 활동을 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이름을 쓰지 않았다. 사적인 감정을 오롯이 담은 음악이었기에 자기 이름을 그대로 썼다. 슬픔으로 가득한 , 비극적 사건 이후의 일들과 그것에서 비롯된 감정을 그대로 읊어나간 등 수록곡은 다소 비장하고 무거웠다.
다섯 달 뒤인 6월, 정규 앨범 《포스트 트라우마틱》이 나왔다. 앞서 발표한 세 곡에다 열세 곡을 더해 모두 열여섯 곡을 담았다. 앨범은 한층 밝아졌다. 재미있는 사실은 앨범이 뒤로 갈수록 더 밝아진다는 점이다. 지난 8월11일 인천 펜타포트 록페스티벌을 찾은 마이크 시노다를 만나 인터뷰하면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그는 곡을 만든 순서대로 앨범에 실었다. 첫 곡은 가장 먼저 만든 것이고, 맨 마지막 곡은 가장 나중에 만든 것이다. 이는 그의 심리 변화를 그대로 나타낸다.
베닝턴의 죽음 이후 어둠과 절망의 트라우마에 갇혀 있던 그는 노래를 만들면서 서서히 빠져나왔다. “이건 슬픔과 어둠으로 가는 앨범이 아니라, 거기서 벗어나는 여행”이라고 했다. 실제 앨범의 허리에 해당하는 8번 곡 을 기점으로 분위기가 확 밝아진다. 스스로에게 행한 음악치료가 효과를 발휘한 셈이다.
“체스터의 죽음 이후 음악을 계속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이 감정을 음악에 담아도 될까, 고민했어요. 결국 계속 음악을 하면서 살아 있는 것에 감사하게 됐죠. 그걸 관객과도 소통하고 싶었어요. 베닝턴의 사망 이후 공연하면서 관객이 카타르시스와 힐링의 감정을 느낀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공연을 마치고 관객과 만나면 ‘용기를 얻었다’고 말해주더군요. 그들과 함께 저도 용기를 얻어요.”
시노다는 인터뷰를 마치고 펜타포트 무대에 섰다. 기록적인 폭염에도 수많은 팬이 그를 반겨주었다. 시노다는 말했다. “베닝턴은 유쾌한 사람이었어요. 예전에 한국에 공연하러 와서 함께 관광하던 때가 떠올라요. 여러분이 너무 슬퍼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러고는 건반을 쳤다. 린킨 파크 데뷔 앨범에 수록된 의 전주였다. 사람들이 함성을 질렀다. 시노다는 먼저 자신이 맡은 대목을 불렀다. 다음은 베닝턴의 차례였다. 시노다는 입을 닫았다. 대신 노래한 이들은 관객이었다. 베닝턴의 빈자리는 관객의 목소리로 채워졌다. 노래는 그렇게 시노다와 관객의 합작으로 완성됐다. 나 또한 동참했다. 노래가 끝난 뒤 가슴이 벅차올랐다. 치유가 되는 기분이었다.
마이크 시노다의 무대는 록보다 힙합에 가까웠다. 그는 포트 마이너로 활동할 때 래퍼 제이지와 손을 잡았다. 린킨 파크가 제이지와 협업해 앨범을 낸 적도 있다. 록페스티벌 무대에서 랩을 하고 힙합을 하는 게 이제는 어색하지 않지만, 그런 분위기가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제이지는 2008년 영국의 대표적인 록페스티벌 글래스턴베리에서 흑인 힙합 음악가로는 최초로 헤드라이너로 섰다. 당시 오아시스의 노엘 갤러거는 이를 비아냥거렸다. 록페스티벌의 메인 무대에 힙합이 웬말이냐는 것이다. 제이지는 오프닝으로 오아시스의 대표곡 을 따라 부르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제는 록페스티벌 무대에 힙합 음악인이 서는 건 흔한 일이 됐다.
마이크 시노다는 인터뷰에서 “록이 죽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내가 자랄 때는 록, 힙합, 심지어 서브장르인 펑크록, 이스트코스트힙합 등으로 나눠가며 음악을 들었죠. 하지만 요즘 젊은 세대는 음악을 장르로 구분하기보다 무드로 구분해 들어요. 중요한 건 아티스트를 정형화된 틀 안에 넣기도 힘들다는 겁니다. 내 앨범에 피처링으로 참여한 이들은 록 아티스트라고 하기도 힘들고, 힙합 아티스트라고 하기도 힘들어요. 그들은 다양한 음악을 하고, 사람들은 그런 다양한 음악을 즐겨요. 그거면 된 거 아닌가요.” 우문에 현답이었다. 시노다의 음악은 린킨 파크의 음악이 그랬던 것처럼 장르의 벽을 넘어 머리가 아닌 가슴에 와닿는다. 그게 바로 음악의 힘이다.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이재명 대선후보 자격 박탈’ 초스피드 질주한 ‘조희대 사법부’

한동훈 “윤, 계엄 안 했으면 코스피 6천”…민주 “안 놀았으면 만점 논리”

나경원 “‘오세훈 징계 정지’ 원칙 어긋나…안 좋은 평가, 본인 반성부터”
![조희대 대법원, ‘이재명 사건 배당 절차’ 조작 증거 나왔다 [논썰] 조희대 대법원, ‘이재명 사건 배당 절차’ 조작 증거 나왔다 [논썰]](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07/53_17728408840037_20260306502691.jpg)
조희대 대법원, ‘이재명 사건 배당 절차’ 조작 증거 나왔다 [논썰]

60살 이상, 집에서 6천보만 잘 걸어도 ‘생명 연장’…좋은 걷기 방법
![‘두번째 기회’는 안희정이 아닌 ‘김지은 동지’에게 [.txt] ‘두번째 기회’는 안희정이 아닌 ‘김지은 동지’에게 [.txt]](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07/53_17728477491692_20260305504002.jpg)
‘두번째 기회’는 안희정이 아닌 ‘김지은 동지’에게 [.txt]

이웃국에 사과한 이란 대통령에 “나약”…‘온건파’ 공격 이어져
![[단독] 윤석열, ‘내란특검법’ 헌법소원 냈다…위헌심판 기각에 불복 [단독] 윤석열, ‘내란특검법’ 헌법소원 냈다…위헌심판 기각에 불복](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06/53_17727819701798_20260306502051.jpg)
[단독] 윤석열, ‘내란특검법’ 헌법소원 냈다…위헌심판 기각에 불복

두바이 재벌, 트럼프 직격 “전쟁에 우릴 끌어들일 권한, 누가 줬냐”

뉴 이재명, 밥그릇 싸움인가 정책대결 승화인가

![<span>[뮤직박스] 다시 불러보는 “그대 고운 내 사랑~”</span>](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0/0612/53_15919406315765_4215919406200643.jpg)
![<span>[뮤직박스] 지금이 어쩌면 ‘화양연화’</span>](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0/0508/53_15889189060769_21158891889022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