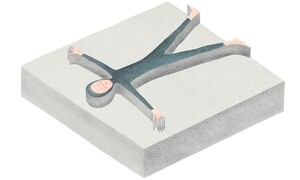일러스트레이션/ 조승연
그날 밤, 악몽을 꾼 게 확실하다. 내용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화들짝 놀라 깼다. 30대 초반 친구가 방황하는 날 보다 못해 20대가 주축인 한 모임에 데려간 날이었다. 모두 예의 발랐다. 예의가 ‘너무’ 바른 사람들도 있었다. “어머, ○○씨 어머니세요?” 정말 밝은 청년이었다. 첫 번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두 번째 폭격이 떨어졌다. “○○씨 어머니시구나.” 이번엔 질문형도 아니다. 어머니에 맞는 인자한 얼굴을 찾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입꼬리가 찌그러졌다. 머리가 띵했다. 30대 친구의 어머니라면 내가 대체 몇 살로 보인 걸까? 집에 돌아와 거울을 한참 봤다.
40대가 되니 낯선 이들은 둘 중 하나로 날 부른다. 아줌마 아니면 어머니다. 꼬집힐래 물릴래 중 하나를 고르는 것 같지만, 그래도 굳이 꼽으라면 아줌마라고 불리고 싶다. 한국에서 아줌마와 어머니는 남성도 여성도 아닌 제3의 생물이다. 아줌마엔 무시와 혐오의 양념을 덤으로 친다. 그럼에도 아줌마를 고른 까닭은 아이가 없는 나한텐 폭력적인 ‘존경’보다는 차라리 무시가 낫기 때문이다. 40대 여자 중 어머니가 되기 싫은 여자, 될 수 없는 여자도 많다. 다짜고짜 ‘어머니’라고 부르는 건 다 대학을 나왔을 거란 전제를 깔고 몇 학번이냐 묻는 것과 같다. 40대면 응당 어머니는 된 줄 아니,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교실에서 혼자 숙제를 안 해온 아이 같다. 애가 없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내 인생에 어딘가 붙어 있을 ‘미완성’ 딱지를 찾게 된다. 아줌마라고 하면 째려볼 수라도 있는데 ‘존경하는’ 어머니로 불리면 기분이 상해도 성질도 못 낸다.
그런데 꿈이라곤 돈만큼 없으면서 왜 그날 악몽까지 꿨을까? 늙어 보인다는 게 왜 그토록 끔찍했을까? 정희진은 에서 “우리는 모두 똑같이 늙어가지 않는다”고 썼다. 우리는 서민에게만 노인이라는 칭호를 붙이고, 늙은 여자와 늙은 남자가 경험하는 박탈의 양이 다르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몸의 경험을 근거로 형성되는 여성의 정체성은 남성 중심 사회가 ‘부여’한 것이지만, 남성은 행위하는 주체로 자신의 정체성을 ‘획득’한다. 남성과 달리 여성은 능력이나 자원보다 나이와 외모가 계급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머리로는 ‘폐경’이 아니라 ‘완경’이라고 되뇌지만, 내 마음은 폐경을 두려워한다. ‘늙은 여자’가 되는 건, 곧 욕망하는 주체가 될 ‘자격’을 잃는 것이라고, 한국에서 40년 넘게 산 내 마음은 여전히 그렇게 느끼고 있다. 평균수명까지 산다고 치면 이제 절반을 온 나는 원하고 또 원할 텐데, 점점 원할 자격을 박탈당할 테다. 그게 두려워 늙음의 흔적을 지우는 싸움을 벌일 수도 있지만, 필패가 정해진 링에 오르자니 허망하다.
어차피 주름이 이긴다. 의기소침한 날엔 내 세 영웅을 만나면 도움이 된다. 유튜브를 켜면 거기에 나의 ‘막례쓰’, 박막례씨가 있다. 72살 막례씨는 거침없이 내뱉는다. “옘병.” “여자는 가르치면 시집가 도망간다”고 믿는 아버지가 취학통지서를 숨기는 바람에 학교를 못 다녔고, “인생을 조사분(가루로 만든)” 남편을 만나 행상, 가사도우미, 식당, 허락된 모든 노동을 하며 삶을 책임졌다. 막례씨는 무서운 얘기 하나 해달라는 손녀의 말에 이렇게 답했다. “옘병, 내 인생이 제일 무서워.”
그 ‘무서운’ 삶의 짐을 거뜬히 져왔기에 막례씨는 무서울 것도 창피할 것도 없다. 유튜브 스타로 구글 본사에 초대받았을 때, 영어라고는 ‘땡큐, 쏘리, 퍽큐’밖에 몰라도 취직 자리까지 간을 본 마성의 여자다. 그는 또 한 번 보면 벗어날 수 없는 사랑스러운 변신의 귀재로, 살구를 겨냥했으나 참외가 돼버린 메이크업, 동창회 갈 때 ‘무조건 많이 바르는’ 메이크업 등을 시현해 보인다.
막례씨가 스위스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하러 간 날이다. 손등을 긁힌 그는 이렇게 말했다. “다친 것도 다 추억이여. 내가 도전하려고 했다가 생긴 상처라 괜찮어. 금방 나을 거여.” 패러글라이딩을 ‘패로구리다’로, 골인을 ‘꼬리’로 부르는 데 당당하고, 단감과 화장을 좋아하고, 드라마 의 팬이자 권상우와 나훈아를 보면 “미칠 것 같은” 이 여자는 “오메, 오메”라며 새로운 세상으로 걸어 들어간다.
두 번째 여자는 아녜스 바르다다. 88살 감독인 그는 영화 에서 33살 사진작가 JR와 항만 노동자의 아내들, 궁벽진 마을의 집배원, 화학공장 노동자, 농부 그리고 염소들을 만난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대형 사진으로 만들어 벽면 전체에 붙인다. 철거 직전 탄광촌의 마지막 주민 자닌은 집을 떠나지 못하는데, 이 집에서 노동을 마치고 돌아온 아버지가 건넨, 검댕이 묻은 바게트를 먹었기 때문이다. 아녜스와 JR가 자닌의 얼굴 사진을 그 집 외벽 가득 붙이자 자닌은 눈물을 글썽인다. 바르다가 사람들의 얼굴에, 삶에 ‘경의’를 표하는 방식이다.
아녜스는 이제 사물을 또렷이 볼 수 없다. 흔들리고 흐릿하다. “흔들리게 보여도 괜찮다고?” 선글라스를 절대 벗지 않는 JR의 물음에 아녜스는 이렇게 답했다. “너는 까맣게 보여도 괜찮다며.” 그가 옛 친구 장뤼크 고다르의 고약한 장난에 상처받은 날, 흐느끼는 아녜스를 위로하려고 JR가 선글라스를 벗어 눈을 보여준다. 아녜스는 이렇게 말했다. “네가 잘 안 보이지만, 그래도 네가 보여.”
얼마나 오래 나만 봐왔는지 모르겠다. 타인을 본다고 생각했을 때마저 타인이란 거울에 비친 나만 봤다. 멋지게 나이 드는 경지는, 아무리 노력해도 실은 ‘당신’을 완전히 볼 수 없다는 걸 깨달으면서, 끝끝내 당신을 보는 것일지도 모른다.
세 번째 여자는 작가 클레르 골이다. 아주 부러운 딱 한 문장 때문이다. 그는 “76살에 오르가슴을 처음으로 느꼈다”고 썼다. 여기서 방점은 처음으로가 아니라 ‘느꼈다’에 있다. “알고 대화하고 보살피고 싶은 타인이 있다면, 나의 결핍을 메우는 타인에 대한 갈구가 사랑의 시작이라면,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은 누구에게나 부여된 양도할 수 없는 삶의 조건이어야 한다.”(정희진, 에서)
유튜브를 켜니, 막례씨가 춤을 춘다. 차를 타고 가다 내려 드레이크의 노래 에 맞춰 춘다. 꽃이 만발한 주황색 원피스를 입고 몸을 흔드는 막례씨 위로 석양이 쏟아지고, 뒤로 텃밭이 지나가고, 노래는 시간을 넘어 흐르며 “두 유 러브 미?”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단독] 청와대, ‘사법시험 부활’ 검토…연 50~150명 별도 선발 [단독] 청와대, ‘사법시험 부활’ 검토…연 50~150명 별도 선발](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11/53_17732246670747_20260311503553.jpg)
[단독] 청와대, ‘사법시험 부활’ 검토…연 50~150명 별도 선발

침묵하던 장동혁 “절윤 진심”…오세훈, 오늘 공천 신청 안 할 수도

미 민주당 “이 대통령 덕에 안정됐던 한미 동맹, 대미 투자 압박에 흔들려”

“최후의 카드 쥔 이란…전쟁 최소 2주 이상, 트럼프 맘대로 종전 힘들 것”

이탈리아 야구, ‘초호화 군단’ 미국 침몰시켰다

이란 안보수장 “트럼프, 제거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법원, 윤석열 ‘바이든 날리면’ MBC 보도 3천만원 과징금 취소

청담르엘 14억↓·잠실파크리오 6억↓…강남권 매물 쏟아지나

장동혁에 발끈한 전한길, 야밤 탈당 대소동 “윤석열 변호인단이 말려”

미, ‘이란 정권교체→군사력 약화’ 무게…종전 기준 낮춰 출구전략 찾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