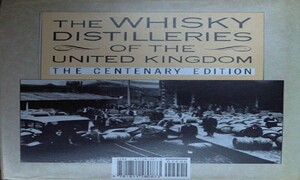자전거는 5시간째 사방팔방 몰아치는 비바람 속에 황량한 암산 지대를 달리고 있었다. 스케줄대로라면 이미 목적지인 아벤저그 증류소에 도착할 무렵이지만, 이제 고작 반이나 왔을까 말까였다. 시월 하순에 시작되는 태풍 시즌에 헤브리디스제도를 자전거로 달리는 것은 무모한 일이라는 현지인의 충고에 따라 얼추 한 달을 일찍 달려왔지만, 서북부 스코틀랜드의 방파제 역할을 하는 외(外)헤브리디스제도의 성깔은 낯선 자전거 여행자의 진로를 좀처럼 허락하지 않았다.

연간 1만ℓ를 생산하는 아벤저그의 증류기. 그러나 그 위스키에는 어떤 거친 환경에도 지지 않는,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뜨거운 ‘스피릿’이 담겨 있다. 김명렬
아벤저그 증류소는 스코틀랜드의 110여 증류소 중 가장 소규모로, ‘세상의 끝’이라는 뜻의 헤브리디스제도의 루이스섬에서도 가장 외진 곳에 있었다. 증류소 뒤 언덕에 오르니, 과연 세상의 끝에 이는 바람과 파도는 저런 것이구나, 실감할 수 있었다. 뭔가 붙잡지 않고서는 서 있기조차 힘들었다.
제주도보다 더 큰 면적에 인구는 고작 1만5천 명, 항구 주변에 대부분의 사람이 몰려 살고 나머지 지역은 불모지인 이 섬에서 고철업 겸 건축업을 하는 마크 테이반이 섬에서 생산되는 원료만 가지고 위스키를 생산하겠다는 야심을 품고 증류소를 연 것이 2008년. 얼핏 보면 드럼통을 망치로 때려 만든 것 같은, 그가 직접 디자인했다는 소박한 증류기에서 현재 연간 생산하는 위스키의 양은 1만ℓ 남짓. 대형 증류소의 500분의 1 수준의 생산량이다. 2013년부터는 아직 완전히 숙성된 맛은 아니지만, 병입해 섬 안에서 소량 판매도 하고 있다.
아벤저그(Abhain Dearg)의 뜻은 ‘붉은 강’. 바이킹이 이 섬을 지배하던 때 세리가 이 외진 지역까지 세금을 거두러 왔다가 주민들에게 살해당해 강에 던져졌다는 데서 이름이 연유했다. 그래선가, 본토 증류소는 세무 당국에 의해 엄격히 봉인되고 관리를 받는 데 비해, 아벤저그의 원액저장탱크는 세무서가 달아놓은 자물통 하나 없다. 젊은 일꾼 단 한 사람이 황량한 들판에서 혼자 맥아 제조에서 증류, 저장, 병입, 라벨 풀칠 등 모든 과정을 수작업으로 하는 깜냥을 보자니, 스코틀랜드 밀주 시대의 정신은 2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한 셈이다.
위스키 산업이 초글로벌 기업 체제로 재편되기 시작한 20세기 후반 이래 스코틀랜드에서 독립자본으로 가업 경영을 유지하는 증류소는 다섯 손가락 내외의 수다. 최근 디아지오 등 글로벌 기업의 위스키 양산이 가속화하는 가운데서도, 스코틀랜드에서는 소규모 독립자본의 증류소가 속속 세워지고 있다. 스코틀랜드 여행 중에도 두 군데가 막바지 공사에 여념이 없었고, 중서부에 위치한 오센토샨은 너른 저장창고에 이제 육십 몇 개째의 술통을 굴려넣고 있었다. “최소 8년 뒤, 이 술통을 개봉할 때, 그때 꼭 마시러 오라”는, 독일 태생의 젊은 매니저 마크 기슬러의 뜨거운 눈빛을 잊을 수 없다.
세계에서 위스키 소비국 상위권의 나라 중 위스키를 생산하지 못하는 나라는 현재 한국이 유일하다. 한 업계 전문가는 한국이 위스키 생산에 어울리는 기후와 토질이 아니라고 한다. 웃기는 소리다. 일본만 해도 전세계 위스키 시장에서 각광받은 지 오래다. 한국이 위스키를 만들지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단 하나. 주류 관련 대기업이 위스키 산업, 정확히는 국내 자체 생산에 뛰어드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위스키는 생산에 최소 10년간 인풋은 있어도 아웃풋은 없는 산업이다. 그렇게 하고도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 그런 산업에 뛰어들 기업이 우리나라에 있을까. 나는 없다고 단언한다. 거친 외해로 돛을 띄우기는커녕 내해에 안주하며, 게다가 하루 고기 잡아 하루 생활하는 조각배들을 밀어내고 저인망으로 중소기업의 눈물이 담긴 이익을 쓸어담는 것을 당연시하는 한국 대기업의 슬픈 초상에서 위스키에의 꿈은 요원하다.
위스키는 꿈이다. 오늘 저녁 한잔을 기울이는 술꾼에게는 자신의 미래를 위한 격려의 잔이고, 기업에는 거친 외해의 건너편을 향한 꿈인 것이다. 블루오션은 외해의 건너편에 있다.
스코틀랜드의 오지에서는 고철을 ‘뚜들기던’ 이도 위스키를 만든다. 한국의 주류 관련 대기업의 고위 임원들은 한번쯤 ‘세상의 끝’에 있는 그 증류소를 가볼 필요가 있다. 그 앞에 서면 아마 부끄러워질 것이다. 혹시 뜨거워질지도 모른다.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남국불패’...김남국, 인사청탁 사퇴 두 달 만에 민주당 대변인 임명

트럼프가 쥔 ‘관세 카드’ 232조·301조…발동되면 세율 조정 만능키

조희대, 사법개혁 3법 또 ‘반대’…“개헌 사항에 해당될 내용”

“서울마저” “부산만은”…민주 우세 속, 격전지 탈환이냐 사수냐

‘어디서 본 듯한’....국힘 이정현 야상 점퍼 ‘시끌’
![지귀연 ‘무죄 판결문’ 썼다 고친 흔적, 변심한 계기는? [논썰] 지귀연 ‘무죄 판결문’ 썼다 고친 흔적, 변심한 계기는? [논썰]](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6/0220/20260220502864.jpg)
지귀연 ‘무죄 판결문’ 썼다 고친 흔적, 변심한 계기는? [논썰]
![국가는 종교를 해산할 수 있는가 [한승훈 칼럼] 국가는 종교를 해산할 수 있는가 [한승훈 칼럼]](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22/53_17717559809613_20260222502135.jpg)
국가는 종교를 해산할 수 있는가 [한승훈 칼럼]
![[사설] ‘무기징역’ 빼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윤석열 1심 판결 [사설] ‘무기징역’ 빼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윤석열 1심 판결](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22/53_17717557735175_20260222502090.jpg)
[사설] ‘무기징역’ 빼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윤석열 1심 판결

전한길 콘서트 줄줄이 손절…“3·1절 행사라더니 완전 속았다”

‘헌법 불합치’ 국민투표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개헌 투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