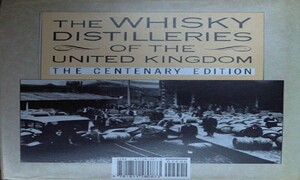지난해 9월18일 자정 무렵, 나는 스코틀랜드 동북단의 항구도시 뷕의 바닷가 숙소의 TV 앞에서 자리를 뜰 수 없었다. 스코틀랜드의 영연방으로부터의 독립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 개표 방송이 시작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에든버러에서 스페이사이드를 거쳐 동북단 항구까지 올라오는 한 달 동안 도시와 시골을 막론하고 때로는 ‘YES’, 때로는 ‘NO’의 팻말을 크게 붙여놓은 집을 흔히 볼 수 있었다. 2013년, 영국 의회와의 오랜 합의를 거쳐 결정된 국민투표. 그 뒤 2년여의 치열한 찬반양론 토론과 캠페인의 결과가 투표함에 담겨 있었다.
개표 결과는, 찬성이 44.7%, 반대가 55.3%. 당초 50:50으로 누구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던 각종 여론조사보다는 큰 차이였으나, 불과 40만 표의 차이였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스코틀랜드 국민’의 “위대한 결정”을 치하했고, 국민투표를 주도했던 스코틀랜드국민당(SNP)의 앨릭스 샐먼드 당수의 사퇴 뉴스가 뒤를 이었다. 그날 오크니제도로 건너가기 위해 최북단 항구로 달려가는 내내, 투표의 열기를 잊은 듯 마을들은 평온했고 사람들은 조용히 일상으로 돌아가 있었다.

스코틀랜드 독립투표는 근소한 차이로 부결됐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다음에 다시 국민투표가 이루어진다면 그 결과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김명렬
스코틀랜드가 잉글랜드와 한 나라로 합쳐진 것이 1707년 5월1일. 그로부터 300년도 더 지난 지금에 와서 독립 여부를 묻는 투표가 이루어진 것에, 그 결과가 거의 반반으로 갈리는 것에,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에, 나는 세 번 놀랐다.
그로부터 8개월 뒤인 지난 5월7일, 영국에서 총선이 치러졌다. 예상과 달리 완전한 보수당 일색의 정권이 들어섰지만, 또 하나의 이변은 국민투표 패배로 쇠퇴가 예상됐던 SNP의 약진이었다. 스코틀랜드에서 SNP는 만년 2등이었으나 이번 총선에서 59개 스코틀랜드 선거구 중 56곳을 장악하면서 적어도 스코틀랜드에서만은 일당 체제가 만들어진 것이다. 국민투표의 패배 뒤 오히려 SNP에 표를 몰아준 결과를 보면 스코틀랜드 국민의 독립 염원이 얼마나 뿌리 깊고 절실한지 짐작할 수 있다. 아마 그들은 지난해 국민투표를 치르며 그들도 몰랐던, 그들 안에 잠자고 있었던 그 염원의 각성을 경험했는지도 모른다.
우리가 영국이라고 부르는 나라의 공식 명칭은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UK)다. 웨일스·아일랜드·스코틀랜드·잉글랜드 네 나라가 합쳐져 만들어진 연합국가가 영국이다. 웨일스 독립당, 아일랜드 독립당 등 각 연방의 독립을 외치는 정치세력들이 활동하고는 있지만 그 세력은 아직 미미하다. 스코틀랜드만이 영국 연방으로부터의 독립을 언젠가는 예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나라 안의 나라’다.
실제 스코틀랜드에 가보면 영국과는 확연히 다른 ‘나라’에 와 있다는 착각을 쉽게 할 수 있다. 우선 잉글랜드와의 경계선을 ‘The Border’(국경)라고 호칭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엘리자베스 여왕의 초상이 그려진 잉글랜드 은행 발행의 지폐가 아닌, 국민시인 로버트 번스나 월터 스콧의 초상이 새겨진 스코틀랜드 중앙은행 발행의 독자적인 지폐를 사용한다. 국기도 유니언잭이 아닌, 파란 바탕에 흰색으로 X자가 그려진 성 앤드루(스코틀랜드 수호성인) 기를 사용한다. 언어도 북쪽으로 가면 켈트어에서 갈라져나온 게일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곳이 많다. 유럽 챔피언컵 등 축구대회에도 스코틀랜드는 단일팀으로 참가한다. 무엇보다 스코틀랜드에서 “아 유 잉글리시?”라고 물으면 누구나 다 얼굴에 노기를 띠며, “노! 아임 스코트!”라고 가슴을 펴는 민족적 자부심이 뚜렷하다.
영국 총면적 3분의 1의 면적, 영국 총인구의 1할이 안 되는 520만 명의 인구. 하지만 위스키는 물론 북해의 원유와 양모, 관광산업 등 만만치 않은 경제 기반을 갖고 있는 스코틀랜드.
앵글로색슨족의 잉글랜드가 아닌 스코트족의 스코틀랜드가 UK의 틀에 남아 있을까, 벗어날까? 지난 영국 총선의 결과는 영국 정치의 앞날에 술통에 오래 담긴 위스키의 맛만큼이나 흥미진진한 미지수를 남겼다.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지지율 ‘바닥’·오세훈 ‘반기’…버티던 장동혁 결국 ‘절윤’ 공식화

‘이재명 대선후보 자격 박탈’ 초스피드 질주한 ‘조희대 사법부’

윤석열 “출마하시라 나가서 싸우라”…선고 다음날 ‘내란 재판 변호인’ 독려

트럼프 “전쟁, 며칠 내 끝날 수도…이란 차기 지도부는 내부 인물 바람직”

“김정은 ‘두 국가’ 선언은 생존전략…전쟁 위험 극적으로 줄었다”

곽상도 아들 ‘화천대유 50억’ 처분 길 열렸다…법원, 계좌 동결 해제

“초가삼간 태울 건가”…대통령 ‘자제령’에도 강경파는 ‘반발’

‘국힘 당원’ 전한길 “황교안 보선 나왔으니 국힘은 후보 내지 마”

미 전문가들이 본 이란 전쟁…“핵 확산, 한반도 안보, 세계 경제 연쇄 충격”

트럼프 “전쟁 예정보다 빨리 진행…사실상 거의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