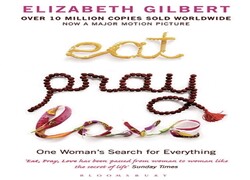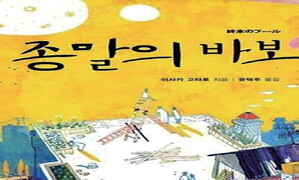1
소설은 이렇게 시작한다. “그들은 젊고 잘 교육받은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둘 다 첫날밤인 지금까지 순결을 지키고 있었다. 물론 요즘에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시절은 성 문제를 화제에 올리는 것조차 불가능하던 때였다.”
그래서 그 젊은 부부의 첫날밤은 어떻게 되었을까. 서툴고 엉망인 전개가 이어지고, 때 이른 사정으로 결합은 불발한다. 그리고 서로를 맹렬히 비난하던 이들은 신혼여행 첫날 헤어진다. 이 작품은 이언 매큐언의 장편소설 이다. 섬세하고 균형 있는 문체로 유명한 작가답게 이 작품은 이런 어이없는 일을 다루면서도 품격을 잃지 않는다. 독자들은 물론 숱한 작가들이 이 소설을 입 모아 칭송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알랭 드 보통과 함께 인생학교를 설립한 의 저자 로버트 롤런드 스미스가 말했듯, 두 주인공은 보수적인 시대에서 해방의 시대로 넘어가던 그 1962년 무렵의 희생자들이다. ‘순결의 상실’이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닌 오늘날의 눈으로 보면 그들은 희생자가 아니라 사실 멍청이에 가깝다. 과연 그럴까.
첫 경험이든 아니든, 결혼 전이든 아니든, 20대든 40대든, 두 사람이 처음으로 신체적으로 결합하는 과정에는 어느 정도의 어색함, 불편함, 불쾌함이 끼어들기 마련이다. 밥 먹을 때는 나타나지 않던 습관, 이야기를 나눌 때는 드러나지 않던 취향, 영화를 볼 때는 알 수 없던 행동의 패턴들. 낯선 그것들이 좋기만 할 리 없다. 그런 것들을 애정으로 견뎌내고 적응해가는 것이 바로 사랑이고 관계다. 작품의 마지막에서 인생의 뒤안길에 선 남자 주인공이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느낀 것도 바로 그런 것이다. 그녀와 헤어지고 세상은 급격하게 해방되었고, 그는 솔직하고 난잡한 연애를 잇달아 하면서 인생을 보낸다. 그런 다음 깨닫는다. 자신의 사랑을 망친 것이 보수적인 시대가 아니라 사랑과 인내의 부족이었다는 것을.
그리하여 보수의 시대도, 해방의 시대도 아닌 오늘은 어떤가. 순결이 지켜져야 한다는 관념에서 벗어나는 것은 좋으나, 경험이 많다고 더 만족스러운 연애를 하는 건 아니다. 한 남자를 잘 아는 일이 빨리 자보는 것일 수는 있으나, 침대 위가 좋은 것과 좋은 애인이 되는 것은 다른 문제다. 더 좋고, 더 열정적이고, 더 만족감을 주는 섹스를 한다고 하여, 다가오는 권태로움을 밀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연애기술서에서 섹스를 잘하는 법을 배운다고, 공중파 TV에서도 건전한(?) 19금이 장려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해서, 이 시대의 사랑의 온도는 절대 높아지지 않는다. 오히려 19세기 말에 벌어진 어처구니없는 해프닝을 읽으며 감동을 받는 21세기라니. 시대의 진보로도 설명되지 않는, 사랑이란 참으로 묘한 것이지 않은가.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장동혁에 발끈한 전한길, 야밤 탈당 대소동 “윤석열 변호인단이 말려”

김어준 방송 ‘정부-검찰 공소취소 거래설’에…민주 “황당함, 기 막혀”

한국 사회와 자존심 싸움…쿠팡 김범석은 ‘필패’ 한다

‘친윤’ 김민수 “장동혁 ‘절윤 결의문’ 논의 사실 아냐…시간 달라 읍소했다”
![[영상] 트럼프 “기뢰선 10척 완파”…CBS “이란 최대 6천개 보유” [영상] 트럼프 “기뢰선 10척 완파”…CBS “이란 최대 6천개 보유”](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11/53_17731951174124_1517731949679662.jpg)
[영상] 트럼프 “기뢰선 10척 완파”…CBS “이란 최대 6천개 보유”

이란 안보수장 “트럼프, 제거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국힘, ‘오세훈·김태흠’ 후보 신청 안 하자…“접수 기간 더 늘려요”

사흘 만에 입 연 장동혁 “의총 결의문이 국힘 입장”

미 국방 “오늘 이란 공격 가장 격렬할 것”…전투기·폭격기 총동원 예고
![[단독] 조희대 대법, ‘재판소원법’ 대응 TF 꾸린다…헌재도 실무 준비 [단독] 조희대 대법, ‘재판소원법’ 대응 TF 꾸린다…헌재도 실무 준비](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10/53_17731217429546_20260127500444.jpg)
[단독] 조희대 대법, ‘재판소원법’ 대응 TF 꾸린다…헌재도 실무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