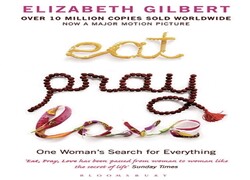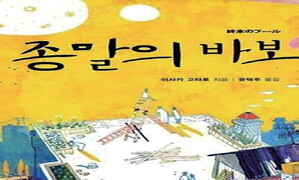사랑의 참고도서라는 글을 쓰면서 어떻게 이 소설을 이야기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을까. 가브리엘 마르케스의 . 어디선가 이 책이 밸런타인데이 추천도서라고 하던데, 이 책은 51년 동안 첫사랑을 기다린 한 남자의 이야기라는 것만으로 당연히 목록에 올라갈 만하다. 그러나 정작 에서 마주하게 되는 건, 매끈하고 감동적인 스토리가 아니라 10대에서 70대가 된 주인공들이 마주하는 엉망진창인 상황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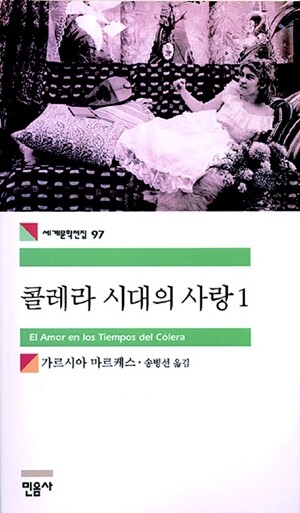
남편이 죽은 다음 옛사랑과 함께하겠다는 노년의 귀부인을 향한 주변의 편견만 힘든 게 아니다. 그들이 떨어져 지낸 시간 동안 각자의 몸과 마음이 겪은 다양한 과거들이 있고, 무엇보다 비밀편지를 주고받던 그들의 열정적인 청춘 시절과 변심해버렸던 그 옛날의 결정은 불쑥불쑥 그들 앞에 등장한다. 그것들은 그들을 다시금 뜨겁게 엮어주는 게 아니라, 그들을 오히려 불편하게 한다. “예전에는 우리가 서로 친한 어조로 말을 했었는데.” 노인의 ‘예전’이라는 단어에 기분이 상한 부인은 “세상의 모든 것이 변했잖아요”라는 말로 들이받는다.
기대를 가지고 이 책을 손에 들었다가 의외로 읽기 쉽지 않았다는 수많은 독자들의 어려움은 바로 이런 데서 발생한다. 그토록 잊지 못했던 첫사랑을 다시 마주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지난날 운명의 어긋남을 탄식하고, 이제라도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다시 뜨겁게 청춘의 열정을 되살리지 않을까. 하나 그런 예상된 장면들이 이 소설에는 없는 것이다.
그들은 탐색전을 벌이며, 마치 처음 연애를 시작하는 커플들처럼 티타임을 반복한다. 노인은 예전과 똑같이 정성스럽게 부인에게 구애를 하고, 때로는 속임수를 쓰기도 한다. 부인은 성숙한 태도를 가진 어른으로 행세하면서도 육체적 접촉 앞에 키스를 갓 배운 여학생처럼 군다.
그러나 그들의 그런 관계를 따라가다보면 우리는 그것이야말로 다시금 뜨거운 사랑을 가능하게 하는 태도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 그들은 주름과 냄새가 가득한 노년의 육체를 끌고 사랑을 해야 한다. 사랑과 열정을 세월과 죽음에 맞서 세우기 위해 그들이 선택한 영리한 전략이다.
우리는 살면서 대나무의 마디마디를 넘어가는 것 같은 시기를 겪는다. 한 마디를 넘고 나면, 이제는 과거가 되어버린 인생의 한 토막을 바라보며 회상에 잠긴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늙는다. 그건 생물학적 나이와 관계없다. 그런 태도가 우리를 노화시키고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소설의 막바지에 두 사람은 함께 배를 타고 여행을 떠난다. 선실에서 시도한 첫 육체적 결합은 실패한다. 그때 노인은 이렇게 말한다. ““죽었소.” 이런 일이 가끔 일어났기에 그는 이 귀신과 같은 존재와 함께 사는 법을 배웠다. 매번 처음인 양 다시 배워야만 했던 것이다.” 그 대목에서 우리는 그들의 해피엔딩을 짐작할 수 있다. 오늘은 못했지만 내일은 청년처럼 뜨겁게 성공하리라는 것을. 매번 처음인 양 다시 시도한다면 말이다.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이정현 국힘 공천관리위원장 사퇴…“생각한 방향 추진 어려워”

미 공중급유기, 이라크 상공서 추락…“적군 공격·오인사격 아냐”

“아빠 좋은 사람으로 기억하길”…60일된 딸 둔 가장 뇌사 장기기증

배현진 “참 어렵게 산다, 장동혁”…징계 중단하잔 말에 SNS 글

한준호 “김어준, 사과·재발방지해야”…김어준 “고소·고발, 무고로 맞설 것”

이하상 “특검 안 나온 재판은 불법” 트집…재판장, 17초 만에 “기각”

정청래 “검찰개혁, 이 정부·민주당의 깃발…제가 물밑 조율”

박지원 “레거시 언론과 언어 차이”…김어준 ‘공소 취소 거래설’ 제기 두둔
![[단독] 청와대, ‘사법시험 부활’ 검토…연 50~150명 별도 선발 [단독] 청와대, ‘사법시험 부활’ 검토…연 50~150명 별도 선발](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11/53_17732246670747_20260311503553.jpg)
[단독] 청와대, ‘사법시험 부활’ 검토…연 50~150명 별도 선발

미국,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관련 조사 개시…한국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