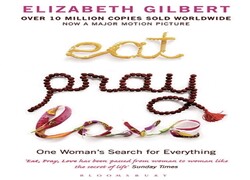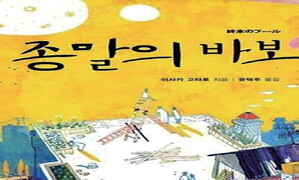스티븐 스트로가츠는 세계적인 천재 수학자. 카오스와 복잡계 이론의 대부로 꼽히는 그의 책에 이런 대목이 있다. 미국에서는 약 10년마다 한 번씩 수학 교수법이 확 바뀌어 부모들을 좌절시키는데, 스트로가츠가 초등학교 2학년일 때 그의 부모는 도움을 주지 못했다. 삼진법이나 벤다이어그램은 들어본 적도 없으셨으니. 그런데 이제 부모가 된 스트로가츠의 차례가 왔다. “아빠, 이 곱셈 푸는 법 좀 알려주세요.” “그야 문제없지.” “그게 아니라고요. 그건 옛날 방식이잖아요. 격자곱셈 방법 모르세요? 부분곱셈은 아세요?”
일단 스트로가츠 같은 사람도 아들에게 이런 굴욕을 당했음에 안도하자. 우리가 수포자(수학포기자)인 것은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다. 그건 교육제도 때문이다. 그런데 그다음 이야기는 좀 다르게 전개된다. 스트로가츠는 학교를 욕하지 않고, 이 일화를 통해 덧셈 사고법과 곱셈 사고법이 뭐가 다른지 설명한다. 수포자인 내가 이해한 바는 이거다. 7×3을 보면 우리는 7을 3번 더하라고 자동적으로 생각한다. 이게 덧셈 사고법이다. 반면 7×3을 보고 이것이 3×7과 동일한 크기라는 것을 상상하는 것, 이게 곱셈 사고법이다.
이걸 이해하면 머리가 오른쪽으로만이 아니라, 왼쪽으로도 회전하는 기분이 든다. 즉, 7×3은 단지 21이라는 숫자를 얻기 위한 식이 아닌 것이다. 이 수식 안에는 많은 이미지와 교환의 마법이 숨어 있다. 스트로가츠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뭘까? 수학은 결과를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것을, 수학의 목적은 실용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數)의 매력 자체를 느끼는 데 있음을, 동일한 문제를 다르게 푸는 방법을 생각해내는 것이 얼마나 기쁨을 주는지를 전해주고 싶은 것이다.
스트로가츠가 에 연재한 수학 칼럼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가득한데, 'X의 즐거움'은 그 글을 모은 책이다. 머리말에서 저자는 수학을 알게 되면 몇 명과 연애를 한 뒤에 결혼 상대를 선택하는 게 좋은지도 알 수 있다고 독자들을 유혹하는데, 사실 그런 이야기는 없다. 그러나 이 책을 읽으면 우리는 수의 세계에 흥분하게 되고, 인간이 화성에 탐사선을 보낼 수 있었던 위대함도 만고 쓸데없는 수학에 매력을 느낀 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뜬금없이 사랑의 참고도서에 웬 수학 책이냐고? 사실 사랑이 먹고사는 데 별 쓸데가 없다. 물론 마음을 위로하고, 쾌락을 얻는 것도 효용이라고 할 수 있다. 혹은 진화론적 설명을 통해 인류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랑은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 시작되지도 않고, 유지되지도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그냥 사랑이라는 어떤 세계가 매력적일 뿐이다. 이 책을 읽으면 머리가 나빠도 수학을 좋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붙는다. 사랑도 그렇다. 사랑을 하는 데 기술과 조건이 뭐가 필요한가. 이 책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수포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하듯, 사랑에 포기가 어디 있는가. 교육제도가 엉망이라고 수학을 포기하지 말기를, 세상이 고통스럽다고 사랑을 포기하지 말기를.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중동 에너지 시설 잿더미로”…이란, 미 하르그섬 공격에 보복 예고

한국 야구, 도미니카에 7회 콜드게임 패…WBC 4강행 무산

트럼프 ‘이란 석유 수출 터미널 있는 하르그섬 파괴’

다카이치 “독도는 일본 땅, 국제 사회 알려야”…민주 “즉각 중단” 촉구

이 대통령 “‘이재명 조폭 연루설’ 확대 보도한 언론들 사과조차 없어”

이정현 “조용히 살겠다…내 사퇴로 갈등 바라지 않아”

“국내 선발 3~4명뿐인 KBO의 한계”…류지현 감독이 던진 뼈아픈 일침

“이정현 전화는 꺼져” 장동혁, 오세훈에 “공천은 공정이 생명”

배현진 “참 어렵게 산다, 장동혁”…징계 중단하잔 말에 SNS 글

두 차례나 ‘공천 미신청’ 오세훈…조건인 ‘선대위’ 위원장 후보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