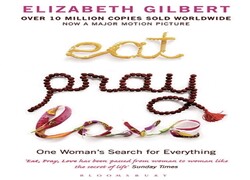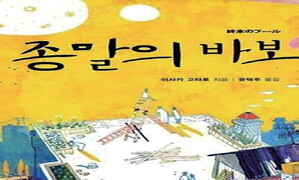소꿉친구였던 남녀가 원산 송도원 해수욕장에서 우연히 만난다. 남자가 독립운동가 부친을 따라 간도로 간 뒤 연락이 끊겼던 것. 다시 만난 두 사람은 금강산 여행에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다. 이후 서울에서의 엇갈림, 그리고 만나지 못하는 동안의 숱한 고난을 딛고 결국 연인은 함경도의 한 과수원에서 재회한다.

보름 만에 초판이 매진되었다는 일제시대 최고의 베스트셀러 의 줄거리다. 베스트셀러였다. 하지만 당시에도 “도대체 왜 이 소설이 인기 있는지 모르겠다”는 평이 분분했다 한다. 너무 뻔한 전개와 허술한 구성이 지금 읽는다고 달라 보일까. 게다가 ‘누군지 아라 맛치세요’라고 표기된 1940년대 초판본으로 읽다보면, 소설을 읽는 게 아니라 한글 공부를 하는 것 같다.
이 뻔한 소설에서 의외로 눈길을 잡은 건 연애의 지리적 범위다. 원산, 평양, 서울로 오고 가는 넓은 범위. 러시아, 중국, 일본 등과 같은 이국을 배경으로 삼아 사랑 이야기에 낭만성을 더하는 것은 근대소설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이다. 근대소설만 그런가. 이 대륙에서 점심 먹고, 저 대륙에서 저녁을 먹는 21세기에도 이런 낭만적인 서사는 살아 있다. 그러나 이 소설에서 유독 특이한 것은 등장인물들이 지리적 거리를 대하는 태도다. 그들은 거리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이를테면 평양의 여성이 부산의 남성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는 게, 마치 오늘은 명동에서 만났으니 내일은 강남에서 만나요 같은 수준이다. 당연히 자주 만나지는 못하겠지만, 서로의 거주 공간이 다르니 연애하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의심도 찾아볼 수 없다. 우리가 평양에 살 수도 있고 개성에 살 수도 있지요라는 식의 태도를 접하고 나면, 서울 중심의 중앙집권화가 망가뜨린 것이 비단 정치·경제만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된다. 불과 70여 년 전일 텐데 삶의 영토, 사랑의 영토가 이리 좁고 획일화될 수 있다는 것이 새삼 놀랍다.
얼마 전 서울에서 한두 시간 떨어진 한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였다. 연애 상담을 해보라 하니 꽤 많은 학생들이 “장거리 연애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나요” “결국 장거리 연애는 헤어지게 되는 거 아닐까요”라고 물어왔다. 잠시 고민하다 자주 보든 가끔 보든, 단거리 커플이든 장거리 커플이든, 밥 먹고 영화 보고 더하여 MT 가는 일의 반복이 데이트일 텐데 미리 겁내지도 말고, 더 잘하려고 애쓰지도 말라는 불친절한 답변을 남겼다.
방금 만나고 헤어져도 잠자기 전 안부 인사가 오지 않는 게 신경 쓰이는 관계가 있고, 드문드문 보아도 상대의 일상이 충분히 짐작되고 나를 향해 웃어주는 것만으로 충만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물으면 누구나 후자를 선택할 것이다. 그런데 KTX와 영상통화와 메신저로 무장한 오늘의 우리는 왜 이리 연애가 불안한가. 그건 내가 관계의 중심에 있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좋은 연애는 중앙집권형이 아니라 지방자치형이다. 그러니 멀리 떨어진 연인들이여 불안해하지 마라. 당신이 있는 곳이 바로 연애의 수도(首都)니까.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다카이치 “독도는 일본 땅, 국제 사회 알려야”…민주 “즉각 중단” 촉구

이란전 안 풀리자…백악관 “가짜 뉴스 CNN” “망해가는 NYT” 비난

트럼프 “이란 완전히 파괴 중…오늘 무슨 일 벌어지는지 보라”

배현진 “참 어렵게 산다, 장동혁”…징계 중단하잔 말에 SNS 글

“이정현 전화는 꺼져” 장동혁, 오세훈에 “공천은 공정이 생명”

이 대통령 “기름값 바가지 신고하세요”…“여기요! 1976원” 댓글 봇물
![[단독] 현대중공업, 노란봉투법 따라 하청노조와 단체교섭하기로 [단독] 현대중공업, 노란봉투법 따라 하청노조와 단체교섭하기로](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13/53_17733948569591_20260312502255.jpg)
[단독] 현대중공업, 노란봉투법 따라 하청노조와 단체교섭하기로

이정현 국힘 공천관리위원장 사퇴…“생각한 방향 추진 어려워”

오세훈 미등록, 이정현 사퇴…난맥상 국힘, 장동혁 대표 선택은

‘미국 vs 일본 4강전 용납 못 해’…또 대회 중 바뀐 WBC 대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