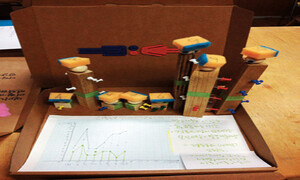최빛나
2011년 3·11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인생에서 두 번 다시 일본에 올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건만 4년도 채 지나지 않아 오게 되었다. 여전히 풍요롭다. 그 풍요로움에 혹해 생선·고기 가리지 않고 이것저것 잘도 먹고 다니고 있다. 아무런 위화감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방사능의 대기는 달달한 파멸에 대한 감각만 가지게 만든다. 도쿄에서 오랜만에 만난 미디어활동가 친구는 후쿠시마 근처의 어촌에 촬영을 갔던 경험을 들려주었다. 마을 분들이 촬영 와준 걸 매우 고마워하며 차려준 저녁상에는 회에 초밥이 그득했다며, 신나게 먹었다는 말에 같이 웃퍼했다.
도쿄의 ‘이레귤러 리듬 어사일럼’(Irregular Rhythm Asylum)이란 곳에 오랜만에 들렀다. 신주쿠에 있는 작은 인포숍(CD·책·포스터를 포함해 다양한 사회적 내용을 담은 인쇄물, 자가 출판물을 판매하는 서점의 역할을 하는 곳. 활동가들이 모여 회의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곳이기도 하다. 운영하는 주체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띤다)이다. 그곳의 주인인 나리타는 세 번째 만나지만 얼굴을 기억 못한다. 그래도 반갑다. 인포숍은 안쪽을 확장해 작은 전시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마침 엄청난 도시화의 변화를 겪고 있는 말레이시아 작가의 판화 작업이 전시 중이다. 동행한 친구는 이곳에 오면 동아시아의 이슈는 거의 다 알 수 있다고 얘기해준다.
1990년대 말부터 혼자 집에서 아나키스트 출판물이나 펑크 출판물을 만들어온 나리타가 의외로 패션을 공부했다는 사실을 이번에 알았다. 아나키스트 그룹에 몸담고 있던 디자이너가 30년 전부터 운영하던 공간에 그가 들어가게 되면서 조금씩 지금의 인포숍 꼴을 갖추기 시작했나보다. “그럼 도쿄에서는 첫 번째 인포숍이겠네?” “음, 그렇긴 한데 모사쿠샤 같은 서점이 인포숍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지?” 모사쿠샤는 지금도 도쿄에서 운영되고 있는, 한국으로 치면 1980년대에 어느 대학가에나 있었던 사회과학서점 같은 곳이다. “아하, 그렇지!” 새삼스럽다. 지금의 인포숍은 네트워크를 만들고 활동가들을 지원해주는 것이 그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는 대답을 낄낄거리며 나누었다.
“사회 이슈에 관심이 많은 디자이너가 많이 있어?” “몇 년 전까진 만나기가 쉽지 않았는데 지금은 꽤 많아.” “좋은 징조인지 아닌지 모르겠네.” “응, 그렇지?” 아지트 같은 그곳에서 커피 마시고 담배 연기 자욱하게 놀고 있으니 느긋하다. 첫 번째 걱정도 두 번째 걱정도 임대료라는 나리타는 11년째 이레귤러 리듬 어사일럼을 운영하고 있다. 대도시에서 이런 자율적인 공간을 운영하는 것의 어려움을 모를 리 없지만 딴말이 필요 있을까. 또 놀러올게요.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단독] 군 특수본, ‘선관위 장악 지시하달’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 기소 [단독] 군 특수본, ‘선관위 장악 지시하달’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 기소](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22/53_17717357343273_20260222501198.jpg)
[단독] 군 특수본, ‘선관위 장악 지시하달’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 기소

몸에 피 한방울 없는 주검이 되어 돌아온 새 신랑

‘어디서 본 듯한’....국힘 이정현 야상 점퍼 ‘시끌’

태진아 “전한길에 법적 대응”…일방적으로 콘서트 참석 홍보·티켓 판매

최시원, 윤석열 선고 뒤 “불의필망”…논란 일자 SM “법적 대응”
![지귀연 ‘무죄 판결문’ 썼다 고친 흔적, 변심한 계기는? [논썰] 지귀연 ‘무죄 판결문’ 썼다 고친 흔적, 변심한 계기는? [논썰]](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6/0220/20260220502864.jpg)
지귀연 ‘무죄 판결문’ 썼다 고친 흔적, 변심한 계기는? [논썰]

이 대통령, 인천시장 출마 박찬대 글 공유하며 “안중근 의사 유묵 귀환 환영”

“당 망치지 말고 떠나라”…‘절윤 거부’ 장동혁에 쏟아지는 사퇴 요구

미, ‘무역법 301조’ 관세 예고…한국에도 새 위협 될 듯
![[단독] ‘양재웅 정신병원’ 주치의 구속 4개월 만에 보석…유족 반발 [단독] ‘양재웅 정신병원’ 주치의 구속 4개월 만에 보석…유족 반발](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21/53_17716543877486_20241013501475.jpg)
[단독] ‘양재웅 정신병원’ 주치의 구속 4개월 만에 보석…유족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