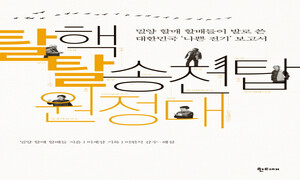1
대학의 영리사업체화, 취업률 등 각종 통계수치를 내세운 학교 홍보, 직업교육 과목의 증가, 취직을 위한 진학…. 학문의 전당으로서의 역할을 잊은 채 교육 장사에 열 올리는 1900년대 초 미국 대학을 비판한 (홍훈·박종현 옮김, 길 펴냄)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현재 한국의 대학을 꼬집는다.
이 책은 경제학자이자 사회학자인 소스타인 베블런(1857~1929)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참여관찰기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노르웨이계 이민 2세로, 미국 주류 사회의 이방인으로 평생을 살았다. 1884년 예일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나 교수직을 구할 수 없어 7년간 백수로 지냈다. 어렵사리 들어간 시카고대학에서는 대학총장과의 불화 등으로 일을 그만두고, 스탠퍼드대학, 미주리대학 등을 전전했다. 주류 경제학과 자본주의에 비판적인 태도를 고수했던 그는 과시적 소비를 일삼는 부유층인 유한계급을 꼬집는 을 썼다.
베블런은 기업형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학문 탐구보다 직업교육에 열중하는 대학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지식의 영역을 보존하고 확장해야 하는” 대학의 본분을 잊고 있다는 것이다.
직업학교로 변질된 대학 안에는 기업의 논리에 물든 지배구조도 뿌리를 깊게 내렸다. 학자들의 지식 추구를 평가할 능력이 없는 기업인이 이사회에 들어간다. 그 이사회에서 대학총장을 선임하고 그들이 뽑은 총장은 독단적 권력을 갖는다. 기업인 이사들과 총장은 예산 책정 등을 할 때 대학을 학문 탐구의 장소로 보지 않고 기업체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이들은 금전적 이득만을 따지고 학교를 대외적으로 선전하기 위해 통계자료를 활용해 학교의 실적을 보여주고 입학생 수 등을 광고하는 데 열중한다. 학교 마케팅의 대상은 학교에 거액의 기부금을 낼 수 있는 지역사회의 부유층이다. 그러면서도 실험실과 교육자재, 도서관 등에 대한 투자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책을 번역한 홍훈 교수는 “중세에 철학이 신학의 시녀였던 것과 유사하게 근대에 학문이 금전의 시녀가 된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베블런은 존재의 의미를 잃고 병들어가는 대학을 위한 처방전을 내놓는다. 학부 교양교육은 중등교육기관으로, 전문대학원의 전문인력은 전문교육기관으로 넘기고 대학은 대학원 중심의 연구를 해야 한다고. 그것이 학문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대기업이 인수한 대학들이 갈수록 상업화되고 취업률을 잣대로 학과를 통폐합하는 등 21세기 한국 대학은 베블런 시대의 대학과 다르지 않다. 우리 사회에서 대학이 담당해야 할 역할이 무엇이며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 이 책을 거울 삼아 생각해볼 일이다.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사법개혁 3법’ 통과 앞…시민단체들 “법왜곡죄, 더 숙의해야”

‘윤석열 출국금지’ 국회 보고했다고…박성재 “야당과 결탁했냐” 질책

배현진 지역구 공천, 중앙당이 하기로…친한계 공천권 제한

전한길은 ‘가질 수 없는 너’…가수 뱅크도 윤어게인 콘서트 “안 가”

몸에 피 한방울 없는 주검이 되어 돌아온 새 신랑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대낮 음주운전…감봉 3개월

트럼프 “대법 결정으로 장난치는 국가, 훨씬 더 높은 관세 부과” 경고
![그렇게 형이 된다...감독 김남국, 주연 정청래 [그림판] 그렇게 형이 된다...감독 김남국, 주연 정청래 [그림판]](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6/0223/20260223503467.jpg)
그렇게 형이 된다...감독 김남국, 주연 정청래 [그림판]

이 대통령 “나의 영원한 동지 룰라”…양팔 벌려 꽉 껴안아

김혜경 여사·브라질 영부인, ‘커플 한복’ 맞추고 친교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