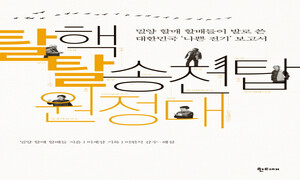1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은 계속되고 있다.
한 해 평균 2천여 명이 일하다 죽는다. 하루 평균 6∼7명, 4시간에 1명씩 목숨을 잃는 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산재사망률 1위인 산재공화국, 바로 대한민국의 비참한 현실이다.
르포집 (오월의봄 펴냄)는 ‘위험한 일터’ 조선소와 건설 노동자, ‘구조조정이 죽음을 부른’ 코레일과 KT 노동자, ‘시간에 쫓겨 달리는’ 우체국과 택배·퀵서비스업체 노동자, ‘발암물질의 위험 안은’ 반도체공장 노동자, ‘감정노동에 지쳐가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전한다. 그들의 일터에 똬리를 틀고 있는 산업재해 문제를 드러낸다.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또 다른 세월호’는 사회 곳곳에 있었다. 등을 쓴 기록노동자인 지은이는 안전과 관련해 제 목소리를 내기 힘든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험한 일에 내모는 ‘위험의 외주화’, 생존권을 위협하는 구조조정의 칼바람 등에 스러지는 노동자를 만난다. 그들을 통해 안전에 대한 투자가 손익계산서 앞에서 무력해지는 사회, 더 가난하고 더 힘없는 사람들에게 위험이 전가되는 사회의 민낯을 보고 듣는다.
대부분의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중소영세업체에서 일어난다. 2010년, 직원 1천 명 이상을 둔 기업에서 산재로 125명이 죽는 동안 직원 5명 미만 사업장에서는 534명이 죽었다. 그해 전체 산재 사망 노동자 2114명 중 60% 넘는 죽음이 중소영세사업장에 몰려 있다. 결국 힘없는 노동자가 더 힘든 일, 위험한 일을 하며 더 많이 죽는다. 다단계 하도급으로 악명 높은 건설 현장에서 산재율이 가장 높다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한다. 게다가 공사 기간을 줄여 최대한의 이윤을 뽑아내는 과정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발주처나 원청은 아예 처벌받지 않거나 솜방망이 처벌만 받는다.
외국의 경우는 어떤가. OECD의 많은 국가들은 산재를 ‘구조적 살인’으로 규정하고, 영국에서는 산재 문제에서 위법행위자뿐만 아니라 기업주도 함께 처벌하는 ‘기업살인처벌법’을 만들었다. 업무와 관련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업에 상한선 없는 벌금을 부과한다. 법 제정 이후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기업들의 투자와 관심이 커지면서 영국의 산재 비율은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모든 산재, 모든 참사는 탐욕에 눈먼 자본이 불러온 예고된 재난”이라고 말하는 지은이는 이 재난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우리 사회에 각성과 변화를 촉구한다. “안전에 투자해야 안전해진다. ‘안전을 지키지 않을 때의 비용’을 높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기업들이 안전에 대한 투자를 하게 만들 강제력과 경각심이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 노동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또 다른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한 절규 섞인 외침이다.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배현진 지역구 공천, 중앙당이 하기로…친한계 공천권 제한

전한길은 ‘가질 수 없는 너’…가수 뱅크도 윤어게인 콘서트 “안 가”

‘윤석열 출국금지’ 국회 보고했다고…박성재 “야당과 결탁했냐” 질책

‘노스페이스’ 영원그룹 회장, 82개 계열사 은폐해 고발 당해

조희대, 민주당 사법 3법 ‘반대’…“개헌 해당하는 중대 내용”

정부, ‘엘리엇에 1600억 중재판정’ 취소 소송서 승소…배상 일단 면해

‘사법개혁 3법’ 통과 앞…시민단체들 “법왜곡죄, 더 숙의해야”
![그렇게 형이 된다...감독 김남국, 주연 정청래 [그림판] 그렇게 형이 된다...감독 김남국, 주연 정청래 [그림판]](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6/0223/20260223503467.jpg)
그렇게 형이 된다...감독 김남국, 주연 정청래 [그림판]

몸에 피 한방울 없는 주검이 되어 돌아온 새 신랑

‘팔짱 케미’ 룰라 사로잡은 이 대통령 선물…전태일 평전, K-화장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