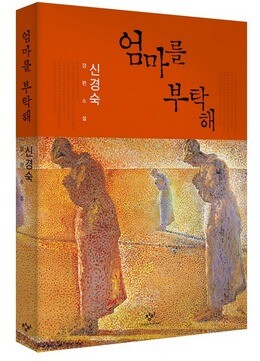
<엄마를 부탁해>
신경숙 지음, 창비 펴냄, 1만원
신경숙(45)씨의 새 장편소설 는 상실과 회복에 관한 이야기다. 무엇을 잃고 무엇을 되찾았는가.
소설은 “엄마를 잃어버린 지 일주일째다”라는 문장으로 문을 연다. 그렇게 잃어버린 엄마를 되찾는 과정이 에 그려진다. 아니, 사실 엄마는 되찾아지지 않는다. 에필로그를 보라. “엄마를 잃어버린 지 9개월째다.”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냥 상실의 드라마일 뿐이지 않나? 그렇지가 않다.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지만, 결국 되찾아졌다. 이 모순과 역설에 소설 의 핵심이 들어 있다. 부부 합동 생일잔치를 위해 상경한 엄마가 혼잡한 지하철 서울역에서 남편을 놓친다. 애초에 문맹인데다 치매까지 겹친 엄마는 기다리는 식구들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거리를 떠돈다. 자식들은 전단지를 만들어 붙이고 배포하면서 엄마를 목격했다는 사람들을 찾아가 만나지만 끝내 엄마를 발견하지는 못한다. 소설은 4개의 장과 에필로그로 이뤄졌는데, 네 장은 차례로 첫째딸과 장남, 남편 그리고 엄마 자신의 시점으로 진행되며 에필로그는 다시 딸의 시점으로 돌아간다.
엄마 자신을 포함한 네 사람의 이야기는 조각보처럼 합쳐져 ‘엄마’의 실체를 완성한다. 엄마를 잃어버리고, 엄마를 찾고자 몸부림을 치면서 남은 가족들이 새삼 깨닫는 것은 자신들이 그동안 엄마를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먼저, ‘너’로 호칭되는 첫째딸. “너는 더 이상 엄마를 안다고 말할 수 없게 되었다는 생각을 했다.”(34쪽) 그리고 ‘당신’으로 불리는 남편. “당신은 아내에게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았다.”(144쪽) 마지막으로 둘째딸. “엄마를 모르겠어. 엄마를 잃어버렸다는 것밖에는.”(209쪽)
무언가를 알아가는 일의 첫 순서는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를 아는 것이다. 여기서 가족들이 고백하는 것은 자신들이 엄마를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만이 아니다. 그렇게 모른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는 고백인 것이다. 그렇지만 자신들이 엄마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써 비로소 가족들은 엄마를 알아가는 첫발을 뗀 셈이다. 이것은 말하자면 0과 1의 관계와도 같아서, 작지만 근본적인 차이에 해당한다.

신경숙(45)씨. 한겨레 김종수 기자
소설가 딸과 문맹 어머니라는 설정은 작가 자신과 어머니의 상황과 일치한다. 그런 만큼 구체적인 감동으로 다가온다. 일찌감치 홀몸이 된 외할머니의 선택에 의해 학교를 다니지 못하게 된 엄마는 “불 꺼진 것만치로 캄캄하게, 평생을 캄캄하게”(72쪽) 살아야 했다. 그다지 유복하지 못한 농가 출신인 ‘너’가 도시의 상급학교로 진학하고 결국 소설가가 될 수 있었던 데에는 “야를 나처럼 살게 할 순 없”(109쪽)다는 엄마의 고집이 결정적 구실을 했다.
“과연 네가 구사하는 어느 문장이 잃어버린 엄마를 찾는 데 도움이 될지”(11쪽)라는 건 엄마를 찾는 전단지의 문구 작성을 맡게 된 소설가 딸 ‘너’의 마음을 담은 문장이다. 그러나 이 문장을 소설 전체로 확대해보면, 라는 소설 자체가 잃어버린 엄마를 마침내 글을 통해 되살려내는 과정이 아니겠는가. 돌아오지 않은 엄마를 되찾았다고 우긴 것은 이런 뜻이다.
기자들과 만난 작가는 이렇게 말했다. “엄마가 곁에 존재하고 있을 때,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누리세요. 아직 늦지 않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 소설이 누구에게나 위로가 되는 소설이 되었으면 해요. 엄마가 있는 이나 엄마가 이미 세상에 없는 이에게도. 그리고 엄마 자신들에게도.”
최재봉 문학전문기자 한겨레 문화부문 bong@hani.co.kr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전임자도 “반대”…이성윤 ‘조작기소 대응 특위 위원장’ 임명에 민주당 발칵

‘마스가’ 청사진 나왔다…백악관, ‘미 조선업 부활’ 계획 공개

롯데 “나승엽·고승민 등 대만서 불법 도박장 출입…즉각 귀국 조치”

기상 악화에도 “치킨은 간 모양이네요”…이 대통령, 연평도 해병대 격려

이 대통령 “집 팔라고 강요 안 해…시장 정상화는 계속”

“좌파 칼부림 정점…윤 탄핵 뒤 ‘통일교 게이트’ 우려” 내부 문자 드러나

설 연휴 첫날, 서울→부산 6시간10분…오전 11시∼정오 ‘정체 절정’

이 대통령, ‘정영학 녹취록’ 의혹에 “검찰의 황당한 증거 조작” 비판

10만명 생계 달린 홈플러스, 살릴 시간 20일도 안 남아…“제발 정부가 나서달라”

‘트럼프 관세’ 90%, 돌고돌아 결국 미국인이 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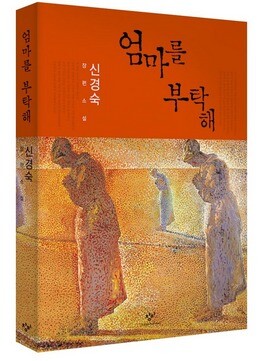





![마침내 극우에 표 던진, 공장노동자 내 어머니 [21이 추천하는 새 책]](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original/2026/0102/20260102502102.jpg)
![‘인류 죽음의 전문가’가 되짚는 남편의 죽음[21이 추천하는 새 책]](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original/2025/1225/2025122550255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