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레이브 하트 효과’라 불릴 만큼 영화 <브레이브 하트>는 스코틀랜드 사람들의 정체성에 강력한 충격파를 던져주었다. 민족을 표상하는 문화는 수많은 집단에 의해 이용된다.
‘테세우스의 배’가 있다. 나뭇조각 100개로 이뤄진 배를 상상해보자. 조각마다 자연수가 1부터 순서대로 적혀 있다. 낡은 조각을 1년마다 하나씩 새것으로 바꾸면서 음수를 -1부터 차례대로 붙인다. 그러면 100년 뒤 배는 음수가 적힌 나뭇조각만으로 이뤄진다. 이 배는 100년 전 것과 같은 배인가 다른 배인가. 고전기 그리스 에서 비롯한 ‘테세우스의 배 역설’로서, 정체성(혹은 동일성·Identity) 물음의 좋은 예다. 흔한 입말로 ‘무엇다움’이나 ‘무엇답게’로 표현되는 정체성이 까다로운 철학적 문제로 둔갑하는 순간이다. 법률 용어로 개인과 법인을 가르듯, 정체성도 개인과 사회(또는 민족)로 쪼개진다. 그리고 둘은 분자와 분모 사이처럼 서로 얽혀 있다. 분모가 클수록 분자는 작듯이, 사회(민족)의 입김이 세면 개인은 옹색해진다. 이 때문에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이 온전하려면 ‘내가 속한 민족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닿아야 한다.
(이후 펴냄)은 민족 정체성을 사통팔달 훑는 책이다. 영국 맨체스터 메트로폴리탄대학 교수(문화지리학)인 지은이 팀 에덴서는 첫머리에서 “민족 정체성은 세계화 상황 속에서도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민족은 정체성을 구성하는 강력한 실체로 남을 것”이라고 전제한다. 이어지는 논리의 열쇳말은 일상, 행위자성, 대중문화 셋이다. 지은이가 보기에, 일상 또는 일상성이란 반복·파편화의 성격 탓에 인간을 소외시키는 공간이지만 저항과 창조적 행위를 낳는 역동적 자리이기도 하다. 그래서 거대한 사회구조에서 능동보다 피동으로 내몰리기 쉬운 개인들의 지각·경험·행위에 좀더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의 일상 영역 가운데 주요한 부분이면서 행위자성이 발현되는 도구이자 현장인 대중문화를 지은이가 파고드는 이유다.
이 책의 장점은 민족 정체성을 다루면서도 고담준론으로 흐르지 않는다는 데 있다. 앞선 학자들이 주로 세련된 고급문화에 치우친 사실을 지적하면서, 지은이는 일상과 대중문화에 눈길을 돌려야 한다고 말한다. 그가 보기에 문화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협상되는 것”이다. 민족 정체성 역시 “한번 정해지면 영원히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동적이고 대화적인 것”이며 “이미지, 지식, 공간, 사물, 담론, 실천 같은 광범위한 문화 지형 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것은 리처드 로티가 말한바 “중심 없고 우발적인 그물”과 같으며 다양한 하위 요소들을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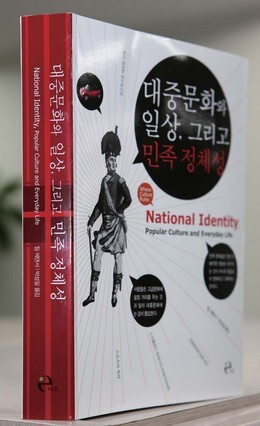
<대중문화와 일상, 그리고 민족 정체성>
시골 하면 떠오르는 풍광은 민족마다 다르다. 그 민족의 상징적 명소들 역시 제각각이다. 인도 사람에게 타지마할이 주는 ‘다양한 느낌’은 한국인이 보는 불국사에 견줄 수 있다. 대중이 만나거나 집회를 여는 공간도 그렇다. 뉴욕의 타임스퀘어, 런던의 트래펄가 광장, 뭄바이의 인디아게이트는 각각 그곳만의 ‘아우라’를 드러내지만 제삼자에겐 그렇지 않다. 더 미시적으로 생각할 때, 한국 고속도로의 시설물이나 도로 모양 등은 독일의 그것과 다를 수밖에 없다. 이를 요약한 개념이 ‘장소애’(Topophilia)다. 물리적 공간이 이러하므로 여기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삶 또한 맞춤하게 바뀌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것을 ‘물리적 경관’(Landscape)에 견줘 ‘행위경관’(Taskscape)이라 이른다. “민족 정체성은 민족 공간과 결부된 일련의 감각, 경관, 사물, 표현물을 통해 예배, 공원, 도서관, 구멍가게, 동시간적 습관과 의례, 추억을 만들어내는 장소들에서 강화된다.”
스포츠나 축제 같은 퍼포먼스에서도 민족 정체성은 견고하다. “익숙한 활동이 적절하고 무의식적으로 수행되는 편안함 속에서” 생겨나는 까닭이다. 특히 대중매체는 뉴스와 드라마, 코미디뿐 아니라 민족 정체성을 나르는 도구로도 막강하다. 물론 민족 구성원들이 모두 동질적인 방식으로 문화를 소비하고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미디어 개수만큼 시청과 해석 또한 여럿일 것이다. 그러나 “텔레비전과 여타 매체들이 공간을 형성하고 시간을 배열하는 데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은 너무도 또렷하다. 프로그램이 취소되거나 일간지가 배달되지 않을 때를 상상해보라. 그 순간 대중매체의 역할은 강렬하게 드러난다.
이 모든 논의들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지은이는 책 끝에 영화 (1995)를 들었다. 영화는 13세기 스코틀랜드의 전설적 투사인 윌리엄 월러스가 잉글랜드 점령군에 맞서 벌이는 독립 투쟁사를 다뤘다. 당시 의회 설립을 앞두고 있던 스코틀랜드는 할리우드 대작 가 개봉되자 홍역을 앓았다. 이른바 ‘브레이브 하트 효과’라 불릴 만큼 영화는 스코틀랜드 사람들의 정체성에 강력한 충격파였던 것이다. 민족을 표상하는 문화가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통해 순환되고 수많은 집단에 의해 이용된다는 것이 지은이의 분석이다.
바퀴벌레 다섯 마리를 비커에 넣고 뚜껑을 얹는다. 달아나려 뛰어오르던 바퀴벌레들은 뚜껑에 부딪혀 떨어지고 만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바퀴벌레는 제 몸이 뚜껑에 닿을 정도 이상으로는 뛰어오르지 않는다. 다시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 뚜껑을 열어도 상황은 그대로 유지된다. 형성된 조건은 행위를 제약하며, 조건이 사라져도 행위는 습관으로 남는다. 상황은 그만큼 무섭다. 민족 정체성에 대한 궁리가 절실한 이유다. 그것은 ‘나답게’ 살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를 거의 선험적으로 규정할 만큼 강력하다. 텔레비전·신문 같은 대중매체가 인간의 ‘연장된 감각’이라면 그것은 ‘연장된 피부’처럼 우리에게 들러붙어 있다. 요컨대 “민족 정체성은 ‘우리는 누구인가, 어디에서 왔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무엇이 될 것인가’의 문제”라는 게 지은이 주장의 척추다.
전진식 기자 한겨레 편집2팀 seek16@hani.co.kr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조희대 “재판소원법, 국민에 엄청난 피해…국회 설득해야”

최소 1억…전한길 “윤석열 중심 제2건국 모금”
![[르포] 승려들 3700㎞ 침묵 행진…신음하는 미국 뒤흔들었다 [르포] 승려들 3700㎞ 침묵 행진…신음하는 미국 뒤흔들었다](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12/53_17708503026486_20260212500217.jpg)
[르포] 승려들 3700㎞ 침묵 행진…신음하는 미국 뒤흔들었다

국방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로 비워준 용산 청사로 다시 돌아온다

미국의 30배…‘초고밀집’ 한국 원전 미어터진다

‘태극기’ 접더니 ‘받들어총’…오세훈의 논란 사업, 결국 중단되나
![빛의 속도로 줄어들었나, 그 영향력 [그림판] 빛의 속도로 줄어들었나, 그 영향력 [그림판]](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6/0211/20260211503934.jpg)
빛의 속도로 줄어들었나, 그 영향력 [그림판]

‘박근혜 오른팔’ 이정현, 국힘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 내정

몸에 피 한방울 없는 주검이 되어 돌아온 새신랑

“문 열고 달리는 기분”…이 대통령 SNS 정책 ‘투척’에 초긴장






![마침내 극우에 표 던진, 공장노동자 내 어머니 [21이 추천하는 새 책]](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original/2026/0102/20260102502102.jpg)
![‘인류 죽음의 전문가’가 되짚는 남편의 죽음[21이 추천하는 새 책]](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original/2025/1225/2025122550255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