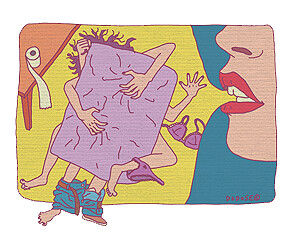▣ 김소희 기자 sohee@hani.co.kr
“입으로만 백한 가지 체위를 일삼는 우리 커플을 씹어주오.” 한 커플의 당사자가 스스로를 고발한 내용이다. 그들이 실제 구사하는 체위는 백한 가지 중에서 아흔아홉 가지를 뺀 것이다. 누가 위에서 하느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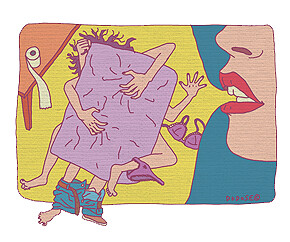
그는 눈치 보며 하는 섹스, 체위나 장소 개발 없는 ‘선교사 섹스’만 하는 자기네는 공개 반성문을 써야 한다고 자조했다. 원인도 자가진단했다. “사실 만나자마자 선 채로 벗기고 ‘후루룩 쩝’ 하고 싶지만, 소파나 마루에서도 뒹굴고 싶지만, 마음뿐이다. 정작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자동 브레이크가 걸린다. 내가 너무 밝히는 사람으로 보일까봐. 부담을 줄까봐.”
그리하여 무성의해지거나 아예 안 하게 된단다. 한마디로 존재가 의식을 배반하는 셈이다. 어째야 할까. 근면 자조 협동하라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는데, 이거 남 얘기 아니지 않나.
얼마 전 심야에 오랜만에 거사를 치를 때 애가 깨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모야 모야”(뭐해 뭐해)를 연발하는 통에 김이 새버렸다. 모처럼 남부럽지 않게 하나 했건만. 원만한 성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는 늘 우리 곁에 있다.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 체력 저하와 의욕 상실, 자다 깬 젖먹이의 존재 같은 천재지변, 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이라크 파병(이게 왜 문제냐고 여기시는 분은 그냥 편히 섹스하세요)….
오랫동안 불임 커플을 상담해온 분 얘기가, 섹스가 어느 순간 ‘임신 시도’가 되면 그때부터 불안해져 될 것도 잘 안 되는 게 인지상정이란다. 현대인의 복잡다난한 생활을 고려하지 않고 많은 산부인과 병원에서는 “피임 안 한 지 얼마나 됐나?” 물은 뒤 1년만 지났다고 해도 ‘불임 의심’ 판정을 기계적으로 내린다(맘씨 좋은 의사는 2~3년을 보기도). 매달 정해진 날에 ‘시도’하다 보면 그밖의 날에는 시도조차 안 하게 된다. 얼마 동안 피임을 안 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어떻게 하느냐가 더 고려돼야 하지 않을까?
하느냐, 남느냐. 내 옆자리 쌔끈남의 섹스 철학은 두 가지다. 상대가 원하면 무조건 한다. 단, 계속 이어지는 사이이고 싶다면 안 한다. 한창 때의 싱글인 그는 성적 지루함이나 섹스의 완성도는 고민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좋겠다. 둘 중 하나만 고르면 되다니. 안정적인 커플의 머릿속에는 백한 가지 정도의 고민이 들어 있다. 고민이 깊다 보면 “우린 섹스 없어도 친구처럼 잘 지내요”라고 묻지도 않았는데 떠들고 다니기도 한다. 그러다 자칫, 평생 친구로만 지낸다.
몇 년 전 ‘그레이 로맨스’ 기사를 쓸 때 만났던 한 칠순 어르신은 “갖다 대기만 해도 좋은 거”라고 섹스를 정의했다. 그리고 “없으면 혼자서라도 해야지”라고 덧붙였다. 성생활을 지속하는 노인일수록 자아존중감(남성)과 현실만족도(여성)가 높다는 연구도 있었다. 섹스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횟수나 강도가 아니라 지속성 여부라고도 한다. 게으름 피우거나 이것저것 따지다가 ”나도 섹스리스예요”라고 커밍아웃하게 되지 않을까. 섹스도 안 하면 준다. 하면 는다.
살다 보면 하기 싫은 일을 꾸역꾸역 해야 할 때가 있다. 회사 나오는 거, 일하는 거, 때론 몸 섞는 것도.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러면 상대도 그렇다는 거다. 과도한 계를 경계하자.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임은정, ‘한명숙 사건’ 소환해 백해룡 저격…“세관마약 수사, 검찰과 다를 바 없어”
![[단독] 김용현 변호인 ‘감치 15일’ 집행 못 했다…남은 5일은? [단독] 김용현 변호인 ‘감치 15일’ 집행 못 했다…남은 5일은?](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26/53_17720869463045_20260226502791.jpg)
[단독] 김용현 변호인 ‘감치 15일’ 집행 못 했다…남은 5일은?

국힘 지지율 17% “바닥도 아닌 지하”…재선들 “절윤 거부에 민심 경고”

‘재판소원 육탄방어’ 조희대 대법원…양승태 사법농단 문건 ‘계획’ 따랐나

‘법왜곡죄’ 위헌 소지 여전…판사들 “누가 직 걸고 형사재판 하겠나”

조희대, ‘노태악 후임’ 선거관리위원에 천대엽 내정

동사무소 직원 ‘점 하나’ 실수로 남동생이 남이 되었다

박정훈, ‘항명’ 기소 군검사 재판서 “권력의 사냥개들” 비판

기초연금 개편, 차등 지급·수급자 감축 검토

러시아 “돈바스 내놓고 나토 나가”…선 넘는 요구에 우크라전 종전협상 ‘난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