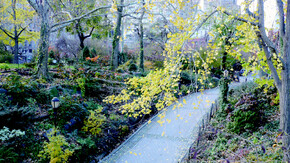반갑구나 ‘고향의 맛’
잘 먹고 (잘) 살기가 쉽지 않다. 날씬한 외양이 왠지 불길했던 ‘미쿡쌀’을 큰맘 먹고 사봤다. 밥솥에서부터 찰기 하나 없이 따로 놀던 놈들은, 볶음밥을 만들 땐 프라이팬 위에서 사방으로 흩날려 나를 슬프게 만들었다. 별 생각 없이 밖에서 끼니를 때우다 보니 하루 종일 밀가루에 설탕 덩어리만 집어먹다 체형부터 미국식으로 변모하기 십상이었다. 아침 대용 거리를 찾아 둘러본 마트에선 가격과 칼로리는 반비례하고 가격과 영양가는 정비례하는 슬픈 현실을 목도했다. 풀과 육류와 곡기가 적절한 조화를 이룬 우리네 식단은 아름답도록 민주적인 ‘웰빙’이었던 셈이다.
여기가 어딘가. (지갑 사정에 개의치 않을 수 있다면) 세계 최고 수준의 다양성이 (최소한 레스토랑에서만큼은) 보장되는 도시, 뉴욕이다. 족발에 보쌈, 솥뚜껑 삼겹살, 포장마차식 횟집까지 뉴욕 구석구석을 뒤져 찾지 못할 한식이 없다. (아마도 개고기 정도가 예외 아닐까.) 많이 알려졌다시피, 맨해튼 안에서는 5번과 6번 애비뉴 사이 32번가 한인타운, 혹은 코리아웨이(Koreaway)가 고향의 맛이 그리운 응급 상황에서 찾을 만한 동네다. 분식집 떡볶이, 순대 등을 한국에서의 열 배 가까운 가격에 사먹을 땐, 반가워서인지 속이 아파서인지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 앞을 가린다. 그러나 일상적으로 드나들기에 32번가는 물리적으로 멀고, 가격은 아무래도 부담스럽다.
다들 모여서 테이크아웃 음식을 펼쳐놓고 먹는 저녁 수업 직전의 강의실. ‘니 맛도 내 맛도 아닌’ 5달러짜리 샌드위치 쪼가리를 씹던 차에 포착된, 옆자리 동기의 나물 모둠(!)에 이성을 잃은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헉! 그, 그거 어디서 산 거야?” 평소 본의 아니게 과묵한 한국인의 면모를 유감없이 선보이던 나의 돌변한 모습에 흠칫 놀란 동기는 근처 학생들 사이에 꽤 유명한 ‘코리안 델리’를 내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더욱 놀란 눈치였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어린 미국인 동기 3인의 가이드 덕분에 ‘와와’라는 이름의 한국 매점을 찾게 된 어리바리한 한국인 1인은 ‘Kimbop’ ‘Bibimbop’ ‘Pajun’ ‘Namul’ ‘Kimchi stew’(김치찌개) ‘Kimchi Fried Rice’(김치볶음밥) 등 정겨운 메뉴가 빼곡한 그곳에서 마음의 고향을 (맛)봤다. 5달러에서 10달러에 이르는 착한 가격 역시 고향 인심을 연상시키는데, 셀프서비스라 팁도 필요 없다! 벽안의 동기들은 쓸 만한 한국 식당 하나 꿰지 못하는 쓸모없는 한국인 동기에게, 32번가 바깥에서 괜찮은 ‘Mandoo’와 ‘Kimchijjige’를 먹을 수 있는 뉴욕의 ‘핫스폿’을 앞다퉈 알려주었다.
고추장 없이 허여멀건한 ‘Bibimbop’은 이곳에서 완벽한 웰빙 메뉴이고, 스시가 아닌 ‘Kimbop’을 언급하는 것은 아시안 요리에 대한 남다른 식견을 자랑할 수 있는 기회이며, 오코노미야키와는 차별되는 ‘Pajun’을 능숙한 젓가락질로 찢는 것이 세계화 시대 교양인의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걸 덤으로 알게 됐다. 수업 시간마다 언급되는 ‘냄준팩’ 혹은 ‘Nam June Paik’(그러니까, 백남준)보다 술자리에서 시작된 ‘맨두’ 혹은 ‘Mandoo’(그러니까, 만두)와 딤섬·덤플링의 차이에 대한 토론이 더욱 반가웠다. 익숙한 무엇인가가 이국에서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됨을 확인하는 것은 현지 적응의 초급 단계. 이 흥미진진한 수업에, 음식만큼 완벽한 교재는 없었다.
오정연 자유기고가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단독] ‘쿠팡 가만 안 둬’ 스코틀랜드 3위 연기금, 총대 메고 소송 전면전 [단독] ‘쿠팡 가만 안 둬’ 스코틀랜드 3위 연기금, 총대 메고 소송 전면전](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5/1217/53_17659590361938_241707891273117.jpg)
[단독] ‘쿠팡 가만 안 둬’ 스코틀랜드 3위 연기금, 총대 메고 소송 전면전

김성태 “검찰 더러운 XX들…이재명, 말도 안 되는 것들에 엮여”

법원, 배현진 ‘당원권 1년 박탈’ 징계 효력정지

“키 206cm 트럼프 아들을 군대로!”…분노한 미국 민심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식으로 국민을 속이나 [박용현 칼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식으로 국민을 속이나 [박용현 칼럼]](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04/53_17726118413306_20260304503108.jpg)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식으로 국민을 속이나 [박용현 칼럼]

트럼프, 쿠르드족 ‘대리전’ 구상…이란 내부반란 노린 듯

‘홍보천재 김선태 잡아!’ 복지부부터 기아차까지 3만개 댓글 폭발

선관위, 부정선거 음모론 차단…사전투표함 받침대 투명하게
![결국 너의 집 앞이야 [그림판] 결국 너의 집 앞이야 [그림판]](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6/0305/20260305503520.jpg)
결국 너의 집 앞이야 [그림판]

“유심 교체하고 200만원씩 이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