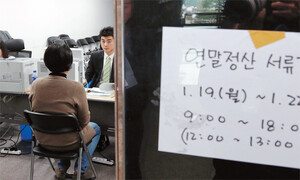원전에 대한 강의를 하고 나면 흔히 받는 질문이 있다. ‘강의를 들어보니 원전은 안전하지도 않고 경제적이지도 않고 수십만 년을 보관해야 하는 폐기물을 남기는 등 문제가 많은데, 왜 우리나라는 원전을 계속 하려고 하느냐?’ 사실 이것이 지금 시기에 가장 필요한 질문이다.
질문에 대한 내 대답은 간단하다. ‘원전으로 이익을 보는 집단이 있고, 이들이 정책 결정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의학계의 정설은 ‘안전한 방사능은 없다’
원전을 하는 나라에는 어느 국가나 이런 집단이 있다. 이들을 ‘핵마피아’ 또는 ‘원전마피아’라고 부른다. 이들은 산업계뿐만 아니라 정치, 행정, 언론, 전문가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교수·박사 같은 타이틀을 가진 사람들 중에도 원전마피아로 분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연구용역을 받고 정부나 산업계에 불려다니며 돈과 명성, 그리고 힘을 얻는다. 원전마피아들은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많다. 권력, 돈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매체가 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원전이 안전하다고 홍보한다. ‘한국 원전은 비행기에 부딪혀도 끄떡없다’는 얘기가 언론에 등장한다. 그러나 원자로가 아무리 튼튼해도 냉각수 공급 펌프가 망가져도 사고가 나는 게 원전이다.
심지어 ‘적당한 방사능은 먹어도 된다’라는 주장까지 공공연하게 떠돈다. 방사능이 위험하면, 곧 원전도 위험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학계의 정설은 ‘안전한 방사능은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원전마피아가 국가의 에너지 정책에도 깊숙이 개입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편파적이고 이해관계로 엮인 사람들이 국가의 정책 결정에 관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러나 국가 에너지 정책은 이들이 좌우해왔다. 그러니 결론은 늘 원전을 늘리는 쪽으로 나오기 마련이다.
이런 폐쇄적인 구조를 깨는 방법은 시민들이 원전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은 딱 두 가지뿐이다. 전세계에서 탈원전을 한 사례를 보더라도, 두 가지 경로밖에 없다. 기존에 소개된 것 말고도 여러 사례들이 있다.
지난 9월 총선 뒤 탈원전 길 걷게 된 스웨덴
하나는 국민투표다. 원전을 할지 말지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것이다. 원전 1개를 다 지어놓고 국민투표로 원전을 가동하지 않기로 결정한 오스트리아의 사례는 국내에도 소개된 바 있다. 그러나 오스트리아만 국민투표로 원전 정책을 결정한 것은 아니다. 의외로 그런 나라는 여럿 있다. 스웨덴·스위스 같은 국가들도 원전 정책에 관해 국민투표를 실시한 경험이 있다.
이탈리아의 사례도 있다. 이탈리아는 1960∼70년대에 4개의 원전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원전에 대한 반대 여론이 일면서 1987년 국민투표를 했다. 1986년 옛 소련의 체르노빌에서 초대형 원전사고가 일어난 직후에 실시된 국민투표였다. 이때 이탈리아 국민 70% 이상이 원전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했다. 그 결과, 이탈리아의 원전들은 수명이 남아 있었지만, 1990년까지 모두 폐쇄됐다. 이후에도 신규 원전을 건설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래서 2011년 6월 다시 원전에 관한 국민투표가 실시됐다. 이 국민투표에서는 유권자 94%가 반대표를 던졌다. 이탈리아에서 원전을 건설한다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해진 것이다.
국민투표 외에 또 다른 경로는 선거다. 선거에서 원전 정책이 쟁점이 되고, 선거 이후의 정책 합의를 통해 탈원전을 결정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1998년 사민-녹색당 연립정부가 구성되면서 탈원전에 합의한 독일 사례가 많이 언급된다. 다른 국가의 사례들도 참고할 만하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 다음으로 원전 밀집도가 높은 국가가 벨기에다. 벨기에는 좁은 국토에 7개의 원전이 가동됐고 전기의 54%를 이를 통해 공급해왔다. 그런데 이 나라는 2025년까지 원전을 모두 폐쇄하기로 결정돼 있다. 1999년 총선에서 벨기에 녹색당이 정치적 도약을 하며 연립정부에 참여했는데, 이 연립정부가 탈원전 계획을 입안해 법률로 통과시킨 것이다.
스웨덴의 사례도 주목할 만하다. 스웨덴은 1980년 원전 정책에 관한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2010년까지 원전을 폐쇄하기로 했다. 스웨덴의 기존 정치권에서는 이 결정을 뒤집고 2010년 이후에도 원전을 가동하도록 했다. 그런데 지난 9월 총선을 치른 뒤 정권이 교체되면서, 다시 스웨덴은 탈원전의 길을 걷게 되었다. 선거에서 승리한 사민당이 단독 집권을 하기에는 의석이 모자랐기 때문에 녹색당에 손을 내민 것이다. 녹색당은 연립정부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탈원전을 요구했다. 사민-녹색당 연립정부는 녹색당의 요구를 수용해, 신규 원전 건설을 불허하고 원전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더 건설해야 한다’ 27.7%뿐
물론 이 국가들과 대한민국은 헌법도 다르고 정치제도도 다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결정해야 탈원전이 된다는 것이다.
다행히 여론도 많이 바뀌고 있다. CBS 가 2014년 7월23일 전국 성인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전화자동응답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61%는 ‘원전을 줄이거나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고, ‘더 건설해야 한다’는 응답은 27.7%에 불과했다. 원전을 줄이기 위해 전기요금을 더 부담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자, 23.8%가 ‘적극 동의’, 41.8%가 ‘대체로 동의’ 의사를 밝힌 반면, ‘반대한다’는 답변은 34.4%에 머물렀다.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이런 결과는 시민들이 탈원전을 바라고 있음을 보여준다. 원전마피아가 아니라 시민이 결정할 수 있는 기회만 주어진다면, 대한민국도 탈원전이라는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다.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태진아 “전한길에 법적 대응”…일방적으로 콘서트 참석 홍보·티켓 판매
![[단독] 군 특수본, ‘선관위 장악 지시하달’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 기소 [단독] 군 특수본, ‘선관위 장악 지시하달’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 기소](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22/53_17717357343273_20260222501198.jpg)
[단독] 군 특수본, ‘선관위 장악 지시하달’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 기소

몸에 피 한방울 없는 주검이 되어 돌아온 새 신랑

최시원, 윤석열 선고 뒤 “불의필망”…논란 일자 SM “법적 대응”

‘모든 수입품’에 15% 관세…세계 무역질서 뒤엎은 트럼프
![지귀연 ‘무죄 판결문’ 썼다 고친 흔적, 변심한 계기는? [논썰] 지귀연 ‘무죄 판결문’ 썼다 고친 흔적, 변심한 계기는? [논썰]](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6/0220/20260220502864.jpg)
지귀연 ‘무죄 판결문’ 썼다 고친 흔적, 변심한 계기는? [논썰]

‘어디서 본 듯한’....국힘 이정현 야상 점퍼 ‘시끌’

“당 망치지 말고 떠나라”…‘절윤 거부’ 장동혁에 쏟아지는 사퇴 요구
![[단독] ‘양재웅 정신병원’ 주치의 구속 4개월 만에 보석…유족 반발 [단독] ‘양재웅 정신병원’ 주치의 구속 4개월 만에 보석…유족 반발](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21/53_17716543877486_20241013501475.jpg)
[단독] ‘양재웅 정신병원’ 주치의 구속 4개월 만에 보석…유족 반발

중과세 무관 ‘1주택자 급매물’도 잇따라…보유세 부담 피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