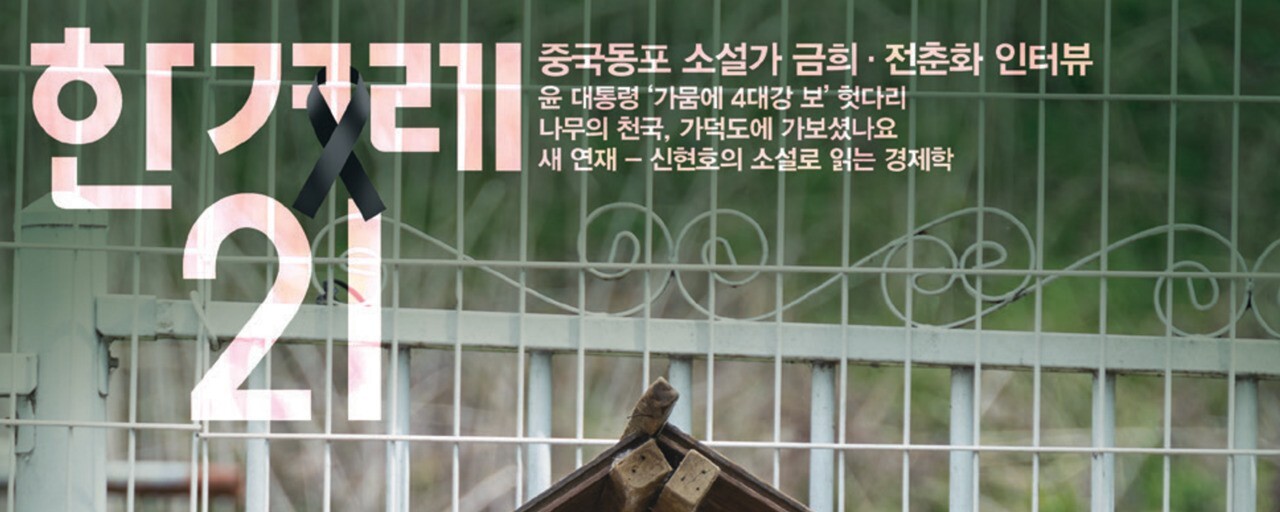씰룩이는 돼지의 코는 유연하게 휘어졌습니다. 동물권행동 카라가 운영하는 ‘미니팜 생추어리’에서 만난 돼지 릴리는 제가 30여 년간 살면서 처음 본 돼지였습니다. 평소 생활에서 ‘돼지’라는 단어가 언급되는 빈도를 생각하면 희한한 일이었습니다. 어릴 적 동물원에서 레서판다나 늑대, 기린처럼 전세계적으로 개체수가 적은 멸종위기 동물을 본 기억은 선명히 남아 있는데 말입니다.
그랬기에 농가와 실험실에서 각각 구조된 돼지 새벽이와 잔디를 보호하는 ‘새벽이생추어리’ 활동가의 말에 머리를 얻어맞은 듯했습니다. “죽은 채로는 어디서나 볼 수 있지만, 살아 있는 모습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동물이 돼지다.” 그의 말처럼 제가 인식하는 돼지는 부위별 고기일 뿐이었습니다.
생추어리 취재를 하기 전까지 제게 비인간 동물의 범주는 반려동물, 보호가 필요한 야생동물, 그리고 인간이 사는 데 필요한 동물뿐이었습니다. ‘필요한 동물’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자면, 인간이 먹는 고기입니다. 사실 이렇게 범주를 나누는 게 큰 의미가 없을지 모릅니다. ‘강아지 공장’에서 태어나고 펫숍에서 팔리는 강아지가 파양되거나 유기되는 사례는 너무나 흔합니다. 반려견에게 얻는 기쁨 이상으로, 이들을 돌보는 데 너무 많은 자원이 들어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요.
‘종 보호’라는 명분 아래 좁은 곳에서 각종 소음과 인간의 시선을 견뎌야 하는 동물원의 동물도 상황은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동물원이 동물의 스트레스를 덜어주기 위해 행동풍부화 프로그램을 마련해도 한계는 분명합니다. 인간의 관람 편의를 더 우선시하는 현재 운영 방식이라면 동물은 여전히 인간의 볼거리로서만 존재합니다.
이 대척점에 있는 공간이 보호구역·안식처라는 뜻의 ‘생추어리’(Sanctuary)입니다. 착취당하거나 학대받는 동물을 구조해 자기 습성대로 살 수 있도록 보호하는 공간입니다. 다른 나라에선 30여 년 전부터 만들어졌는데, 국내에도 최근 몇 년 새 동물권단체를 중심으로 하나둘 생겨나고 있습니다.
정부도 사육곰 등 야생동물을 위한 생추어리를 만들려 합니다. 다만 생추어리가 조성되는 부지의 지방자치단체는 생추어리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을 내세웁니다. 아직 다 만들어지기도 전이지만, 정부의 생추어리가 또 다른 형태의 동물원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이유입니다. 다른 나라의 생추어리도 인간의 관람을 허용하는 투어 프로그램이 있지만, 이는 동물의 상태를 배려해 진행됩니다. 제한된 시간과 인원으로 동물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선에서 이뤄지며, 생추어리가 생겨난 배경을 설명하는 데 프로그램 내용을 집중합니다. 동물이 이 공간에 올 수밖에 없던 근원에 인간의 착취와 학대가 있겠지요. 이제 막 발을 떼기 시작한 한국의 생추어리가 어떻게 운영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살아남은 동물들의 안식처, 생추어리를 가다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3733.html
돼지 릴리를 쓰다듬자 배를 보이며 누웠다…생추어리의 다른 삶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3731.html
뜬장서 살아 나올 수 없었던 사육곰, 미국에서야 땅을 밟았다
https://h21.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53719.html
생추어리 사는 소들은 바나나 먹으며 오후를 즐긴다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3718.html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태진아 “전한길에 법적 대응”…일방적으로 콘서트 참석 홍보·티켓 판매

몸에 피 한방울 없는 주검이 되어 돌아온 새 신랑
![[단독] 군 특수본, ‘선관위 장악 지시하달’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 기소 [단독] 군 특수본, ‘선관위 장악 지시하달’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 기소](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22/53_17717357343273_20260222501198.jpg)
[단독] 군 특수본, ‘선관위 장악 지시하달’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 기소

‘모든 수입품’에 15% 관세…세계 무역질서 뒤엎은 트럼프

‘어디서 본 듯한’....국힘 이정현 야상 점퍼 ‘시끌’
![지귀연 ‘무죄 판결문’ 썼다 고친 흔적, 변심한 계기는? [논썰] 지귀연 ‘무죄 판결문’ 썼다 고친 흔적, 변심한 계기는? [논썰]](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6/0220/20260220502864.jpg)
지귀연 ‘무죄 판결문’ 썼다 고친 흔적, 변심한 계기는? [논썰]

최시원, 윤석열 선고 뒤 “불의필망”…논란 일자 SM “법적 대응”

“당 망치지 말고 떠나라”…‘절윤 거부’ 장동혁에 쏟아지는 사퇴 요구

중과세 무관 ‘1주택자 급매물’도 잇따라…보유세 부담 피하려
![[단독] ‘양재웅 정신병원’ 주치의 구속 4개월 만에 보석…유족 반발 [단독] ‘양재웅 정신병원’ 주치의 구속 4개월 만에 보석…유족 반발](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21/53_17716543877486_20241013501475.jpg)
[단독] ‘양재웅 정신병원’ 주치의 구속 4개월 만에 보석…유족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