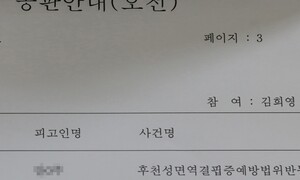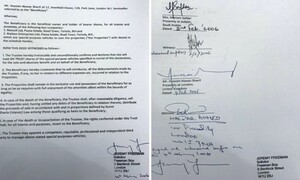지난해 이맘때 언론은 드넓은 광야에서 홀로 피투성이가 된 채 싸웠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에 맞선 언론의 투쟁(!)은 역대급이었다. 언론은 국가의 탄압에 맞서 언론 자유를 수호하려는 정의의 사도인 양 움직였다. 김영란법은 유별난 법률이다. 사회생활을 조금이라도 경험한 사람이라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국가는 부정청탁만 강하게 규제하고 처벌하면 될 일이지, 왜 식사·선물·부조의 상한액까지 정한단 말인가.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할 법하다. 부정한 일 따위는 청탁하지 않고, 부탁받더라도 당당하게 거부하고, 자기 밥값은 스스로 계산하는 것이 상식인데 말이다. 그들이 사는 세상은 과연 어떻기에, 도대체 얼마나 해드셨기에 이런 법이 등장했고 또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을까.
법 시행 1년이 지났다. 언론은 다시 ‘결사투쟁’ 머리띠를 묶었다. 그리고 정치권에 규제 대상을 축소하고 상한액을 올려달라고 요구한다. 명분은 예전과 같다. 2017년 9월21일치 신문 1·4·5면에 실린 ‘김영란법 시행 1년’ 기획 기사에 나온 논리를 살펴보자. 1년 전 화제가 됐던 기사 ‘한우의 한숨, 굴비의 비명’ 수준이다. 김영란법으로 인해 꽃과 축산 시장의 매출이 70~80% 곤두박질쳤고, 외식업 매출도 22%나 줄었으며,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대다수가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리고, 자영업자와 노동자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그렇단다. 법으로 인해 꽃집과 음식점 등이 타격 입었을 것이다. 일부 언론은 모든 침체의 원인을 김영란법으로 몰아간다. 심지어 경기 불황의 단면을 김영란법 무력화의 근거로 끼워맞추기까지 한다. 택시에 승객이 없는 것도 김영란법 탓이고, 클래식 공연 티켓이 팔리지 않는 것도 김영란법 때문인가. 이 논리대로라면, 한국 경제의 위기는 모두 김영란법 탓이다.
김영란법은 일종의 사회적 매너를 규정한 법이다. 우리 사회에서 공적 역할을 하는 사람일수록 공사를 엄격히 구분하고 자신의 권력과 권한을 활용해 사익을 취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 말을 언론에 적용하면 ‘기자는 기업과 정부로부터 개인적·조직적 협찬과 후원을 받으면 안 되고, 이를 대가로 그들에게 유리한 기사를 써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그게 매너로 안 되니 강제하는 법이 생겼다.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법인데 언론이 반대한다. 여전히 구태를 못 벗어나고 추태를 부린다.
‘잠재적 범죄자 양산 ‘반쪽법’ 된 김영란법’ 기사의 마지막 대목은 이렇다. “특히 식사 3만원 기준은 사실상 허물어졌다.” 주어가 빠졌다. 언론이 허물었다. 이런 기사를 쓴 기자님들께 정말 궁금한 게 있다. 3만원짜리 밥으로는 배가 부르지 않나. 5만원짜리 선물은 기자님이 집에 들고 가기 조금 가볍나. 취재원에게서 부조금 10만원 이상 받아야 행복한가. 부탁한다. 바로 그 망할 접대를 받으면서 ‘기레기’가 되는 것 아닌가. 올 추석에는 더도 덜도 말고 김영란법만 지키시라.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이정현 국힘 공천관리위원장 사퇴…“생각한 방향 추진 어려워”

미 공중급유기, 이라크 상공서 추락…“적군 공격·오인사격 아냐”

“아빠 좋은 사람으로 기억하길”…60일된 딸 둔 가장 뇌사 장기기증

배현진 “참 어렵게 산다, 장동혁”…징계 중단하잔 말에 SNS 글

한준호 “김어준, 사과·재발방지해야”…김어준 “고소·고발, 무고로 맞설 것”

이하상 “특검 안 나온 재판은 불법” 트집…재판장, 17초 만에 “기각”

정청래 “검찰개혁, 이 정부·민주당의 깃발…제가 물밑 조율”

박지원 “레거시 언론과 언어 차이”…김어준 ‘공소 취소 거래설’ 제기 두둔
![[단독] 청와대, ‘사법시험 부활’ 검토…연 50~150명 별도 선발 [단독] 청와대, ‘사법시험 부활’ 검토…연 50~150명 별도 선발](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11/53_17732246670747_20260311503553.jpg)
[단독] 청와대, ‘사법시험 부활’ 검토…연 50~150명 별도 선발

미국,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관련 조사 개시…한국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