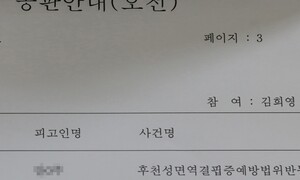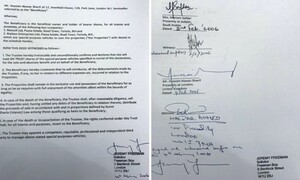2003년 겨울, 새벽에 캠퍼스를 돌아다니며 몰래 실태조사를 했다.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고, 휴게실이라는 곳에는 햇빛이 한 줌도 들지 않았다. 이들은 투명인간 같았다. 노조를 만들기 전까지 미화원, 여사님, 청소아줌마들은 이렇게 살았다. 고려대의 한 노동자는 일을 관둬야 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았지만 몇 개월을 악착같이 버텼다. “노조 만드는 것을 보고 싶었다”고 했다.
이들은 이제 우리 사회 곳곳에 노조를 만들고 집단교섭까지 관철했다. 대단한 일을 해냈지만 갈 길이 멀다. 경희대와 인천공항은 자회사를 결정했지만, 대부분 사업장은 여전히 청소와 경비 등 시설관리를 외주화한다.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이고, 해마다 고용불안에 떨고, 1인당 400~500평을 쓸고 닦고, 화장실 사이 비좁은 창고나 퀴퀴한 지하에서 쉰다.
이런 노동자가 노조를 만들고 시급 7780원을 달라고 요구한 것이 과연 우리 사회의 일자리를 흔든 무리한 요구일까.
어떤 언론과 어떤 기자들은 그렇게 본다. 성유진·최원국 기자 또한 세상을 거꾸로 보는 놀라운 능력(?)을 지녔다. 연세대·고려대·홍익대가 청소·경비 노동자를 줄이고 그 자리에 파트타임 노동자를 채워넣었는데, 두 기자는 대학을 비판하기는커녕 노조의 무리한 요구 탓이라고 썼다. 1월4일치 10면에 실린 이 기사는 제목부터 삐뚤다. ‘민노총의 역효과… 대학 청소근로자 일자리 되레 줄었다’.
물론 가 자본 편에 서서 자본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야 한다는 것쯤은 안다.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해야 하고, 직업에 귀천이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선전하고 싶을 것이다. 그래도 기사를 이렇게 쉽게 쓰면 되나. 성유진 기자는 지난해에도 이화여대 청소노동자의 시급 7780원 요구를 정치투쟁이라고 물어뜯더니 해가 지나도 여전하다.
가 호주머니를 걱정하는 그 대학들은 수백억, 수천억원을 쌓아뒀다. 그동안 외주화에 빌어먹으며 헐값에 노동자를 부려먹었다. 법정최저임금보다 고작 250원 높은 임금을 부담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교문을 닫는 게 맞다. 이런 사장님들을 옹호하는 것이 1등 신문 기자의 역할은 아니지 않나.
내부에 못마땅한 기자들이 분명 있을 것이다. 박준동 조선일보 노조위원장도 그중 한 명이다. 에 따르면, 그는 조합원들에게 자회사, 사내 하청, 비정규직들에게 관심을 갖고 연대할 것을 호소했다고 한다. 그래야 대기업 기득권 노조를 좀더 당당히 비판할 수 있다고 했단다. “스스로를 머슴이라고 비하하면 한낱 회사원이 된다. 반대로 주인의식이 있을 땐 한 사람 한 사람이 언론기관으로 존중받을 수 있다”고 했다. 기자님들, 신분제가 사라진 지 100년이 넘었다. 새해에는 머슴으로 살지 마시라. 기자님들 출입처에 있는 청소노동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일하고 어디서 쉬는지부터 취재하시라.
박장준 희망연대노동조합 정책국장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키 206cm 트럼프 아들을 군대로!”…분노한 미국 민심

쿠르드족, 이란과 지상 ‘대리전’…미국에 또 동원되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식으로 국민을 속이나 [박용현 칼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식으로 국민을 속이나 [박용현 칼럼]](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04/53_17726118413306_20260304503108.jpg)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식으로 국민을 속이나 [박용현 칼럼]

김성태 “검찰 더러운 XX들…이재명, 말도 안 되는 것들에 엮여”

‘관봉권 띠지’ 기소 없이 수사 마무리…상설특검 “업무상 과오”

기름값 ‘상한제’ 꺼낸 이 대통령 “위기 틈타 돈 벌겠다는 시도 엄단”

국방부, 장군 아닌 첫 국방보좌관 임명 나흘 만에 업무배제

강혜경 “나경원과 오세훈 차이 좁히게 여론조사 조작” 재판 증언

“유심 교체하고 200만원씩 이체하세요”

팔 잃은 필리핀 노동자와 ‘변호인 이재명’…34년 만의 뭉클한 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