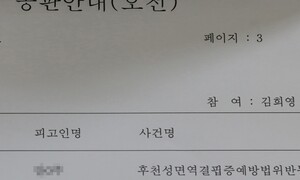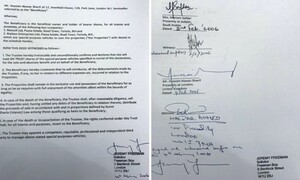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어려운 문제다. 당연히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는다. 부문·직종별로 풀어야 할 문제가 켜켜이 쌓여 있다. 어떤 사장님은 비용절감-중간착취 구조를 유지하고 싶고, 어떤 화이트칼라는 블루칼라와 섞이는 것을 꺼리고, 어떤 사람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경계가 분명해야 우리 사회가 굴러간다고 이야기한다.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상시지속업무’ 노동자를 사용자가 직접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 현실은 진흙탕이다. 비정규직,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인지 자영업자인지 모를 변칙과 꼼수가 차고 넘친다. 이 상황에서 정부는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선언했다.
그런데 공공부터 민간 부문까지 우리 사회의 사용자들은 ‘속도조절론’과 ‘최저 수준의 정규직화’를 목청 높여 외친다. 이들은 비용과 노-노 갈등을 이유로 든다. 이것을 신중하고 사려 깊은 ‘현실론’(!)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보수언론의 부채질과 호들갑이다.
9월1일치 5면 ‘[기자의 눈] “비정규직 문제, 왜 교사끼리 싸워야 하나요”’라는 정책사회부 우경임 기자의 현장칼럼에는 비정규직 문제를 바라보는 보수언론의 입장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기자는 학교에도 고용유연화가 필요하고 자발적인 비정규직도 있으며 한꺼번에 정규직화가 이뤄지면 노동시장이 경직돼 미래 세대의 진입 장벽은 더욱 높아지는 부작용이 생긴다고 주장한다.
결국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사회에 비정규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기자는 “지금까지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논의를 지켜보면 교육 분야 비정규직 5만5천여 명 중 정규직이 되는 인원은 아주 소수일 것 같다”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저주를 내렸다.
보수언론의 언론플레이가 하루이틀은 아니다. 한국 사회에서 정규직은 수년간 스펙을 쌓고 각종 시험과 면접을 통과해 상대적인 고임금과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고용안정의 ‘자격’이자 ‘기득권’이 됐다. 정규직이 되지 못한 이들의 ‘노동지옥’이 정규직의 눈앞에서 펼쳐지는데 보수언론의 현실론은 정규직, 비정규직, 임용고시생 사이를 더 깊숙이 파고든다.
우경임 기자에게 질문을 던진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고용안정이 없는데 이들에겐 (정규직보다) 더 많은 임금을 줘야 하는 것 아닌가. 기자라면 현실론을 부채질하며 갈등을 증폭할 게 아니라 ‘상식’을 어떻게 복원할지 정책 대안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닌가.
기자는 “정규직화가 ‘절대선’이라는 확신을 버려야 한다. 현실을 직시하면 비정규직이 필요한 부분이 보인다. 그래야 2중, 3중 진입 장벽을 만들지 않게 된다. 그래야 정책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다”고 썼다. 정규직화라는 ‘상식’을 무시하고 비정규직과 임용고시생에게 겹겹이 장벽을 친 것은 우 기자 당신 아닌가.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배현진 “참 어렵게 산다, 장동혁”…징계 중단하잔 말에 SNS 글

이하상 “특검 안 나온 재판은 불법” 트집…재판장, 17초 만에 “기각”

‘미국 vs 일본 4강전 용납 못 해’…또 대회 중 바뀐 WBC 대진표
![관세와 미사일, 양손에 쥐고 과대망상에 빠진 독재자 [아침햇발] 관세와 미사일, 양손에 쥐고 과대망상에 빠진 독재자 [아침햇발]](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12/53_17733006909357_20260312502955.jpg)
관세와 미사일, 양손에 쥐고 과대망상에 빠진 독재자 [아침햇발]

이란, 종전 조건 ‘불가침·배상금’ 제시…미국과 평행선

내일부터 휘발유 100원 더 싸게 산다…정유사 출고 최고액 ℓ당 1724원
![[단독] 청와대, ‘사법시험 부활’ 검토…연 50~150명 별도 선발 [단독] 청와대, ‘사법시험 부활’ 검토…연 50~150명 별도 선발](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11/53_17732246670747_20260311503553.jpg)
[단독] 청와대, ‘사법시험 부활’ 검토…연 50~150명 별도 선발
![손녀와 초등학생 [그림판] 손녀와 초등학생 [그림판]](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6/0312/20260312503676.jpg)
손녀와 초등학생 [그림판]

오세훈, ‘장동혁 2선 후퇴’ 압박 초강수…서울시장 추가 모집 ‘버티기’

‘대출 사기’ 민주 양문석 의원직 상실…선거법은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