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혈병을 오래 앓았던 고 정종현군이2009년 8월21일 한국메이크어위시소원별재단이 주선한 행사에서 조훈현 국수와 바둑을 두고 있다. 이듬해 5월 병원을 찾아간 정군는 항암주사를 맞고 급격히 상태가 악화돼 9일 만에 숨졌다. 병원 쪽은 의료사고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 김영희 제공
젊은 엄마의 목소리는 자주 끊겼다.
지난 6월13일 기자와 통화를 하는 사이 김영희(36)씨의 말은 힘들게 이어졌다. 아들 종현이는 2년 전 9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종현이는 6살 때부터 ‘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이라는 긴 이름의 병을 앓았다. 바둑 두기를 좋아하고, 이라는 만화책을 좋아하는 평범한 꼬마였다. 대구에 사는 종현이는 가까운 경북대병원을 찾아 2년 가까이 항암치료를 받았다. 다행히도 증상이 가벼운 백혈병이었다. 골수이식을 받지 않아도 항암치료만으로 90% 이상 완치가 가능하다는 말도 들었다.
항암치료 도중 갑자기 숨진 아이
2010년 5월19일 밤 10시에도 그랬다. 언제나처럼 병원을 찾아 항암제 주사를 맞았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다음날 새벽 4시부터 아이는 머리가 아프고, 엉덩이도 쥐어뜯는 듯이 아프다고 하소연했다. 진통제도 소용이 없었다. 통증은 눈에까지 번졌다. 2시간 뒤에는 마약성 진통제까지 맞았다. 마비는 아이의 다리 끝에서 시작해 온몸으로 번졌다. 만 하루가 지나고 나서 아이는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이틀 뒤 의식을 잃었다. 종현이는 그렇게 일주일 가까이 죽음의 언저리를 헤매다 5월19일 새벽 1시에 숨을 멈추었다. 어쩌면 평범한 어린아이의 평범한 죽음 가운데 하나였을지도 몰랐다.
그래도 이상했다. 의료진을 채근해도 뾰족한 답을 주지 않았다. 김씨 부부는 팔을 걷어붙였다. 전문가들을 찾아나섰다. 종현이와 증상이 일치하는 사례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9살 꼬마에게 생긴 일은, ‘빈크리스틴’이라는 정맥주사를 척수로 잘못 주사할 때 생기는 증상이었다. 종현이 같은 백혈병 환자들은 척수와 동맥 쪽에 동시에 두 가지 주사를 맞는데, 종종 두 주사가 실수로 바뀌면 생기는 일이었다. 경북대 의료진에서는 “증상이 같다고 과오가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씨 부부는 그해 7월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방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젊은 엄마의 말은 무게를 헤아리기 힘들다. “정말 잘 클 줄 알았는데, 너무 아까워서 힘들었어요. 인정할 수 없었어요. 있어야 하는데 없다는 것이 너무 괴로웠어요.” 현실의 공방도 힘들기는 마찬가지다. “누군가가 앞서 이런 문제를 바꾸었다면 불행한 일도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제2의 종현이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죠.” 경북대병원에 전화를 걸었다. 답을 준다던 병원은 하루가 지나도록 묵묵부답이었다. 다시 전화를 했다. 병원 관계자는 그제야 답을 했다. “지금으로서는 할 말이 없다. 판결을 기다리겠다.”
종현이의 이야기는 ‘뉴스’가 아니다. 이상일 울산대 교수의 ‘환자 안전의 국내외 동향’ 자료를 보면, 의료사고는 ‘숨어 있는 일상’이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환자 안전 사망사고가 한 해 3만9109건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물론 모두 ‘인재’는 아니다. 이 가운데는 약물 부작용 등 현대 의술의 한계 때문에 발생하는, 어쩔 수 없는 죽음 2만2천 건도 있다. 이 통계를 제외하면 의료진의 크고 작은 실수 때문에 사망하는 인구가 잡힌다. 1만7012명이다. 뒤집어 말하면, 병원에서 인력과 장비를 잘 갖추었다면 그만큼의 사망은 예방할 수 있다는 말이다. 한 해 교통사고로 떠나는 생명이 6800여 명이다. 의료사고 사망자가 교통사고 사망자의 세배 가까이 된다. 실감하기 어렵고, 믿기도 어려운 통계다. 추산치의 근거는 무엇일까. 안전사고의 보고 체계가 우리나라보다 잘 갖춰진 선진국의 사고 통계를 우리나라에 적용해 어림한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 국립의학연구원은 1999년에 낸 보고서에서 미국의 의료사고 사망자 수를 4만4천~9만8천 명으로 추산했다. 이쯤 되면, 일반인이 좀처럼 보기 힘든, 병원의 어두운 얼굴이 윤곽을 드러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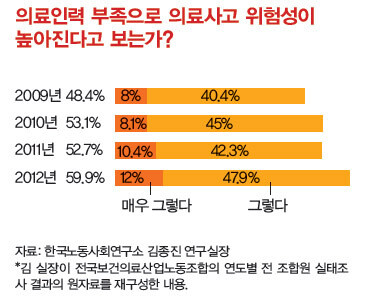
병상 1개당 간호 인력 비율, OECD 평균의 1/5 수준
왜 의료사고가 생길까. 몇 가지 주요한 원인만 짚어보자. 무엇보다 간호 인력이 부족하다. 2008년 한양대 의대 간호학과 조성현 교수팀의 논문은 짐작 가능한 가설을 입증해 보였다. 연구진은 국내 236개 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간호사가 많은 중환자실일수록 사망률이 낮다’고 보고했다. 실태는 절망스러운 수준이다. 2009년 대한간호협회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전국 병원 10곳 가운데 8곳은 정부의 기준에 못 미치는 간호 인력을 갖췄다. 병원 규모별로 살펴보면, 전국 266개 종합병원 가운데 정부의 기준(3.5병상 기준 간호사 최소 1명 상시 근무)을 맞춘 곳은 25.9%에 불과했다. 간호사들이 흔히 3교대로 근무하는 점을 고려하면, 병상 1개당 1명 이상의 간호 인력이 갖춰져야 3.5병상마다 간호사 1명이 24시간 상주할 수 있다는 말이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대형 병원을 찾기는 쉽지 않다. 또 1224개 중소 병원 가운데 정부의 기준(4.5병상 기준 간호사 최소 1명 근무)을 맞춘 병원은 10%에 불과했다.
외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부실한 간호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02년 자료를 보면, 병상 1대당 간호 인력의 비율이 우리나라는 0.21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0.99명)에 크게 못 미쳤다. 미국(1.36명)이나 영국(1.7명)은 물론 터키(0.38명)보다도 적었다. 우리나라 환자들은 그만큼 간호의 손길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말이다. 백찬기 대한간호협회 홍보국장은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말한다. “오스트레일리아는 간호사 1명당 환자 수 4~6명, 일본은 환자 수 7명으로 강제하고, 그 규정을 어기면 아예 병원 문을 열지 못하게 한다. 우리나라는 그런 규정이 없어 의료 현장에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병원은 비용을 절감하려고 간호사를 갖추지 않았고, 정부의 규제도 부실했다는 말이다.
전공의들의 열악한 근로 여건도 환자 안전을 위협한다. 2010년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 10명 가운데 4명(42.2%)이 주당 100시간 이상 근무한다고 답했다. 또 4명 가운데 1명(26.2%)은 80~100시간 일을 했다. 10명 가운데 7명(67%)은 휴일에도 항상 출근한다고 했고, 응답자 가운데 40.4%는 ‘과도한 업무 탓에 서로 휴가를 안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분위기’ 때문에 휴가를 가지 못한다고 답했다. 병원에서 마주치는 전공의들의 낯빛이 늘 유령 같은 이유를 알 수 있다.
부실한 안전사고 보고 체계
환자 안전사고에 관한 부실한 보고 체계도 문제였다. 2005년 보건행정학회지에 실린 논문을 보면, ‘환자에게 중대한 해를 끼친 과오’가 ‘항상 보고된다’고 답한 의료인의 비율은 44.4%에 불과했고, ‘대부분 보고된다’고 답한 비율은 34.1%였다. ‘전혀 보고되지 않는다’라는 비율도 2.4%였다. 설사 병원 내부의 보고 체계가 작동된다고 해도, 그 내용이 환자에게 전달될지는 알 수 없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환자들은 병원에서 교수와 얘기를 주고받기가 아예 힘들고, 전공의들은 너무 바빠 말을 걸기도 미안한 수준이다. 그나마 전공의가 미달되는 지방 병원 등은 상황이 더 나쁘다”고 말했다. 의사나 간호사가 귀한 병원에서 한국의 환자들은 위태롭다.
김기태 기자 kkt@hani.co.kr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단독] ‘쿠팡 가만 안 둬’ 스코틀랜드 3위 연기금, 총대 메고 소송 전면전 [단독] ‘쿠팡 가만 안 둬’ 스코틀랜드 3위 연기금, 총대 메고 소송 전면전](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5/1217/53_17659590361938_241707891273117.jpg)
[단독] ‘쿠팡 가만 안 둬’ 스코틀랜드 3위 연기금, 총대 메고 소송 전면전

흔들리는 부산 “나라 말아먹은 보수가 보수냐…그런데, 뚜껑은 열어봐야”

‘이란 정권교체’ 노골적인 트럼프 “지도자 선정 관여하겠다”

“키 206cm 트럼프 아들을 군대로!”…분노한 미국 민심

김성태 “검찰 더러운 XX들…이재명, 말도 안 되는 것들에 엮여”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식으로 국민을 속이나 [박용현 칼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식으로 국민을 속이나 [박용현 칼럼]](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04/53_17726118413306_20260304503108.jpg)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식으로 국민을 속이나 [박용현 칼럼]

법원, 배현진 ‘당원권 1년 박탈’ 징계 효력정지
![“부통령 밴스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특파원 칼럼] “부통령 밴스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특파원 칼럼]](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06/53_17727496510754_20260306500054.jpg)
“부통령 밴스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특파원 칼럼]
![결국 너의 집 앞이야 [그림판] 결국 너의 집 앞이야 [그림판]](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6/0305/20260305503520.jpg)
결국 너의 집 앞이야 [그림판]

이 대통령, 정유업계 직격 “가격 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대가 클 것”









![[다시보는 21] 한국 의료 공공성에 대한 배신](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resize/2012/0618/1339657311_7000944365_20120618.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