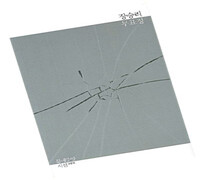선생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2박3일을 더 있다가 느지막이 삼성의료원을 찾았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기도 했지만 도대체가 실감이 안 나기도 해서였다. 그날도 줄을 서야만 조문을 할 수 있었다. 언젠가 직접 차려주신 밥을 황송하게 먹은 기억을 떠올리며 상가의 밥을 먹었다. 집에 돌아와서는 고인의 작품 목록을 정리했다. 중·장편소설은 (세계사, 전 17권)으로, 단편소설은 (문학동네, 전 6권)으로 묶여 있다. 전자에 장편 (실천문학, 2000)과 (현대문학, 2004)을 보태고, 후자에 소설집 (문학과지성사, 2007)를 더하면 목록은 얼추 완성된다.

지난 1월25일 경기 구리시 토평동 성당에서 박완서 작가의 장례미사가 끝난 뒤 영정사진과 운구가 성당을 빠져나오고 있다.한겨레 신소영
3년 전 선생님을 찾아뵐 일이 있어 마지막 책을 읽었다. 두 가지가 새삼 인상적이었다. 그 하나는 ‘소설의 속도’였다. 낭비되는 문장이 전혀 없어서 숨이 가쁘다. 어떤 소설을 펼치건 우리는 거기에서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문장들이 인간 심리의 진상을 분주하게 실어나르는 장관을 목격한다. “휴전이 되고 집에서 결혼을 재촉했다. 나는 선을 보고 조건도 보고 마땅한 남자를 만나 약혼을 하고 청첩장을 찍었다. 마치 학교를 졸업하고 상급 학교로 진학을 하는 것처럼 나에게 그건 당연한 순서였다. 그 남자에게는 청첩장을 건네면서 그 사실을 처음으로 알렸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나서 별안간 격렬하게 흐느껴 울었다.”
단편 ‘그 남자네 집’()의 한 대목이다. 그리고 선생은 정확히 네 문장을 더 적는다. “나도 따라 울었다. 이별은 슬픈 것이니까. 나의 눈물에 거짓은 없었다. 그러나 졸업식 날 아무리 서럽게 우는 아이도 학교에 그냥 남아 있고 싶어 우는 건 아니다.” 첫사랑이었던 ‘그 남자’가 이 네 문장과 더불어, 언젠가는 졸업해야 하는 ‘학교’가 되면서, 소설에서 퇴장하고 만다. 과연 대가의 문장이다. 이별을 고하는 자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불가피한 자기합리화의 양상을 세 개의 단문과 잔인하리만큼 정확한 비유 하나로 장악한다. 비유란 이런 것이다. 같은 말을 아름답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사실’을 영원한 ‘진실’로 못질해버리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재현의 역전’이었다. 선생의 소설에서 특히 소중한 부분 중 하나는 노년의 시선으로 젊은이들을 응시하는 대목이다. “쌍쌍이 붙어 앉아 서로를 진하게 애무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늙은이 하나가 들어가든 나가든 아랑곳없으련만 나는 마치 그들이 그 옛날의 내 외설스러운 순결주의를 비웃기라도 하는 것처럼 뒤꼭지가 머쓱했다. 온 세상이 저 애들 놀아나라고 깔아놓은 멍석인데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그래, 실컷 젊음을 낭비하려무나. 넘칠 때 낭비하는 건 죄가 아니라 미덕이다. 낭비하지 못하고 아껴둔다고 그게 영원히 네 소유가 되는 건 아니란다. 나는 젊은이들한테 삐지려는 마음을 겨우 이렇게 다독거렸다.”
같은 소설의 끝부분이다. 화자는 커피숍에서 젊은이들을 바라보며 이토록 솔직하게 질투하고 또 연민한다. 노인이 재현의 대상이 되는 일도 드물지만 그들이 재현의 주체가 되는 일은 더더욱 드물다. 아무래도 재현의 권력은 젊은이들에게 있으니까. 그런 환경에 익숙해져서일까, 가끔 우리 젊은이들은 노인에게는 마치 내면이라는 것이 없다는 듯 행동할 때가 있다. 일방적인 짓거리고 가당찮은 오만이다. 선생의 소설에는 재현 권력의 통쾌한 역전이 있다. 덕분에 알게 된다. 온 세상이 죄다 젊은이들만을 위한 ‘멍석’인 세상에서 노년의 내면은 제대로 주목받지도 이해되지도 못했다는 사실을, 재현의 장에서 노인들은 눈과 입을 모두 빼앗겼다는 사실을.
선생의 문학은 장악(掌握)의 문학이다. 국어사전에 ‘장악’은 “손안에 잡아 쥔다는 뜻으로, 무엇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됨을 이르는 말”이라 풀이돼 있다. 선생의 손바닥 위에 올라가면 모든 게 다 문학이 되었다. 그 손으로 선생은 지난 40년간 역사와 풍속과 인간을 장악해왔다. 그 책들을 읽으며 우리는 살아온 날들을 부끄러워했고 살아갈 날들 앞에 겸허해졌다. 선생이 남긴 수십 권의 책들은 앞으로도 한국 사회의 공유 자산으로 남아 우리들 마음 공부의 교본이 될 것이다. 우리는 원로 작가 한 분을 떠나보낸 게 아니라 당대의 가장 젊은 작가 하나를 잃었다. 이 나라의 가장 거대한 도서관 하나가 무너져내린 것처럼 쓸쓸하다.
문학평론가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김성태 “검찰 더러운 XX들…이재명, 말도 안 되는 것들에 엮여”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식으로 국민을 속이나 [박용현 칼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식으로 국민을 속이나 [박용현 칼럼]](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04/53_17726118413306_20260304503108.jpg)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식으로 국민을 속이나 [박용현 칼럼]

이 대통령 “100조 시장안정 프로그램 집행…휘발유값 잡겠다”

“키 206cm 트럼프 아들을 군대로!”…분노한 미국 민심

장항준 ‘왕사남 천만 공약’ 회수…“커피 쏠게요, 개명·성형 웃자고 한 말”

‘순교자’ 하메네이에 ‘허 찔린’ 트럼프…확전·장기전 압박 커져

“유심 교체하고 200만원씩 이체하세요”

폭스 “쿠르드족 반군, 이란으로 넘어가”…‘지상전’ 번지나

팔 잃은 필리핀 노동자와 ‘변호인 이재명’…34년 만의 뭉클한 재회

국방부, 장군 아닌 첫 국방보좌관 임명 나흘 만에 업무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