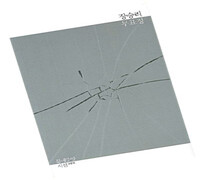944 신형철의 문학 사용법
새해 첫날에 읽은 신춘문예 시 당선작들은 대체로 잘 만들어진 것들이었지만 한두 작품을 빼면 매혹적이지 않았다. 대단한 진리도 아니지만, 잘 쓴 것과 매혹적인 것은 확실히 같지가 않다. 왜 이런 것일까 하는 해묵은 궁리를 또 했다. 답은 매번 달라진다. 이번에는 이렇게 답하자. 대다수의 당선작들은 ‘알고 있는’ 시였다. 자신이 무엇을 쓰려고 하는지를, 또 어떻게 쓰면 되는지를. 그러나 어떤 매혹적인 시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모르는’ 시들이라는 데 있다. 그 시들은 모른다고 말한다. 자신이 지금 무언가를 포착했고 느꼈고 썼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다는 것. 며칠 전에 26살이 된, 그러나 모른다고 말하는 것의 매혹을 알 만큼은 현명한 어느 시인이 최근에 출간한 첫 시집에는 이런 시가 있다.
“아카시아 가득한 저녁의 교정에서 너는 물었지 대체 이게 무슨 냄새냐고// 그건 네 무덤 냄새다 누군가 말하자 모두 웃었고 나는 아무 냄새도 맡을 수 없었어// 다른 얘들을 따라 웃으며 냄새가 뭐지? 무덤 냄새란 대체 어떤 냄새일까? 생각을 해봐도 알 수가 없었고// 흰 꽃잎은 조명을 받아 어지러웠지 어두움과 어지러움 속에서 우리는 계속 웃었어// 너는 정말 예쁘구나 내가 본 것 중에 가장 예쁘다 함께 웃는 너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였는데// 웃음은 좀처럼 멈추질 않았어 냄새라는 건 대체 무엇일까? 그게 무엇이기에 우린 이렇게 웃기만 할까?// 꽃잎과 저녁이 뒤섞인, 냄새가 가득한 이곳에서 너는 가장 먼저 냄새를 맡는 사람, 그게 아마// 예쁘다는 뜻인가 보다 모두가 웃고 있었으니까, 나도 계속 웃었고 그것을 멈추지 않았다// 안 그러면 슬픈 일이 일어날 거야, 모두 알고 있었지”
황인찬의 시집 (민음사)에 수록돼 있는 시 ‘유독’의 전문이다. 이 시는 나를 사로잡았다. ‘모른다’고 말하는 시여서일 것이다. 아카시아가 만발한 교정이었으니 향기가 자욱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모른다. 어떤 향기인지, 아니, 향기가 나긴 나는지. 누군가 과시적인 재치를 발휘해 이것은 ‘네 무덤 냄새’라고 말한다. 그러나 ‘무덤 냄새’라니, 그건 또 뭐란 말인가. 이 와중에 ‘너’는 웃고 있다. 내가 아는 가장 예쁜 아이. 너는 왜 웃고 있니. 너에겐 이 향기가 느껴지니. 네가 아는 것을 나는 모르는구나. 그게 내가 널 좋아하는 이유일까. 어찌 보면 공평하군. 내가 너를 좋아한다는 것을 너는 모르니까. 그래도 상관없어. 지금 내게 중요한 것은 너와 같이 있다는 것이니까. 네가 웃으니, 나도 힘껏 웃어야지.
이 무지는 특정한 시기의 것이다. 삶이 ‘어두움과 어지러움’일 뿐인 때. 그러나 이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어떤 예감이 있다. 그들은 왜 웃음을 멈추지 않는가. “안 그러면 슬픈 일이 일어날 거야, 모두 알고 있었지.” 웃음을 멈추는 순간 슬픈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예감. 삶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그 이면에는 죽음 같은 슬픔이 분명 존재할 것이라는 예감. 이를테면 ‘무덤 냄새’라고 부를 수밖에 어떤 ‘유독’(有毒)한 것이 세상에는 있는 것만 같다는 예감. 그렇다면 지금 웃음을 멈추지 않는 아이들은 슬픈 것을 생각하지 않기 위해 웃는 것이다. 아이들의 웃음은 일종의 안간힘이었던 거다. 무지가 특정한 시기의 것이라면 예감도 그렇다. 모른다고 말하는 시는 그 대가로 이런 예감을 거느릴 수 있다.
짝이 될 만한 시 한 편. “// 어느 일본 시인의 시에서 읽은 말을, 너는 들려주었다 해안선을 따라서 해변이 타오르는 곳이었다 우리는 그걸 보며 걸었고 두 손을 잡은 채로 그랬다// 멋진 말이지? 너는 물었지만 나는 잘 모르겠어,/ 대답을 하게 되고// 해안선에는 끝이 없어서 해변은 끝이 없게 타올랐다 우리는 얼마나 걸었는지 이미 잊은 채였고, 아름다운 것을 생각하면 슬픈 것이 생각나는 날이 계속되었다// 타오르는 해변이 아름답다는 생각이 타오르는 해변이 슬프다는 생각으로 변해가는 풍경,// 우리들의 잡은 손안에는 어둠이 들어차 있었는데, 여전히 우리는 걷고 있었다.” 이 시 역시 모른다. 아름다운 것 다음에는 왜 슬픈 것이 떠오르는지. 대신 ‘손안에 들어찬 어둠’ 같은 예감만이 거기에 있다. 이렇게 시는 어떤 특별한 무지의 상태를 포착하는 작업이다.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임은정, ‘한명숙 사건’ 소환해 백해룡 저격…“세관마약 수사, 검찰과 다를 바 없어”

쿠팡, 4분기 영업익 97%↓…김범석, ‘개인정보 유출’ 첫 육성 사과

러시아 “돈바스 내놓고 나토 나가”…선 넘는 요구에 우크라전 종전협상 ‘난망’

국힘 지지율 17% “바닥도 아닌 지하”…재선들 “절윤 거부에 민심 경고”
![[단독] 김용현 변호인 ‘감치 15일’ 집행 못 했다…남은 5일은? [단독] 김용현 변호인 ‘감치 15일’ 집행 못 했다…남은 5일은?](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26/53_17720869463045_20260226502791.jpg)
[단독] 김용현 변호인 ‘감치 15일’ 집행 못 했다…남은 5일은?

‘재판소원 육탄방어’ 조희대 대법원…양승태 사법농단 문건 ‘계획’ 따랐나

박정훈, ‘항명’ 기소 군검사 재판서 “권력의 사냥개들” 비판

기초연금 개편, 차등 지급·수급자 감축 검토

조희대, ‘노태악 후임’ 선거관리위원에 천대엽 내정

‘법왜곡죄’ 위헌 소지 여전…판사들 “누가 직 걸고 형사재판 하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