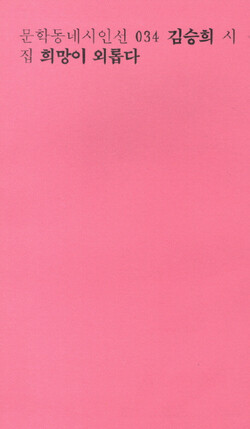
수많은 사람들이 독재와 싸워 얻어낸 대통령 직선제로 독재자의 딸이 합법적 대통령이 됐다. 이 사태를 두고 ‘참혹한 아이러니’라고 부르지 않을 도리가 없다. 그래서 어딘가에 적었다. 이제 세계인들은 역사적 아이러니(Historical Irony)의 한 사례로 한국의 18대 대선을 거론할 것이라고. 청년 문재인을 감옥에 집어넣은 박정희의 딸 박근혜가, 문재인 같은 이들이 피 흘려 쟁취한 선거제도를 통해, 그 문재인에게 승리하게 된 이 상황보다 더 아이러니한 일이 있겠느냐고. 그러나 그 글의 끝에서 나는 희망을 말해야 한다는 강박에 졌다. 진정으로 절망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따로 있을 것이며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믿지 않으면서도 희망에 대해 적었다. 한 번 더 역사적 아이러니를 기대하자고. 독재자의 딸이 민주주의를 꽃피우는 아이러니를.
“남들은 절망이 외롭다고 말하지만/ 나는 희망이 더 외로운 것 같아,/ 절망은 중력의 평안이라고 할까,/ 돼지가 삼겹살이 될 때까지/ 힘을 다 빼고, 그냥 피 웅덩이 속으로 가라앉으면 되는 걸 뭐……/그래도 머리는 연분홍으로 웃고 있잖아, 절망엔/ 그런 비애의 따스함이 있네// (중략) 사전에서 모든 단어가 다 날아가버린 그 밤에도/ 나란히 신발을 벗어놓고 의자 앞에 조용히 서 있는/ 파란 번개 같은 그 순간에도/ 또 희망이란 말은 간신히 남아/ 그 희망이란 말 때문에 다 놓아버리지도 못한다/ 희망이란 말이 세계의 폐허가 완성되는 것을 가로막는다,/왜 폐허가 되도록 내버려두지 않느냐고/ 가슴을 두드리기도 하면서/ 오히려 그 희망 때문에/ 무섭도록 외로워지는 순간들이 있다//(중략)// 도망치고 싶고 그만두고 싶어도/ 이유 없이 나누어주는 저 찬란한 햇빛, 아까워/ 물에 피가 번지듯…/ 희망과 나,/ 희망은 종신형이다/ 희망이 외롭다”(‘희망이 외롭다 1’에서)
마침 이런 시를 읽었다. 김승희의 새 시집 에 수록돼 있는 작품이다. 굳이 분석 비슷한 것을 해보자면 이렇다. 이 시에서 ‘희망이 외롭다’라는 명제는 두 가지로 읽힐 수 있다. 첫째, 희망은 지금 외로운 처지라는 것. 희망이라는 말만 있을 뿐 어디에도 희망은 없기 때문이다. 둘째, 희망 때문에 내가 외롭다는 것. 희망 같은 거 없다고 생각해버리면 마음껏 망가질 수 있을 텐데 희망 때문에 그럴 수도 없어서 내가 외롭다는 것. 요컨대 희망은 주어로서도 외롭고 목적어로서도 외롭다. 공감하는 분들이 꽤 있을 것이다. 인터넷 공간에서 두 종류의 목소리를 들었다. 마음껏 절망이라도 해야 살겠다고 말하는 분들과 이럴수록 희망을 가져야 한다고 냉정해지는 분들이 모두 있었다. 나는 전자에 동의하며 후자인 양 글을 썼었다.
또 그러려고 한다. 여전히 참혹한 기분이지만 다시 희망에 대해 말하려고 한다. 블랑쇼를 펼친다. 그는 ‘잠들어 있음’과 ‘깨어 있음’ 사이의 관계를 성찰했다. 통상적으로 우리는 둘이 모순 관계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블랑쇼는 이 관계를 변증법적으로 전복한다. “잠은 밤을 가능성으로 변모시킨다. 깨어 있음은 밤이 오면서 잠이 된다. 잠을 자지 않는 자는 깨어 있을 수 없다. 깨어 있음은 항상 깨어 있을 수는 없다는 사실에서 성립한다. 왜냐하면 깨어 있음은 ‘깨어남’을 그 본질로 하기 때문이다.”() 항상 깨어 있는 사람은 ‘깨어남’이라는 사태를 체험할 수 없다는 것. 잠을 잘 수 있고 또 자는 사람만이 깨어남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것. 그러므로 이런 역설이 성립한다. 항상 깨어 있으면 진정으로 깨어날 수 없다.
이것은 말장난이 아니다. 예컨대 불면증 환자들은 늘 깨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들은 어느 순간에는 자신이 지금 깨어 있는지 아닌지 혼란에 빠지고 말 것이다. 장자의 호접몽 속에 있는 사람처럼, 자신의 이 기나긴 깨어 있음이 사실은 기나긴 잠 속의 무한한 꿈이 아닐까 의심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수면은 각성의 반대말이 아니다. 전자는 후자의 근거다. 자야만 깨어날 수 있다. 이 통찰을 절망과 희망이라는 짝에다가 적용해보려고 한다. 앞으로 5년 동안 한국 사회가 다시 긴 잠에 빠진다 하더라도, 5년이 지난 뒤에도 우리가 여전히 자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오히려 그 5년 동안의 잠 때문에 우리는 깨어남이라는 사건을 처음인 것처럼 확실하게 경험할지도 모른다고. 믿지 않으면서, 나는 쓴다. 희망은 종신형이니까.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몸에 피 한방울 없는 주검이 되어 돌아온 새 신랑

지귀연, 내란실패 이유로 윤석열 감경…장기독재 계획도 인정 안 해

10개월간 환자 묶은 부천 이룸병원…인권위 “신체 자유 보장” 권고

‘윤어게인’ 집회신고 2천명인데…20명도 안 모인 서울구치소 앞

윤석열 무기징역…법원 “내란 우두머리죄 인정”

뉴욕타임스 “윤석열 무기징역, 혼란에 지친 한국인에게 종지부”

쉬지 말고 노세요…은퇴 뒤 ‘돈 없이’ 노는 법

장동혁, 윤석열 ‘무기징역’에 침묵…소장파 24명 “즉각 ‘절윤’ 하라”

‘19 대 1’ 수컷들 성적 괴롭힘에 추락사…암컷 거북의 비극

이 대통령,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해임제청안 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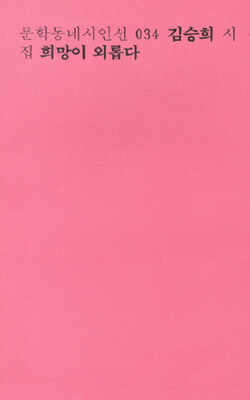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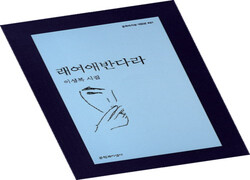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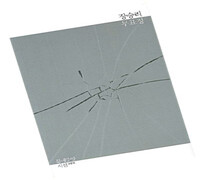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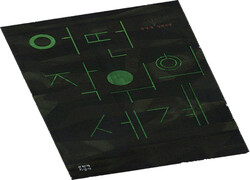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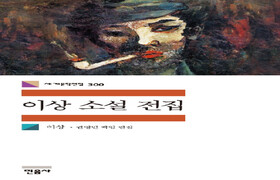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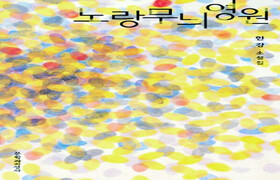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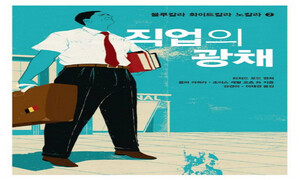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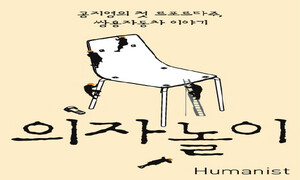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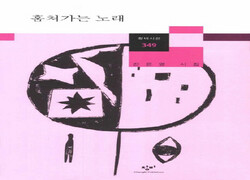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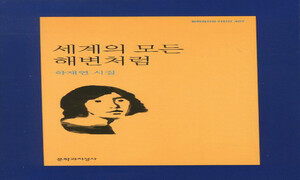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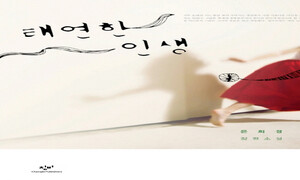



![[속보] 법원, 내란 수괴 윤석열에 무기징역 선고…김용현에 징역 30년 [속보] 법원, 내란 수괴 윤석열에 무기징역 선고…김용현에 징역 30년](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19/53_17714858210992_9617714858077371.jpg)
![[단독] 12·3 내란 막은 대한민국 시민,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됐다 [단독] 12·3 내란 막은 대한민국 시민,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됐다](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19/53_17714644118764_2024121350282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