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2월 초에 나온 시집을 반년 동안 조금씩 읽었다. 차례대로 읽은 것도 아니다. 아무 데나 펼쳐서 한두 편을 읽고 덮었다. 어떤 때는 한두 문장을 읽고 덮기도 했다. 한 번 펼친 데가 그다음에도 또 펴져서 이미 읽은 곳을 여러 번 다시 읽게도 되었다. 그러다 보니, 복도에서 자주 마주치는 다른 반 아이 같은, 그런 구절들이 생겨났다. 반년쯤 눈을 마주치게 되면 어떤 말이건 걸어보고 싶어진다. ‘나는 너를 여러 번 봤어. 네가 어떤 아이인지 상상을 해봤지. 상상대로면 그래서 신기할 것이고, 아니면 또 아니어서 재미있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하게 한 구절들을 옮겨 적고 내 맘대로 말을 걸어보려고 한다. 전문이 아니어서 아쉽지만 그건 시집에 있으니까.
(1) “하루의 열여섯 시간 대나무 잎을 씹는 판다의/ 두 손바닥처럼/ 세계는 여러 가지 슬픔 위에 성립되어 있다”(‘손톱 이야기’에서) 판다는 대나무 잎을 뜯어 먹는다. 대나무 잎만으로 그 큰 체구를 유지해야 한다. 그래서 온종일 먹어야 하고, 최소한으로만 움직여야 한다. 그런 판다의 두 손바닥처럼, 이라고 당신은 적었다. 그리고 이 세계가 ‘구조적으로’ 슬프게 돼 있다고 말한다. 특히 시에서 이런 문장은 좋은 문장이다. ‘판다의 식사’와 ‘세계의 슬픔’ 양쪽 모두를 동시에 달리 보게 만들기 때문이다. 판다는 세계처럼 슬프고, 세계는 판다처럼 슬프다.
(2) “나의 사랑, 나의 친구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나는/ 하루에 몇 번인가/ 나처럼 생긴 것을 나의 힘으로 뱉어낸다.”(‘서커스’에서) 세계는 슬프고 삶은 서커스다. 공중그네 사이를 날고 불 속을 통과하고 외줄을 탈 때 단원들은 어떤 기분일까. ‘나처럼 생긴 것을 나의 힘으로 뱉어내는’ 그런 기분일까. 이 문장 덕분에 나는 서커스가 무엇인지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지만, 덧붙여, 이 세계가 왜 슬픈지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알게 된다. 나의 친구와 나의 연인 앞에서 말을 할 때도 나는 실은 나와 닮은 무언가를 힘겹게 뱉어내고 있었던 것이었구나, 하고.
(3) “5월에는 벨린다를 만날 테야/ 내 이름을 묻지 않을 거야/ 웃지 않고도 살 수 있다니 얼마나 좋을까”(‘벨린다 메이’에서) 엔니오 모리코네의 (Belinda May)를 들어보라는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문장이 신선하다는 얘길 하려는 것이다. “웃지 않고도 살 수 있다니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요즘 ‘웃겨라’ 혹은 ‘웃어라’라는 명령에 시달리며 사는 것 같다. 예능 프로에 나온 가수는 개그맨도 아닌데 왜 웃기지 못했다며 미안해할까. 그렇다면 아마도 연인이라는 특별한 관계는 이런 거겠지. ‘나를 웃기려고 애쓰지 않아도 좋아요. 나는 이미 웃고 있으니까. 이건 내가 지금 행복하다는 뜻이에요.’
(4) “처음 들어보는 노래를 하기 위해/ 침묵이 필요하고/ 너를 만나기 위해서는/ 늘 또 한 사람이 필요하다.”(‘세 사람’에서) 시 전체를 읽어보면 두 사람이 만나 한 생명이 태어나는 일에 대해 말하는 구절처럼 보인다. 그런데 나는 좀 다른 생각을 했지. 반드시 세 사람이 함께 만나야 하는 관계들이 있다는 것. 사례 하나. 우리 셋은 늘 어울려 다니니까 친구라고 해도 좋겠지만, 어째서 우리는 둘이서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을까. 왜 둘이서는 처음인 듯 모든 것이 어색해질까. 사례 둘.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나는 언제나 너를, 네가 사랑하는 그와 함께 만나야 하지. 우리는 늘 셋이군.
(5) “그러므로 나는 견딜 수 있을 만큼/ 조금씩 살아간다”(‘로맨티스트’에서) 이것은 슬픈 문장이지만 이 시인이 시를 쓰는 방법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 같다.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조용히 복도를 걸어가는 아이처럼, 고요하게 진실을 말하고 지나가는 시인이다. 그래서 이 시집을 잘 읽기 위해서는, ‘견딜 수 있을 만큼만 조금씩 살아가는 사람’의 ‘존재의 리듬’이랄까, 그런 것에 나를 맞춰야 한다. 이런 시인이 이런 말을 하는 건 그러니 하나도 놀랍지가 않다. “우리는 우리의 리듬을 이해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전 생애를 낭비한다.”(‘4월 이야기’에서) 시인의 이름은 하재연, 시집의 제목은 (문학과지성사)이다.
문학평론가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동사무소 직원 ‘점 하나’ 실수로 남동생이 남이 되었다

스케이트 날이 휘면 다시 펴서…아픈 누나 곁 엄마에게 메달 안긴 아이

‘800만원 샤넬백’…받은 김건희는 무죄, 전달한 전성배는 왜 유죄일까

이 대통령 “산골짜기 밭도 20만~30만원”…부동산 타깃 확대

“누가 반대했나 밝혀라”…통합안 보류에, TK 의원-지도부 내부 충돌

대전·충남 통합 불발되면, 강훈식은 어디로…

트럼프 말리는 미 합참의장…“이란 공격하면 긴 전쟁 휘말린다”

‘계엄군 총구’ 안귀령 고발한 전한길·김현태…“탈취 시도” 억지 주장

이 대통령 “계곡 불법시설 못 본 척한 공무원 엄중 문책하라”
![법원장님 들어가십니다 [그림판] 법원장님 들어가십니다 [그림판]](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6/0224/20260224503791.jpg)
법원장님 들어가십니다 [그림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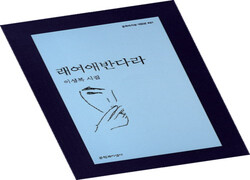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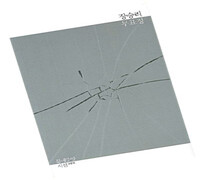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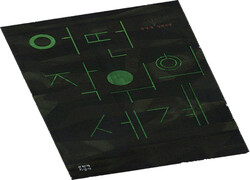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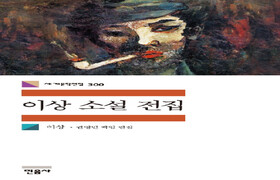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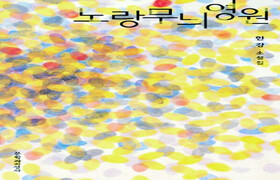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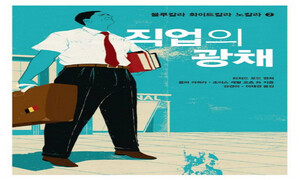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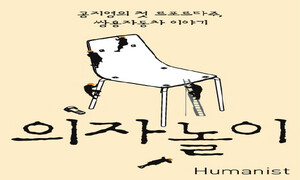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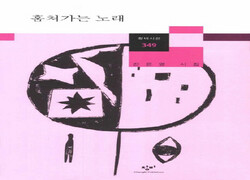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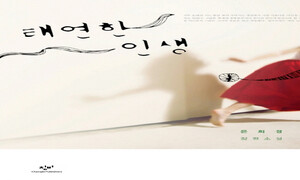
![[속보] ‘공천헌금 1억 수수’ 강선우 체포안 가결 [속보] ‘공천헌금 1억 수수’ 강선우 체포안 가결](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24/53_17719178646426_20260224503154.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