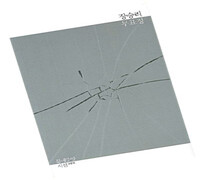‘시간은 모든 일이 동시에 일어나지 말라고 존재하는 것이다. 공간은 모든 일이 나한테 일어나지 말라고 있는 것이다.’ 수전 손태그가 (이후·2007)에서 출처 없이 인용한 이 말을 나는 좋아한다. 손태그의 말마따나 이 말은 소설에 대한 좋은 설명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소설은 시간과 공간을 다룬다. 그래서 모든 일이 동시에 일어날 수 없고 또 한 사람에게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긴 시간을, 타인들과 함께, 산다. 소설을 통해 이를 새삼스럽게 인식하는 일은 이 세계를 거시적·통합적으로 조망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런데 저 명제와 대결하는 것도 소설이 할 만한 일이다.
1994년에 등단해 다섯 권의 소설집을 출간한 박성원은 소설에서 ‘시간과 공간’이라는 범주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작가 중 하나다. 그의 신간 (문학과지성사·2012)의 표제작은 서로 다른 네 사람의 ‘하루’를 돌아가며 보여준다. 여자, 남편, 소년, 남자. 그런데 소설을 읽다 보면 우리는 이 네 사람의 하루가 당사자들은 미처 모르는 고리들로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각자 자신의 공간에서 자신의 시간을 살았을 뿐인데, 그것들이 통제 불가능한 방식으로 인과관계를 형성하고, 결국 두 사람이 죽는다. 짓궂은 신의 농담처럼 혹은 나비효과의 불운한 사례처럼.
단편소설에서 이런 종류의 플롯을 이토록 정교하게 건축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 작가는 이 세계의 어느 ‘하루’를 도려내 시간의 띠를 만들고, 여러 공간에서 그 시간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보여준 다음, 띠의 양 끝을 뫼비우스의 띠처럼 비틀어 붙였다. 이것은 손태그가 인용한 두 문장 중에서 후자를 받아들이고 전자를 비튼 사례다. 공간이 있어서 모든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는 않지만, 그 각각의 일이 시간적으로 ‘동시에’ 일어날 때 어떤 파국적인 결과가 빚어질 수도 있음을 보여준 셈이다. 이것은 플롯의 승리다. 그렇다면 전통적인 선형적(linear) 서사는 게으르고 따분한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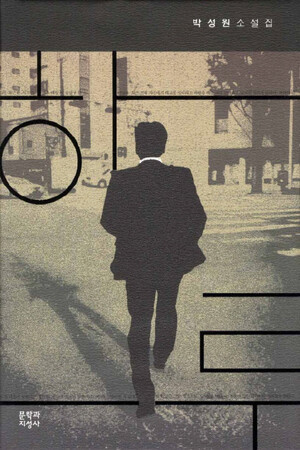
물론 전혀 그렇지가 않다. 리처드 포드가 엮은 단편선집 (2011)가 최근에 두 권으로 번역됐는데, 하권에 해당하는 (홍시·2012)에는 애니 프루의 단편 ‘직업 이력’이 실려 있다(‘어느 가족의 이력서’라는 제목으로 몇 년 전에 번역된 적이 있다). 이 소설로 말할 것 같으면 플롯이라는 것이 왜 필요한지 도무지 모르겠다는 식이다. “리랜드 리는 1947년 11월17일 와이오밍주, 코라에서 여섯 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 이 문장을 시작으로 이 소설은 리랜드가 로리와 결혼해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어떤 직업들을 전전했는지를 공문서처럼 적어나간다.
이렇게 써도 소설이 될 수 있을까. 물론이다. 불과 몇 페이지 안에 한 인간의 반평생을 요약했을 뿐인데, 바로 그런 이유로, 즉 한 인간의 반평생이 고작 ‘직업 이력’으로 요약될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무기력한 애잔함을 안겨준다. 주인공의 삶은 특정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며 다른 공간은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아무도 뉴스를 들을 시간이 없었다.” 이 소설의 마지막 문장이다. 지금 이 시간이 다른 곳에서 어떻게 흐르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그러니 손태그가 인용한 두 명제를 다시 가져와 보자면, 이 소설은 우리에게 공간이 있다는 것보다 시간이 있다는 사실에 더 예민하게 반응한 소설인 셈이다.
박성원의 소설이 특정 시간을 잘라내고 그 시간이 흐르는 여러 공간을 살핀 것이라면, 애니 프루의 소설은 특정 공간을 오려내고 그 위를 지나가는 긴 시간을 살폈다. 전자는 각자가 자기 일에 충실할 때도 그 삶들이 연결되는 순간 결과는 최악이 될 수도 있다 말하고, 후자는 우리가 삶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길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지만 넓은 시야에서 보면 결국 제자리일 수도 있다고 말한다. 전자가 어떤 삶도 고립돼 있지 않다고 섬뜩하게 말할 때, 후자는 삶이란 고작 몇 페이지로 요약되는 것이라고 쓸쓸하게 말한다. 섬뜩하거나 혹은 쓸쓸하거나. 결론이 이렇게 된 건 물론 내 책임이 아니며 작가들의 잘못도 아니다. 삶이 대체로 그러한 탓일 뿐.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이재명 대선후보 자격 박탈’ 초스피드 질주한 ‘조희대 사법부’

이란 새 지도자 모지타바, 하메네이보다 초강경…미국에 항전 메시지

60살 이상, 집에서 6천보만 잘 걸어도 ‘생명 연장’…좋은 걷기 방법
![[단독] ‘한국인 노벨평화상’ 추천 학자들 “민주적 회복력 위대한 본보기” [단독] ‘한국인 노벨평화상’ 추천 학자들 “민주적 회복력 위대한 본보기”](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09/53_17730229672236_20250113500160.jpg)
[단독] ‘한국인 노벨평화상’ 추천 학자들 “민주적 회복력 위대한 본보기”

오세훈, 끝내 공천 신청 안 했다…“윤어게인과 절연 우선”

이정현, 오세훈에 “후보 없이 선거 치르는 한 있어도 공천 기강 세울 것”

2천㎞ 자폭에 미끼 작전…이란 ‘가성비’ 드론, 언제까지 먹힐까

트럼프, 이란 새 최고지도자 하메네이 차남에 “오래 못 갈 것”

정원오, 서울시장 선거 출마 선언…“세금 안 아까운 서울 만들겠다”
![이 대통령 지지율 58.2%…민주 48.1% 국힘 32.4% [리얼미터] 이 대통령 지지율 58.2%…민주 48.1% 국힘 32.4% [리얼미터]](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09/53_17730135956878_20260309500316.jpg)
이 대통령 지지율 58.2%…민주 48.1% 국힘 32.4% [리얼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