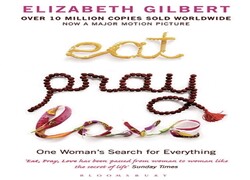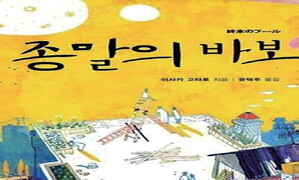1
“다 필요 없어. 눈을 봐.”
운전 중 졸음을 쫓는 데 효과적인 것은? 껌? 커피? 그것보다는 연애 이야기다. 마음에 드는 상대를 넘어오게 만드는 법을 알려준다는데 졸릴 사람이 누가 있을까. 회사 동료들과 지역 출장을 다녀오는 승용차 안, 벌써 서너 시간 넘게 운전대를 잡고 있는 한 총각을 중심으로 연륜 깊은 누님들의 낯 뜨거운 비법 전수가 이어졌다. 그런데 이 총각, 참으로 영리하기도 하지. 열심히 교육을 받던 중 이런 질문을 던졌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좋아하는지, 그냥 분위기를 맞춰주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순간 연애 고수들 사이에 침묵이 흘렀으나, 곧이어 동시다발로 터져나온 말. “눈을 보라고, 눈을!”
별말 나누지 않았어도 그 사람과 내 눈이 부딪쳤다는 분명한 느낌이 있다면, 그들이 사달이 날 확률은 매우 높다. 아무리 유쾌한 시간을 보냈어도 뭔가 찜찜하다면, 뒤돌아 생각해보라. 그 사람의 눈빛이 기억나는지. 그러니 사랑에 빠진 이들을 눈 맞았다고 하는 옛말은 진리고(이것도 옛말이 아니라고?), 진정한 포커페이스란 표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눈빛을 감추거나 속이는 사람이다.
현대 라틴 여성작가들의 단편집 에 실린 ‘일주일은 칠일’은 바로 그런 눈에 대한 이야기다. 이 단편은 “우리 엄마는 커다란 눈으로 남자들을 울리곤 했던 여자였다”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어린 딸을 데리고 수많은 도시를 옮겨다니는 엄마에게는 ‘동지’라 부르는 많은 친구가 있다. 그중 많은 남자 동지가 엄마를 사랑한다. 그러나 어느 남자도 엄마와 함께할 수 없었다. 엄마는 제 옆에서 한 번도 딸을 떼어놓지 않는다. “당신의 무릎은 너무 예쁩니다. 정말이지 당신은 진짜 예쁜 여자예요”라고 고백한 금발의 열렬한 구애자도 울며 떠나갔다. 그 이유는 딸이 죽은 아버지의 본가에서 처음으로 친할머니를 만나는 데서 알 수 있다. “눈이 (제 아비를) 닮았어.” 커다란 갈색 눈으로 남자들을 울렸던 여자가 사로잡힌 눈빛이 이미 있었던 것이다.
작가 마갈리 가르시아 라미스는 푸에르토리코 사람이다. 푸에르토리코는 400년간 스페인 식민지였다가 미국-스페인 전쟁 이후 1898년부터 미군정 아래에 있었다. 1952년에야 내정 자치권을 획득했다. 긴 세월 동안 독립을 향한 저항이 있었고, 소설에 등장하는 어린 딸의 부모는 그 시절 혁명가들을 모델로 하고 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한 시대와 눈이 맞은 사람들이다. 어느 시인의 시구처럼 “기껏 복숭아씨만 한 사람의 눈이라는 게 여간 영묘하지 않아서 그것 하나 때문에 생을 다 바치는 자”들인 것이다.
그래서 연애 지수가 떨어지는 시대는 비겁해질 수밖에 없다. 내가 마주한 단 한 사람과도 눈을 제대로 못 맞추는데, 내가 마주하는 ‘사람들’과 눈맞춤을 할 용기가 생기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부디 좀더 좋은 세상을 위해서라도 눈 맞는 청춘남녀가 창궐하기를 바란다.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하메네이 전권 위임받은 라리자니 “미국, 후회하게 만들겠다”

미군 사령부 ‘명중’ 시킨 이란…미 방공미사일 고갈 가능성 촉각

이란 37년 절대권력, 하루아침에 ‘폭사’…하메네이는 누구

국힘, 필리버스터 백기투항…TK여론 악화로 행정통합법 처리 ‘다급’
![‘조희대 대법원장’ 자체가 위헌이다 [아침햇발] ‘조희대 대법원장’ 자체가 위헌이다 [아침햇발]](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01/53_17723445090457_20260301501521.jpg)
‘조희대 대법원장’ 자체가 위헌이다 [아침햇발]

‘하메네이 사망’ 이란, 실세 라리자니 체제 이미 구축

말에 ‘뼈’ 있는 홍준표…배현진 겨냥 “송파 분탕치는 정치인 정리해야”

국힘 ‘TK 빼고 전패’ 어게인?…날개 단 이재명 효과, 6월 시나리오는

“장동혁, 윤석열 껴안더니 부정선거 음모론까지”…개혁신당 비판
![왜 부자는 수돗물 마시고 가난하면 병생수 마실까 [.txt] 왜 부자는 수돗물 마시고 가난하면 병생수 마실까 [.txt]](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01/53_17723391952718_511772339139994.jpg)
왜 부자는 수돗물 마시고 가난하면 병생수 마실까 [.t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