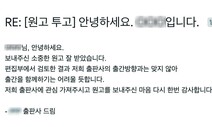출판사의 미감과 취향으로 만든 <섬 위의 주먹>.
이래서 될 일이 아니다. 또 홀랑 반해버리다니.
4월로 만 3년을 채우고 4년차 출판사가 되는 마당에 비용 지출과 매출의 균형이 아슬아슬하고, 발행인이 유일한 편집자이면서 계약 리스트는 20종이 넘고… 그리하여 당분간 기획 쪽으로는 눈 돌리지 말자 노선을 정했음에도, 정신을 차려보니 새 그림책 계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 18세기 철학자 데이비드 흄은 “어떤 종류의 아름다움은 처음 나타나자마자 우리의 애정과 승인의 감정을 이끌어낸다”고 썼다. 그러한 아름다움은 불가항력이며 편집자의 애정과 승인은 계약서로 발현된다….
그림책은 한눈에 반하기 좋다. ‘오후의소묘’의 첫 그림책인 <섬 위의 주먹>도 보는 순간 단박에 반했다. 프랑스 책이라 글의 의미는 알지 못한 채, 비올레타 로피스의 그림에 푹 빠져버렸다. 그러나 그림책은 화집처럼 단지 그림의 묶음인 것이 아니라 그림의 연속성, 글과의 관계성, 책이라는 형식의 총체여서, 즉각적인 아름다움 이후 이 모든 요소가 어우러진 아름다움이 시차를 두고 뒤따른다. 뜻 모를 원서만으로 그 아름다움을 온전히 느끼기는 어려운 일.
<섬 위의 주먹>은 프랑스에서 2011년 출간됐고, 이제 와 어디에선가 내줄 일은 요원해 보였다. 에이전시가 국내 출판사들에 소개한 바 있음에도 여태 번역본이 나오지 않은 것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텐데… 어떤 아름다움은 더 알고 싶고, 갖고 싶고, 또 나누고 싶어진다. 아름다움은 정말로 힘이 세고, 2019년 1월 이 책의 한국어판 계약서에 서명했다.
성인 대상 교양서를 오래 만들던 편집자가, 게다가 꽤 소극적이며 모험심 적은 한 사람이, 지형을 완전히 달리하며 전혀 알지 못하는 시장에 온몸을 훌쩍 내던지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림책은 서점이나 도서관에서 유아/어린이 분야에 자리하는데, 그 자리는 내게 너무 낯설고 또 함부로 끼어들 곳이 아닌 듯 보였다. 그림책이라고 유아/어린이 분야에만 놓이라는 법이 있을까? 내가 반한 책, 내 책장에 꽂아둘 책, 내가 만드는 그림책들의 자리에 다른 이름이 필요했다. ‘어른을 위한 그림책’이라는 일견 이상해 보이는 카테고리의 이름은 그렇게 왔다.
만일 이것이 가능했다면 ‘아름다운 그림책’이라 이름 붙였을 텐데. ‘오후의소묘’의 그림책은 재미, 가치, 교훈, 리듬 등 그림책이 가지는 여러 속성 중 아름다움에 가장 크게 복무한다. <섬 위의 주먹>의 번역본은 큰 판형에 양장에 쓰인 합지가 일반 그림책보다 두껍고, 표지 그림을 원서와 달리했으며, 겹겹의 층으로 이루어진 그림과 결을 맞춰 원서에 없는 색면지를 추가로 대고 속표지를 더했다. 고급지를 썼고, 본문은 글자 크기가 작으며, 제목은 좀… 아리송하게 느껴질 수 있다. 이 책의 만듦새는, 그러니까 표지, 판형, 제본, 종이, 면지, 속표지, 그림의 인쇄 품질, 번역 스타일, 제목의 어감 등은 만든 이의 미감과 취향을 따른 결과물이다.
아동문학의 노벨상이라 할 안데르센상을 받은 이수지 작가는 그림책에 대해 “책꽂이에 꽂히는 예술. 딱 그 크기만 한 예술”(<이수지의 그림책>, 비룡소)이라고 썼다. 소설이나 시를 예술작품이라 할 때 그것은 책이라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으나, 그림책은 그 자체로 예술작품이 된다. 이 육면체의 예술품은 물론 창작자의 세계이면서, 동시에 창작자에게 반한 이들이 공동하는 세계이기도 하다. 첫눈에 반한 창작자의 세계를 품고 펼쳐내며 풍성해질, 작고 아름다운 거주지를 만드는 일. 나의 일이다.
글·사진 지우 오후의소묘 편집자
*책의 일: 출판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일을 소개합니다. 직업군별로 4회분 원고를 보냅니다. 3주 간격 연재. 그림책, 그것도 어른을 위한 그림책을 전문으로 내는 1인 출판사 ‘오후의소묘’ 지우 편집자가 바통을 이어 연재합니다.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동사무소 직원 ‘점 하나’ 실수로 남동생이 남이 되었다

이 대통령 “농지매각 명령이 공산당? ‘경자유전’ 이승만도 빨갱이냐”
룰라 ‘여보, 새끼손가락 없는 맞춤장갑 좀 봐요’…뭉클한 디테일 의전

정청래 “장동혁, 고향 발전 반대하나…충남·대전 통합 훼방 심판받을 것”

스케이트 날이 휘면 다시 펴서…아픈 누나 곁 엄마에게 메달 안긴 아이

전한길, 반말로 “오세훈 니 좌파냐?”…윤어게인 콘서트 장소 제공 압박
![법원장님 들어가십니다 [그림판] 법원장님 들어가십니다 [그림판]](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6/0224/20260224503791.jpg)
법원장님 들어가십니다 [그림판]

“누가 반대했나 밝혀라”…통합안 보류에 국힘 TK 의원-지도부 충돌

‘800만원 샤넬백’…받은 김건희는 무죄, 전달한 전성배는 왜 유죄일까

‘계엄군 총구’ 안귀령 고발한 전한길·김현태…“탈취 시도” 억지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