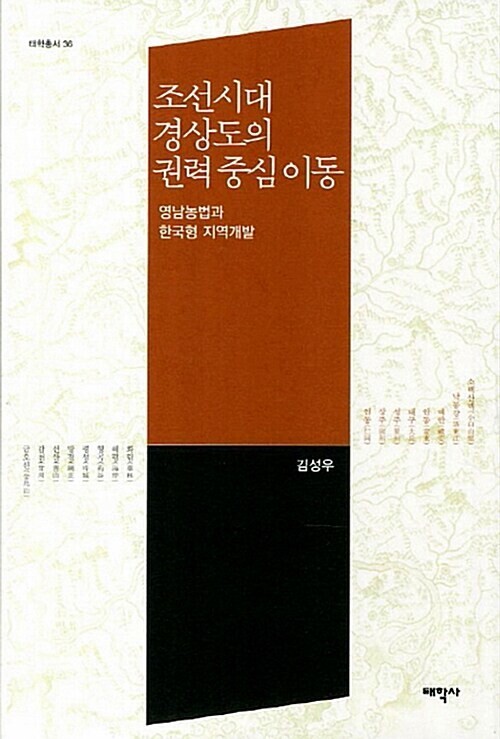
김성우 지음, 태학사 펴냄
밭 전(田), 이제는 한자와 너무나 멀어진 대부분의 한국인이 그래도 자신 있게 쓸 수 있는 몇 안 되는 글자다. 재밌는 건 한국인의 주식인 쌀은 밭에서 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밀이나 보리, 메밀처럼 물을 대지 않는 작물을 재배하는 경지가 밭이다. 그럼 쌀은 어디서 나느냐, 논이다. 한자로는 답(畓)이라 한다. 밭(田) 위에 물(水)을 올린 모양새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은 두 가지다. 첫째, 오늘날과 달리 과거, 최소한 한자가 등장했을 무렵의 동아시아에선 논보다 밭이 일반적이었다. 둘째, 벼농사의 성패는 전적으로 물에 달렸다.
역사학자 김성우의 의문은 바로 여기서 시작한다. 건조하고 겨울이 길어 물을 제때 대기 어려운 한반도에서 어떻게 쌀이 주식이 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벼농사가 ‘보편’으로 자리잡는 과정에서 한반도의 풍경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그의 책 <조선시대 경상도의 권력 중심 이동>은 조선시대 벼농사 ‘최선진 지대’였던 영남을 중심으로 이 의문을 풀어간다. 책의 논지는 명료하다. 벼농사의 ‘성공’이 아이러니하게도 영남, 나아가 조선의 ‘실패’를 불러왔다는 것이다.
조선 초기 벼농사에서 가장 앞섰던 영남에서도 단연 돋보였던 곳은 서북부의 선산, 오늘날의 구미다. 영남대로와 낙동강이 지나는 교통의 요지이자 완만한 평야와 구릉이 펼쳐진 선산은 신생 왕조의 권농정책을 실험할 최적의 장소였다. 지리적 이점과 국가의 지원이 맞물리며, 고려 말까지만 해도 한적한 속현(屬縣)이었던 선산은 상주나 성주 같은 전통의 강호들과 어깨를 겨누는 ‘슈퍼루키’로 거듭났다. 선산에 이어 경상도의 중심으로 올라선 지역은 서남부의 진주였다. 이곳을 거점으로 삼은 남명 조식과 북인 세력의 거침없고 호방한 기질은 낙동강 하류의 드넓은 평야가 밭에서 논으로 바뀌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17세기에 접어들며 경상도의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른 동북부의 안동은, 그러나 이전의 중심인 선산이나 진주와는 전혀 달랐다. 교통의 요지도 아니었고, 너른 하천도 없었다. 그런데도 이 궁벽한 산골이 중심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던 건 당시 널리 확산된 모내기 덕분이었다. 모내기는 물의 안정적 공급이 필수적인데, 산골짜기에서 흘러나오는 계곡물을 받는 게 하천 유역에 제방이나 저수지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싸게 먹혔기 때문이다.
안동으로의 중심 이동은 경상도 풍경을 크게 바꿔놓았다. 첩첩산중인 안동은 새 문물이 오가기 어려웠고, 자연히 퇴계 학설을 종교 수준으로 추종하는 배타적인 사회로 퇴보했다. 중심이 제구실을 못하자 경상도 역시 ‘조선의 섬’처럼 고립됐다.
문제는 안동, 혹은 경상도만 그런 게 아니었다는 점이다. 똑같이 산골짜기에서 시작했지만 이내 큰 강 하류의 대평야로 내려간 중국이나 일본과 달리, 조선의 개간은 망국 직전까지 산으로, 산으로 올라갈 뿐이었다. 이른바 ‘케이(K)-지역개발’이라 함 직한 이런 방식이 전국으로 확산된 결과, 조선은 ‘작은 안동’들의 집합으로 전락했다. 바깥과의 교류가 극히 제한된 가운데 무기력과 적당주의가 지배하는 자족적이고도 폐쇄적인 공동체. 19세기 서양 선교사들이 묘사한 조선의 촌락 풍경이었다.
지은이의 조선상(像)은, 그간 이 시대를 이해하는 유력한 패러다임이었던 ‘소용돌이의 사회’와 충돌한다는 점에서 흥미롭고, 또 도전적이다. 섬처럼 고립된 촌락공동체와 중앙을 향한 만인의 질주라는 모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어쩌면 모순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게, 조선이라는 나라의 ‘독특함’은 아니었을까?
유찬근 대학생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미 국무부 “한국 사법 존중”…백악관 논란 메시지 하루 만에 ‘수습’

트럼프 “모든 방법 동원해 더 걷을 것”…‘전 세계 10% 관세’ 서명

원룸 살면서 평생 모은 5억…“누나, 나처럼 아픈 사람 위해 써줘”

미 대법,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판결

몸에 피 한방울 없는 주검이 되어 돌아온 새 신랑

“대통령의 계엄 결정 존중돼야”…지귀연의 내란 판단, 어떻게 다른가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발끈…“전세계 10% 관세” 강행
![[사설] 한반도의 ‘대중 발진기지화’ 절대 용납 못 한다 [사설] 한반도의 ‘대중 발진기지화’ 절대 용납 못 한다](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20/53_17715824682676_20260220502623.jpg)
[사설] 한반도의 ‘대중 발진기지화’ 절대 용납 못 한다

펄쩍 날아오른 김길리 ‘2관왕’…최민정은 통산 7개 메달 신기록

위증 혐의 최상목, ‘한덕수 중형’ 이진관 재판부 기피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