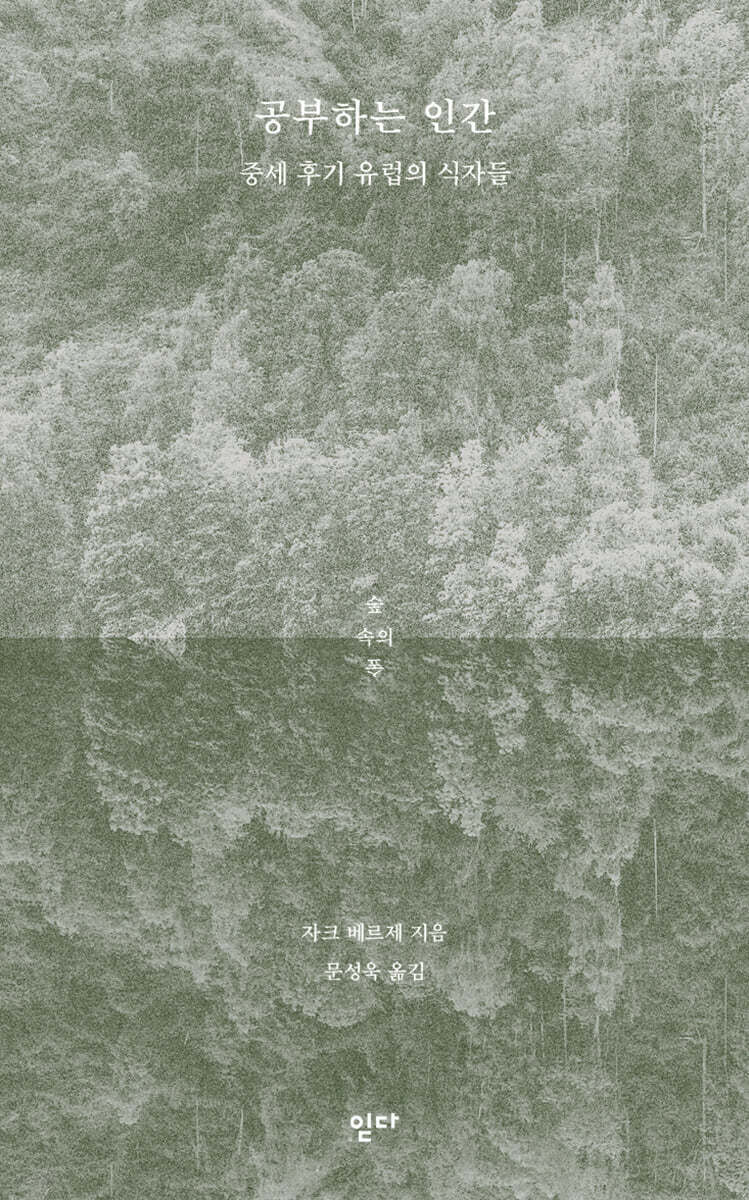
<공부하는 인간>, 자크 베르제 지음, 읻다 펴냄
2024년 5월30일 교육부가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주요 사항’을 발표했다. 1500명에 이르는 의대 정원 증원에 가렸지만, 앞으로 대학교육에 더욱 심대한 영향을 줄 내용은 ‘무전공 선발’ 확대였다. 수도권 대학과 국립대 73곳은 내년 전체 정원의 28.6%에 해당하는 3만7935명을 무전공으로 뽑기로 했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전공과 진로를 탐색할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이나, 사실상 취업에 도움이 안 되는 순수학문을 고사시키려는 것이라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뒤따른다.
대학이 ‘쓸모’에 한 걸음씩 다가갈 때마다 반대편에선 이에 맞서는 무기로 ‘대학의 이상’을 소환한다. 대학은 ‘원래’ 쓸모 따윈 생각하지 않는 학문의 전당이라는 것이다. 글쎄, 그 ‘원래’가 정확히 언제를 가리키는지 알 수 없지만 자크 베르제의 책 <공부하는 인간>은 오늘날 대학의 기원이라 할 수 있는 중세 대학 역시 만만찮게 쓸모를 챙겼음을 보여준다.
‘암흑의 중세’와 ‘광명의 르네상스’라는 이분법에 반기를 드는 이 책은 중세 대학이 세속과 동떨어져 신에 대해 고루하고 지엽적인 논쟁에 골몰하던 곳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르네상스 인문주의자들이 그랬듯이 중세의 학위 소지자들 역시 자기 쓸모를 증명해 보이려고 당당히 세상에 나섰다는 것이다.
파리, 몽펠리에, 볼로냐, 살라망카, 옥스퍼드 등 유수의 대학들은 유럽 각지에서 다양한 학생들을 불러 모았다. 길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 빛나는 졸업장을 손에 쥔 학생들이 그대로 대학에 남아 공부를 계속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교회와 국가가 이들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복잡한 행정과 재정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나, 통치 이데올로기를 마련하고 프로파간다를 가다듬기 위해서도 대학 졸업자들의 존재는 필수적이었다. 대학을 졸업한 이들은 당시 가장 촘촘하고 정교한 관료제를 자랑하던 교회, 그리고 이에 맞서고자 했던 국가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자리매김했다. “박사는 기사와 맞먹는다”는 당시 격언은 학위 소지자가 일종의 ‘신분’으로까지 부상했음을 보여준다.
대학과 학위 소지자만이 중세시대 ‘공부’의 전부였던 것은 아니다. 중세 동안 꾸준히 증가해 촘촘한 그물망을 이뤘던 문법 학교들은 최소한의 기초교육을 제공했고 많은 ‘매개적 지식인’을 길러냈다. 지식의 창조자는커녕 전달자조차 될 수 없었던 이들도 자신의 ‘배움’을 밑천 삼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초급학교 교사, 외과술사와 이발사, 변호사와 본당 신부, 말단 서기와 공증인을 비롯한 ‘매개적 지식인’은 지식이 전파되고 설득력을 갖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이란 이렇듯 추기경에서 시골 학교 선생에 이르기까지 저마다 방식으로 공부에서 쓸모를 찾고, 공부를 통해 자기 쓸모를 증명해 보이는 사람들이 늘어난 역사일지도 모르겠다.
하여 묻는다. 과연 쓸모에서 자유로운 공부란 존재할 수 있는가? 무전공 선발로 위기에 놓인 순수학문, 그중에서도 인문학은 그간 쓸모라는 문제를 지나치게 외면해왔던 건 아닌가? 인문학이 구체적으로 어떤 쓸모를 갖는지를 대학과 사회에 설득하기보다 인문학이란 그다지 쓸모는 없지만 어쨌든 중요하다며 눙치고 넘어가진 않았나? 인문학이 갖는 쓸모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어찌됐건 인문학으로 먹고살 사람으로서 새삼 고민하게 된다.
유찬근 대학원생
*역사책 달리기: 달리기가 취미인 대학원생의 역사책 리뷰. 3주마다 연재.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동사무소 직원 ‘점 하나’ 실수로 남동생이 남이 되었다
룰라 ‘새끼손가락 없는 맞춤장갑’ 받고 미소…뭉클한 디테일 의전

트럼프 “관세 수입이 소득세 대체할 것…더 강력한 수단 쓰겠다”

스케이트 날이 휘면 다시 펴서…아픈 누나 곁 엄마에게 메달 안긴 아이

주한미군 사령관, ‘한국에 미-중 전투기 대치 사과’ 전면 부인

“누가 반대했나 밝혀라”…통합안 보류에 국힘 TK 의원-지도부 충돌

이 대통령 “농지매각 명령이 공산당? ‘경자유전’ 이승만도 빨갱이냐”

피해자들은 왜 내 통장에 입금했을까

전한길, 반말로 “오세훈 니 좌파냐?”…윤어게인 콘서트 장소 제공 압박

이 대통령 울컥…고문단 오찬서 “이해찬 대표 여기 계셨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