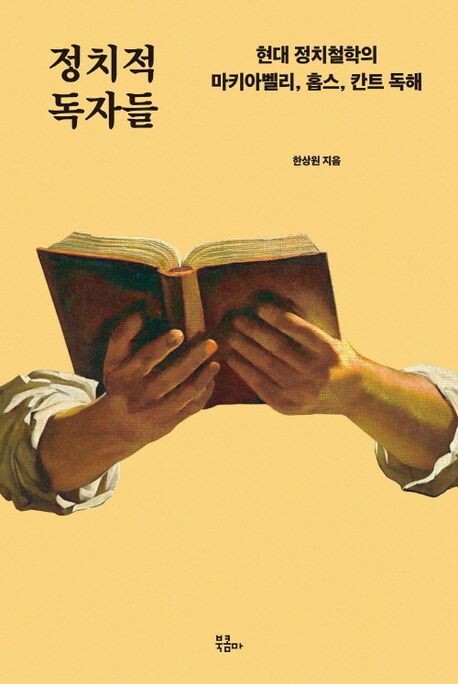
‘정치적 독자들’ 한상원 지음 북콤마 펴냄 2024년
종종 그런 생각을 한다. 독자는 정체성이 될 수 있을까? 흔히 독자는 저자에 비해 어딘가 모자라고 부차적인 존재로 여겨진다. 무언가를 쓰고 짓는 저자와 달리 독자는 그저 저자의 글을 읽을 뿐이라는 생각 탓이리라. 그렇기에 아무것도 생산해내지 못하는 독자는 때론 조롱과 경멸의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나 역시 “그런 식으로 살다간 평생 서평이나 쓴다!”는, 조언인지 악담인지 모를 이야기를 몇 번 들은 적이 있다.
정치철학자 한상원의 ‘정치적 독자들’은 독자에 대한 이러한 통념을 뒤집는다. 그람시와 알튀세르, 슈미트와 발리바르 등 20세기를 수놓은 위대한 정치철학자들은 독자였음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독자였기 ‘때문에’ 훌륭한 저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자기 시대의 위기를 설명하고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하고자 고전을 새로이 읽어낸 ‘정치적 독자’였다. 고전은 그저 과거의 낡은 유물에 머무르지 않고 역사의 국면마다 영감의 원천으로 끝없이 재해석됐다. 이 책이 철학책인 동시에 역사책인 이유이기도 하다.
책은 세 명의 정치철학자에 대한 20세기의 ‘정치적 독서’를 다루지만 초점을 맞추는 인물은 사실상 두 명, 니콜로 마키아벨리와 토머스 홉스다. 흥미로운 점은 오늘날 보수적 사상가로 여겨지는 마키아벨리와 홉스의 ‘정치적 독자’가 주로 좌파 지식인이었다는 사실이다. 가령 20세기에 마키아벨리에게 새삼스레 주목한 인물은 이탈리아 공산당의 창립자이자 헤게모니 이론으로 유명한 안토니오 그람시였다. 토리노 공장평의회 운동이 실패로 돌아가고, 이탈리아에 파시즘 정권이 들어선 역사적 위기 가운데서 그람시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새롭게 읽었다. 마키아벨리가 이야기한 군주란 인민의 집단 의지가 모여 만들어낸 정치 결사, 구체적으로 공산당이라는 것이다.
역시 마르크스의 자장 아래 있던 한 세대 뒤의 좌파 지식인 루이 알튀세르는 그람시의 마키아벨리 해석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가 보기에 마키아벨리는 국가기구 자체의 물리적 강제력을 간파한 사상가였으나 그람시는 이를 놓치고 있었다. 그람시가 인격적 주체로 치환한 마키아벨리의 ‘군주’ 개념 또한 어디까지나 하나의 정치적 전략이요, 주체 없는 과정이었다. 마키아벨리와 그람시에 대한 알튀세르의 ‘정치적 독해’ 역시 시대적 고민의 반영이었다. 그는 그람시의 해석으로부터 마키아벨리를 구출해냄으로써, 국가기구를 접수해 이를 ‘민주화’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 여겼던 프랑스 공산당의 안일함에 맞서고자 했다.
홉스 역시 수많은 ‘정치적 독자’에 의해 끝없이 새롭게 읽혔다. 나치즘을 지지한 법학자 카를 슈미트는 홉스가 이론화한 절대주의 국가란 개인의 양심은 건드리지 않는 중립적인 기계장치라며 비판했다. 슈미트가 보기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내적 자유야말로, 바다괴물 리바이어던에 비견되는 전능한 국가를 안에서부터 무너뜨릴 불행의 씨앗이었다.
급진 좌파 이론가인 에티엔 발리바르는 바로 이 역설로부터 자유주의의 가능성을 보았다. 홉스와 슈미트에 따르면 국가는 필연적으로 그 ‘내부’에 개인의 자유와 양심이라는 ‘외부’를 가지며, 이는 끝나지 않는 적대와 갈등을 부른다. 발리바르에 따르면, 이러한 ‘적대의 제도화’야말로 자유민주주의가 이룩한 역사적 의의였다. 20세기 서구 정치철학의 역사란 이처럼 고전에 대한 다시 읽기, 곧 부단한 ‘술이부작’(述而不作)의 과정이었던 셈이다.
유찬근 대학원생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태진아 “전한길에 법적 대응”…일방적으로 콘서트 참석 홍보·티켓 판매

몸에 피 한방울 없는 주검이 되어 돌아온 새 신랑

트럼프, ‘슈퍼 301조’ 발동 태세…대법원도 막지 못한 ‘관세 폭주’

‘어디서 본 듯한’....국힘 이정현 야상 점퍼 ‘시끌’

내란 특검 “홧김에 계엄, 가능한 일인가”…지귀연 재판부 판단 ‘수용 불가’
![지귀연 ‘무죄 판결문’ 썼다 고친 흔적, 변심한 계기는? [논썰] 지귀연 ‘무죄 판결문’ 썼다 고친 흔적, 변심한 계기는? [논썰]](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6/0220/20260220502864.jpg)
지귀연 ‘무죄 판결문’ 썼다 고친 흔적, 변심한 계기는? [논썰]
![[단독] 군 특수본, ‘선관위 장악 지시하달’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 기소 [단독] 군 특수본, ‘선관위 장악 지시하달’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 기소](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22/53_17717357343273_20260222501198.jpg)
[단독] 군 특수본, ‘선관위 장악 지시하달’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 기소

아내 이어 남편도 ‘금메달’…같은 종목서 나란히 1위 진풍경

‘2관왕’ 김길리, ‘설상 종목 첫 금’ 최가온 제치고 한국 선수단 MVP 올라
![“저긴 천국이네”…집에서 삶 마감 가능한 일본 시스템 [.txt] “저긴 천국이네”…집에서 삶 마감 가능한 일본 시스템 [.txt]](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6/0212/20260212504997.jpg)
“저긴 천국이네”…집에서 삶 마감 가능한 일본 시스템 [.tx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