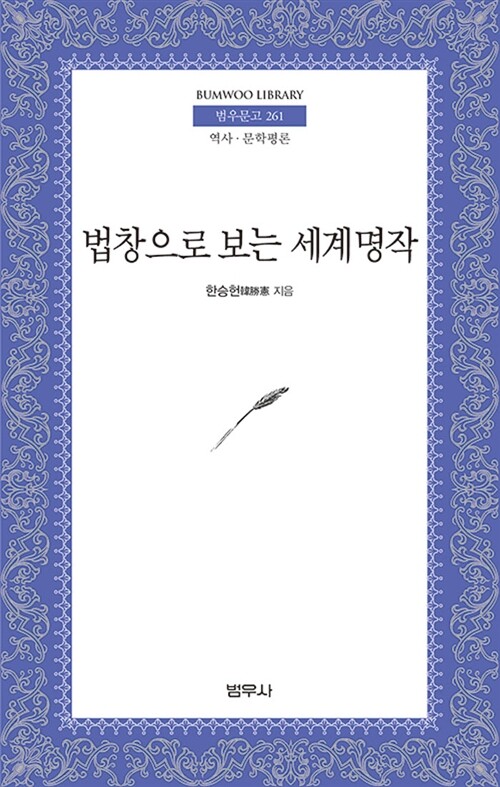
<법창으로 보는 세계명작> 한승헌 지음, 범우사 펴냄, 2008년
한승헌 변호사의 글 열두 편이다. 검사를 그만두고 변호사 사무소를 여니 신상이 자유로워져 법률 월간지 <법정>에 1년 동안 연재했단다. 이를 2006년 <책과 인생>이란 잡지에 재록하고 범우사에서 문고판을 낸 것이다. 처음 원고는 1966년쯤이고 2008년 범우문고 261번째 책이 되었다. 단명이었을 원고가 40년 지나 다시 나왔으니, 선생님께는 마음의 부담이었다지만 후학에겐 행운이다.
무엇을 읽고 싶은지 알 수 없을 때, 생활이 맴돌고 있다고 느낄 때, 내가 읽는 책이 고만고만하다고 느낄 때는 문고본 작은 책을 여러 권 산다. 커피 한 잔 값에도 못 미치는 돈으로 낯선 제목, 들어보지 못한 저자의 정신으로 들어가는데 세상이 열리기도 하고 전혀 관심 없던 분야에 독서가 이어지기도 한다.
<법창으로 보는 세계명작>은 같은 책 달리 읽기인 셈이다. 법률가의 작품 해석인데 내가 의사라는 직업 때문에 책의 질병 부분을 도드라지게 느끼듯이 법률가로서 인간의 죄와 형벌, 법의 집행과 영향에 대한 사색이 많다.
글은 작가 의도, 본문 소개, 법률가로서 해석으로 이어진다. 빅토르 위고의 <사형수 최후의 날>에선 사형이라는 ‘합법 살인’에의 항변이, 간결한 문체를 위해 나폴레옹 법전을 열심히 읽었다는 스탕달의 <적과 흑>에선 시대 반항아의 최후진술이 인용된다. 너새니얼 호손의 <주홍글씨>에선 주인공의 묵비와 통상의 재판이나 형벌로는 도저히 다가갈 수 없는 죄의식을 언급하고 국가나 사회가 개인에게 내리는 형벌은 경고의 효험은 있을지언정 수형자 개선, 교화 면에선 거의 무의미한 사례가 허다함을 토로한다.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은 심오한 형사정책서다. 가난과 범죄, 박해에 허덕이는 사람들, 형벌의 목적이나 효과 그리고 행려자의 갱생과 보호 문제에 대한 통찰을 요구한다. 헨리크 입센의 <인형의 집>에서 노라는 남성이 만든 법률과 부조리한 법률에 대한 의문이며, 알베르 카뮈의 <이방인>에선 비범하게 정직한 주인공의 죽음에서 법정의 사회통념이나 상식에 영합하는 말에는 정상참작과 신빙성을 후하게 주면서, 재판관이나 상식의 기대에 어긋나는 언동은 악성의 발현으로 보는 타성은 바로잡혀야 한다고 말한다.
많은 사람이 법의 정의를 믿고 법의 판단을 존중한다. 그러나 법과 관련된 사람들이 타성과 통념과 주관에 흔들리고 그 흔들림마저 모르게 되기도 한다. 열두 편의 글이 여전히 의미 있는 이유다. 짧은 몇 편이 명작과 어울려 오랫동안 향기롭다.
문고본 책을 알고 있으니 내가 서점을 다닌 시간도 제법이다. 삼중당 문고, 을유문고, 범우문고, 정음사. 1980년대 전북 전주에서 가장 큰 서점이던 ‘홍지서림’의 돌돌이 책꽂이를 가득 채우고 있던 문고본을 보면 부러웠다. 서점 딸이면 정말 좋을 텐데. 두껍고 무거운 책이 아니라 작고 가벼워서 금방 읽을 수 있을 듯, 어렵지 않을 듯, 그래서 쉽게 살 수 있었다. 문고본의 의미는 한 방울의 물로 시작하는 바위틈 만들기, 책은 작아도 그 내용은 작지 않음이다.
최영화 아주대 감염내과 교수·<감염된 독서> 저자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동사무소 직원 ‘점 하나’ 실수로 남동생이 남이 되었다

이 대통령 “농지매각 명령이 공산당? ‘경자유전’ 이승만도 빨갱이냐”
룰라 ‘여보, 새끼손가락 없는 맞춤장갑 좀 봐요’…뭉클한 디테일 의전

정청래 “장동혁, 고향 발전 반대하나…충남·대전 통합 훼방 심판받을 것”

스케이트 날이 휘면 다시 펴서…아픈 누나 곁 엄마에게 메달 안긴 아이

전한길, 반말로 “오세훈 니 좌파냐?”…윤어게인 콘서트 장소 제공 압박
![법원장님 들어가십니다 [그림판] 법원장님 들어가십니다 [그림판]](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6/0224/20260224503791.jpg)
법원장님 들어가십니다 [그림판]

“누가 반대했나 밝혀라”…통합안 보류에 국힘 TK 의원-지도부 충돌

‘800만원 샤넬백’…받은 김건희는 무죄, 전달한 전성배는 왜 유죄일까

‘계엄군 총구’ 안귀령 고발한 전한길·김현태…“탈취 시도” 억지 주장








![[독서방역본부] 코로나에 필요한 ‘호기심을 위한 과학’](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0/1120/53_16058822768278_7216058822655123.jpg)


![[독서방역본부] 눈물이 나지만 길게 울지 않으리](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0/0911/53_15998235912196_2215998235804597.jpg)
![[독서방역본부] ‘불임 이유서’ 시대의, 전위 시인](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0/0809/53_15969720811615_8415969720690927.jpg)
![[독서방역본부] 스승이시여, 510쪽이 다 흐뭇합니다](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0/0719/53_15951663933002_8915951663710959.jpg)
![[독서방역본부] 의료진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0/0626/53_15931542210764_141593154190485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