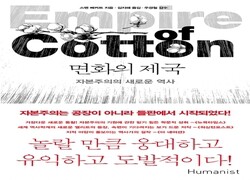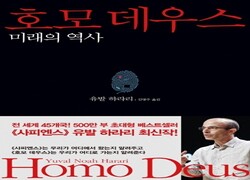<죽은 자들의 도시를 위한 교향곡> M. T. 앤더슨 지음 장호연 옮김 돌베개 펴냄 2만2천원 546쪽
오늘 당장 죽을지도 모르는데 음악이 소용 있을까. 생존과 실용, 가성비를 따지지 않고 예술을 곁에 둘 필요가 있을까. 전쟁 중에 (혼자 부를 수 있는 악곡도 아닌) 교향곡을 작곡하고 추위와 굶주림에 지친 시민들 앞에서 그 곡을 연주한다는 게,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 예술과 삶에 대한 이야기. M. T. 앤더슨의 은 러시아 작곡가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의 삶과 교향곡 7번의 탄생에 얽힌 이야기를 담았다.
1941년 히틀러의 나치는 레닌그라드를 포위했다. 100만여 명이 도시에 갇혀 바깥 세계로부터 거의 완전히 차단됐다. 겨울 동안 그들은 전기도 수돗물도 음식도 장작도 없이, 무엇보다 희망이 없이 지냈다. 사람들은 먹을 수 있는 주검을 찾아다녔다. 한 비밀 지령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온다. “총통은 레닌그라드를 세계 지도에서 지워버리기로 결정했다. 소비에트 러시아의 패배 이후 이 거대한 인구 거점이 존재하는 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 2년6개월 동안 죽은 시민은 10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이 와중에 교향곡을 만들고 듣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는 완독을 목표로 독서를 시작하지 않는다. 대체로 끝까지 읽기는 하지만, 읽다 지겨우면 언제든 그만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해야 (두꺼운 책도 어려운 책도) 마음 편하게 독서를 시작하게 되니까. 하지만 가끔은 완독을 ‘각오’하고 시작한다. 전기를 읽을 때 그렇다. 내가 흥미 있는 쪽은 (자서전이 아닌) 죽은 지 적어도 30년은 지난 사람에 대해 쓴 전기 쪽이다. 당사자가 글에 개입할 수 없고, 그가 살아생전에 발표했던 작품이나 삶이 흥미를 끄는지 시간이 어느 정도 입증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자기가 쓴다 해도 사실 자체는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제3자가 ‘죽음’을 포함해 재구성하는 서사 쪽을 ‘이야기’로 선호하는 듯하다. 무엇보다 자서전에 없지만 전기에 있는 게 하나 있다. 그것은 죽음이다. 죽은 사람의 삶은 살아 있을 때와 다른 방식으로 죽음을 기점으로 재구성된다. 쇼스타코비치는 자신의 삶을 회상록()으로 엮어냈지만, 그의 삶은 해명 혹은 변명이 필요한 부분이 많아도 너무 많았다. 나치뿐 아니라 소비에트 독재도 그를 괴롭게 했다. 1936년 오페라 을 본 스탈린이 ‘음악은 없고 혼란뿐’이라는 혹평을 하자, 국보급 예술가는 숙청의 공포 아래 놓이게 된다. 많은 예술가가 스탈린 치하의 조국을 떠나 서방세계로 망명하고 있었다. ‘레닌그라드’라는 이름이 붙은 쇼스타코비치의 일곱 번째 교향곡은 그의 조국애(혹은 스탈린에 대한 충성)를 입증하는 예술 작품이었고, 또한 포위전으로 죽음과 삶을 오가며 살던 이들이 받은 유일한 ‘생존에는 불필요한 아름다운 것’, 사치였다.
나는 전기만큼은 언제나 완독을 목표로 읽는다. 전기는 대체로 두껍다. 전기는 삶을 ‘짧게, 읽기 쉽게’ 다루지 않는다. 나도 그에 걸맞은 시간을 들인다. 자기 전에 조금씩. 삶에 대해서도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하기 좋은 시간이다. 좋을 때와 나쁠 때, 사람이 겪는 모든 일이 그 안에 들어 있고, 모두 죽음으로만 이야기를 맺는다. 그래, 죽음을 읽기 위해 전기를 읽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니 나 역시 정중한 마침표를 선사해야 하는 것 아닐까. 완독이라는.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이준석-전한길 ‘끝장토론’…“25년간 극비로 부정선거 구축” 황당 주장

총 쏘는 김주애 사진 공개…김정은 소총 선물 받은 김여정

이 대통령 “개 눈에는 뭐만”…‘분당 아파트 시세차익 25억’ 기사 직격

트럼프 “이란 관련 큰 결정 내려야”…“가끔은 군 활용해야” 언급도

민주 “응답하라 장동혁”…‘대통령 집 팔면 팔겠다’ 약속 이행 촉구

송언석, 천영식 8표차 부결에 “당 의원 일부 표결 참여 못해, 사과”

동사무소 직원 ‘점 하나’ 실수로 남동생이 남이 되었다
![한밤중 다리에 쥐나는 ‘하지정맥류’…“자연 회복 불가능, 빨리 치료” [건강한겨레] 한밤중 다리에 쥐나는 ‘하지정맥류’…“자연 회복 불가능, 빨리 치료” [건강한겨레]](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27/53_17721570592077_20260227501013.jpg)
한밤중 다리에 쥐나는 ‘하지정맥류’…“자연 회복 불가능, 빨리 치료” [건강한겨레]

“26만명 온대” BTS 파워…광화문 공연 날 경복궁도 문 닫는다

이진숙 “한동훈씨, 대구에 당신 설 자리 없다” 직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