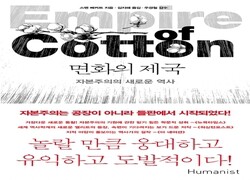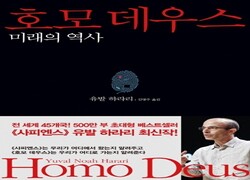<중국정치사상사> 류쩌화 지음 장현근 옮김 글항아리 펴냄 3권 세트 15만원 4052쪽
새해 벽두부터 벽돌을 구웠다. 선진시대부터 청대까지를 통괄해 다룬 . 1권이 1320쪽, 2권이 1208쪽, 3권이 1524쪽으로 모두 4052쪽이다. 지난 10여 년 벽돌을 구워봤지만 이렇게 힘겨운 벽돌은 처음이었다. 교정지를 열 번 뽑았는데 사무실 천장에 닿을 정도고, 별도의 인력을 채용해 2년간 진행했다. 다행히 역자이신 장현근 선생님이 20년 동안 매만진 번역이라 비교적 수월하게 작업할 수 있었다. 모르긴 몰라도 분량이나 내용 면(고문(古文)이 많다)에서 그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번역 업적이 아닐까 싶다. 존경의 염을 품고 책 작업을 진행해 인쇄를 넘기기 전 책등을 세워보니 그 넓이가 신국판 단행본 높이와 같았다.
4052쪽이면 400쪽으로 끊어 10권이나 800쪽으로 끊어 5권으로 낼 수도 있는데 왜 한 손에 들기도 힘들게 3권으로 냈을까. 책은 아무 데서나 끊을 수 있는 게 아닌지라 이 책 또한 선진시대, 진한과 위진남북조, 수당에서 청대까지 세 부문으로 끊어서 묶었다. 권으로 따져서 제3권의 1524쪽은 글항아리 자체 기록을 깬 수치다. 그전의 최대 기록은 1416쪽의 (피터 왓슨)였다. 기록은 깨라고 있는 거지만 더는 깨고 싶지 않다. 책 만드는 육체노동이 너무 고돼서다.
그런데도 왜 벽돌을 끊지 못하나. 그만큼 치명적 매력이 있기 때문이다. 일단 책의 물성이 강하게 느껴진다. 크기도 크지만, 여러 겹의 지식이 쌓여 하나의 세계를 이루는 지적 누적성이 주는 감탄스러운 쾌감이 있다. 게다가 책을 냈을 때 주목도가 높다. 일단 외형이 ‘먹어주니까’ 언론 리뷰에서도 크게 많이 다뤄지기에 유리하다. 서점에 전시해놓아도 돋보인다. 지난 10년을 돌아볼 때 이런 면에서 압권은 2008년 뿌리와이파리에서 내놓은 (제프 일리)였다. 정말 무수히 많은 책들 중에서 불쑥 솟아올라 책 한 권이 군계일학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음을 알았다.
이런 벽돌책을 만들며 고려할 사항이 있다. 정말 기술적인 문제인데 번역하면 분량이 늘어난다는 점이다. 벽돌이 주로 번역서라는 건 우리 모두 인정하는 바다. 영어책 300쪽짜리는 우리 책 500쪽이고, 800쪽짜리는 1300쪽이라 보면 맞다. 한글엔 알파벳에 없는 받침이 있다. 생김새가 정사각형이라 따닥따닥 붙여놓으면 숨이 막힌다. 글자를 줄일 수 없으니 여백을 줄 수밖에 없다. 반면 영어는 받침도 없고 알파벳마다 높이가 달라서 촘촘하게 편집해도 보기에 좋고 답답하지 않다. 중국어도 한글로 옮기면 양이 늘어난다. 한글과 같은 사각형 운명이긴 해도 축약적 언어인지라 풀어헤쳐야 의미가 통한다. 백화문(구어체로 쓴 중국 글)은 그나마 나은데 고문(古文)은 물에 불린 미역처럼 늘어난다.
게다가 번역서엔 ‘역주’나 ‘해제’ 등 원서에는 없는 새로운 장치가 들어간다. 극단적일 경우 배꼽이 더 커지는 사태도 일어난다. 지난해 10월에 나온 (마이클 하워드 지음, 안두환 옮김)은 원서가 160쪽인데 번역본은 480쪽으로 불어났다.
물론 이런 기술적 환경이 벽돌의 전부는 아닐 것이다. 나는 벽돌책을 만들면서 독자에게 집을 지어주는 기분을 느낄 때가 있다. 반면 얇은 에세이류는 맛있는 음식을 담아낸 접시 같다. 이왕이면 튼튼한 집에서 맛있는 밥을 먹는 게 좋겠지. 그래서 나는 오늘도 벽돌을 굽고 접시를 돌린다.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직 사의…사법 3법 추진에 반발

일본, 이제 ‘세계 5대 수출국’ 아니다…한국·이탈리아에 밀려나

러시아 “돈바스 내놓고 나토 나가”…선 넘는 요구에 우크라전 종전협상 ‘난망’

‘재판소원 육탄방어’ 조희대 대법원…양승태 사법농단 문건 ‘계획’ 따랐나

홍준표, 이 대통령 부동산 정책 맞장구…“부동산 돈 증시로 가면 코스피 올라”

박정훈, ‘항명’ 기소 군검사 재판서 “권력의 사냥개들” 비판

정청래 “사법 3법 곧 마무리…조희대, 거취 고민할 때”
![왜 부자는 수돗물을 마시고 가난한 사람이 병생수 마실까 [.txt] 왜 부자는 수돗물을 마시고 가난한 사람이 병생수 마실까 [.txt]](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27/53_17721459993113_20260226504293.jpg)
왜 부자는 수돗물을 마시고 가난한 사람이 병생수 마실까 [.txt]

‘경찰 출석’ 전한길 “수갑 차고서라도 이준석 토론회 간다”

임은정, ‘한명숙 사건’ 소환해 백해룡 저격…“세관마약 수사, 검찰과 다를 바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