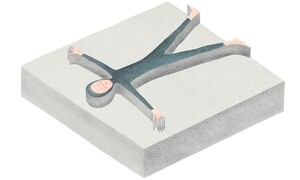일러스트레이션 조승연
2년 전 봄, 선운산에 산벚꽃이 희끗희끗 피었다. 연녹색 아우성에 어질어질한 시절이었다. 그 산길을 올랐다. 머리는 떡이 됐다. 계절에 맞지 않는 오리털 잠바를 벗어 질질 끌었다. 왜 떠났을까. 왜 변했을까. 평생이란 약속은 어디로 갔나. 비련을 혼자 짊어진 척하는데 남 보기엔 가요 메들리를 읊고 있다. 허망하고 그립고 밉고 그래서 바위에 철퍼덕 앉아 울었는데 남 보기엔 추태였지 싶다. 인생이란, 사랑이란, 이런 밑도 끝도 없는 질문을 되돌려 감기하며 제 설움에 매혹돼갈 즈음에, 진달래 흐드러진 산길에서 신호가 왔다. 똥이 마려웠다. 강렬하게.
항문의 아우성에 인생이고 사랑이고 이별이고 싹 들어갔다. 다리를 꼬며 산을 내려왔다. 손바닥에 밴 땀이 차가웠다. 온통 한 생각뿐이었다. 등산객들이 있다. 여기서 똥을 눌 수는 없다. 조금만 더 가면 화장실이다. 평생 기다리다 만난 연인의 품에 안기듯 변기에 앉았을 때, 강 같은 안도와 평안이 찾아왔다. 긴장했던 근육이 노글노글해지는 몸의 감각만 남았다. 쾌변의 힘은 강했다.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과거로 회귀하며 고문해대던 생각에 제동이 걸렸다. 잠깐 자유로웠다. 바지 올리자 또 레퍼토리 시작이다. 왜 떠났나, 왜 변했나.
이번 추석 연휴가 시작될 즈음, 내 친구이자, 한때 시아버지였던 한스(83)가 숨졌다. 한 시간여 동안 이어진 독일식 장례식에서 목사는 참석한 가족과 친구들 60여 명을 울리고야 말겠다고 작정한 것 같았다. 전쟁 난민으로 피란 와 기차 검표원, 목수, 공장 경리로 일하며 두 아들을 키운 한스의 인생을 훑더니 기어이 추억을 한 올씩 끄집어낸다. 손주들을 보며 “한스가 곰돌이 인형을 직접 만들어줬지?” 6살 막내도 울어젖혔다. 앞니가 빠진 게 보였다. 55년을 같이 산 부인 크리스텔(82)에게 “충실한 남편이었죠. 같이 집을 지었어요. 놀이 질 때는 둘이 로미캅 게임을 했죠.” 크리스텔이 휴지로 눈을 가렸다. 날 보며 “크리스마스에 과자를 함께 구웠어요. 라틴댄스 스텝을 한스가 가르쳐줬죠.” 콧물이 줄줄 났다. 떠난 이의 온기가 가을, 서늘한 교회 안에 찼다. 이 구절을 봉독했다. “모든 것에는 시간이 있지. 태어나는 시간, 죽는 시간, 식물이 피고 지는 시간, 우는 시간, 웃는 시간, 춤의 시간, 다툼의 시간, 사랑의 시간, 미움의 시간… 그는 이 모든 시간을 잘 치렀습니다. 그의 심장엔 이제 영원이 내려앉았습니다. 시작과 끝, 인간이 정할 수 없는 것, 신이 주관하는 것.”
그날 오후, 혈관이 터져 오른쪽이 토끼 눈이 된 크리스텔은 소파에 앉아 있다. 가는귀가 살짝 먹은 91살 큰언니한테 전화가 왔다. 크리스텔은 집 안이 떠나가라 사촌이 왔다 갔다고 설명했다. 한참 이야기했다. 큰언니가 말했다. “사촌은 왔어?” “아, 언니! 아까 왔다 갔다고 이야기했잖아!” 큰언니는 어리둥절했다. “그랬냐?” 복장 터지느라 크리스텔은 정신없었다. 그 순간만큼은 그를 칭칭 동여맸던 상실감이 느슨해졌다. 전화를 끊고 눈물은 다시 스콜처럼 왔다 가고 왔다 갔다. 그 사이사이 크리스텔은 6살 손자가 빠진 이 사이로 혀를 내미는 걸 보고, 마시다 엎지른 콜라를 닦고, 눈에 안약을 넣고, 밥을 먹고, 똥을 눴다. 순간의 힘에 실려 하루가 또 갔다.
인간이 시작과 끝, 직선으로 이어진 시간을 발명해 다스리려 했다면, 신은 영원한 순간들을 선물했는지 모르겠다. “사랑은 집이다. …이제 그의 집은 어디에도 없다.” 얀 마텔의 은 집을 잃은 사람들의 기나긴 귀향기다. 3부로 이뤄진 이 소설의 마지막 주인공, 피터 토비는 부인을 잃었다. 캐나다 상원의원인 그의 삶은 바짝 말랐다. 표정은 비었다. 구멍은 채워지지 않는다. 그때 침팬지 오도를 만난다. “진솔하게, 열린 문 같은 눈으로 봐주는” 존재다. 공감과 경외를 불러일으키는 동물이다. 토비는 연구소에 갇혀 있는 오도를 데리고 자기 조상의 고향이지만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포르투갈의 높은 산으로 향한다. 시계가 필요 없는 곳이다. 새와 매미, 흙이 새벽과 황혼을 알려준다.
침팬지 오도는 “시간을 호흡하며 현재의 순간을 사는 존재다.” 그곳에서 피터는 오도를 닮아간다.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난 오도 옆에 앉아서 그가 매분, 매시간으로 엮인 담요를 짜는 것을 지켜보지. …오도는 바로 그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 마치 흘러가는 강물을 지켜보는 사람과 비슷하다. (피터는) 시간이라는 경주에서 족쇄를 풀고 시간 자체를 음미하는 법을 배웠다.” 오도의 동작은 자연스럽고 정확하다. 순수하게 동작에 몰입할 뿐이다. 과거와 미래에 매몰되지 않는 순간의 바다에 떠 피터와 오도는 서로 털을 다듬어준다. 피터는 아내를 잊지 못하지만, 더 이상 슬픔 주위를 배회하지 않고 그가 아내를 사랑한다는 “단순한 사실에 초점을 맞춘다.” 순간의 바다에는 시작도 끝도 없고 그곳으로 피터를 인도한 침팬지 오도는 죽음과 상실의 감옥에서 피터를 구원하는 신이다. 오도의 품에 안긴 피터는 “무(無)에서 태어난 듯한 기분을 느낀다. 그는 개인적인 존재, 고유한 존재, 올라오라고 요청받은 존재다.”
크리스텔의 빨간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흐른다. 다이어리를 쓰는 중이었다. 매일 점심때 뭘 먹었는지, 한스와 벌인 로미캅 게임 승부를 적어놓은 일기장이다. 한스가 살아 있던 어느 날, 점심, 삶은 감자, 치즈 스프레드와 빵. 한스 로미캅 승. 텅 빈 한스의 의자가 크리스텔을 할퀸다.
집이 사라졌다. 그가 떠난 지 2년이 지나고도 나는 그 빈터를 맴돈다. 상실의 감각이 손톱을 바짝 세운다. 그럴 때면 니나 시몬의 (Ain’t Got No, I Got Life)를 듣는다. “집 없어. 돈 없어. 치마 없어. 스웨터 없어. 향수 없어, 엄마 없어, 아빠 없어… 뭐가 있지? 머리카락이 있어. 코가 있어. 눈이 있어. 발톱이 있어. 입술이 있어. 간이 있어. 내 자신이 있어. 삶이 있어.” 통증은 왔다 가고 왔다 가고 왔다 가고, 산벚꽃은 피고 지고 피고 지고, 우리는 아직 여기 살아 있다. 크리스텔과 내게 그 순간들을 그저 바라볼 수 있는 은총이 내리길. 그 은총 속에서 부디 ‘부재’가 아니라 ‘사랑한다’는 단순한 사실에 집중할 수 있기를.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이 대통령, 미군 무기 이란전 반출에 “반대의견 내지만 관철 어려워”

“초가삼간 태울 건가”…대통령 ‘자제령’에도 강경파는 ‘반발’

“김정은 ‘두 국가’ 선언은 생존전략…전쟁 위험 극적으로 줄었다”

윤석열 “출마하시라 나가서 싸우라”…선고 다음날 ‘내란 재판 변호인’ 독려

곽상도 아들 ‘화천대유 50억’ 처분 길 열렸다…법원, 계좌 동결 해제

‘국힘 당원’ 전한길 “황교안 보선 나왔으니 국힘은 후보 내지 마”

트럼프 “전쟁, 며칠 안에 끝날 수도…그들이 가진 모든 것 사라져”

‘초교 공격 우리 아냐’ 트럼프의 거짓말…“사용된 미사일 이란은 못 사”

‘폐 이식’ 유열 “제 몸 속에 숨쉬는 기증자 폐로 아름다운 노래할 것”

지지율 ‘바닥’·오세훈 ‘반기’…버티던 장동혁 결국 ‘절윤’ 공식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