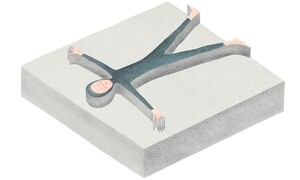일러스트레이션/ 조승연
오래 그런 줄 알았다. ‘나는 성폭력이나 성차별을 경험한 적이 없지.’ 나 자신도 속여왔다는 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1심 판결을 보고 알았다. 아예 기억을 도려내버리고 싶었는지 모른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대학을 막 졸업하고 몇 달, 지금은 사라진 환경단체에서 일했다. 40대 대표는 커피를 물처럼 마셨다. 손님도 많았다. 대표는 지구를 살리고 나는 그가 더 또렷한 정신으로 일할 수 있도록 커피를 탔다. 군소리 없이 생글생글 웃기도 잘했다. 대표는 칭찬을 많이 해줬다. 그럴수록 더 입맛에 맞는 커피로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 같았다. 칭찬이 비난보다 더 지독한 통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다.
회식 날, 대표, 사무처장, 남자 직원과 나 넷이 춤을 추러 갔다. 콜라텍 같은 분위기였다. 술은 이미 몇 순배 돌았다. 어쩌다보니 대표랑 나랑 둘이 블루스를 추고 있다. 대표 손이 내 등을 더듬더니 브래지어 끈을 만지작거렸다. 나는 노래가 끝날 때까지 꿈쩍할 수 없었다. 테이블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게 아주 바들바들 떠네.” 자리에 앉아 나는 평상시 모습 그대로 똑같이 개그 치고 안주를 먹었다. 그다음 날 출근해 커피를 탔다. 그리고 지금까지 20년 동안 누구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나 자신에게도 언급하지 않았다. 자괴감을 피하고 싶었던 거 같다. 하지만 여전히 “이게”라는 그 한 글자 한 글자, 그때 그 목소리까지 오늘처럼 기억한다.
친구는 대기업에 다녔다. 그날은 친구 회사가 큰 계약을 마무리한 날이었다. 뒤풀이 장소엔 친구 회사와 상대 회사에서 각각 다섯 명씩만 참석했다. 사장, 부사장, 팀장 그리고 5년차 대리인 친구였다. 팀장은 당일 친구에게 통보했다. “저쪽에서도 여사원 나온다니 회식에 참석하라.”
뒤풀이 장소는 고급 일식집이었다. 연대니 고대니 동문이니 어쩌니 술이 돌았다. 얼굴이 불콰해진 사장이 친구한테 저쪽 회사 사장 옆에 앉으라고 했다. 대리 따위와는 그전에 말도 섞은 적 없는 ‘사장님’이었다. 어느 참에 그쪽 회사 여사원은 친구 회사 사장 옆에 ‘앉혀 있었다’. 친구는 그렇게 했다. 러브샷을 하자고 누군가 분위기를 띄웠다. 상대 회사 사장은 한쪽 팔을 친구 목 뒤로 돌려 포옹하는 자세를 취했다. 친구도 그렇게 했다. 술을 마시는 동안 그 사장의 손이 블라우스 속으로 들어왔다. 친구는 꼼짝하지 못했다. 상대 회사 여사원이 나섰다. “저랑 자리 바꿔요.” 그때까지 그 사장의 손은 블라우스 속에 있었다. 친구는 제자리로 돌아왔다. “그때 우리 팀장은 개다리춤을 추고 있었지. 그 춤을 평생 못 잊을 거야.”
2차로 자리를 옮기는 중에 친구에게 택시 타고 집에 가라고 귀띔한 사람은 상대 회사 여사원이었다. 친구는 그날 밤새 울며 고민하다 다음날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는 “사회생활 하다보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그 말이 절망스럽더라고. 문제제기를 한다면 어땠을까? 그 손이 내 옷 속에 들어가는 걸 본 사람이 있을까? 봤다고 누가 증언해줄까? 왜 러브샷을 했냐고, 너도 좋아서 한 거 아니냐고 하지 않을까? 내가 너무 사소한 일로 분란을 일으키는 건 아닐까? 성폭행을 당한 것도 아닌데 이런 일로 문제를 일으켜도 될까?” 그 콜라텍에서 나도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다. ‘브래지어 끈 만진 것뿐인데, 이런 일로 정색하면 관계가 어색해질 텐데, 나한테 잘해주는 대표인데, 원래는 좋은 사람인데.’
그 ‘사소한 일’에 아무 말도 못했던 나를 20년 동안 용서하지 못했다. 우리가 스스로 했던 그 생각들은 누구의 목소리였을까? 왜 ‘그들’의 언어를 기준으로 자신을 의심했을까? 네 감정이 정말 ‘객관적’으로 발언해도 될 만한 것일까? 그 ‘객관’의 언어는 누가 정하는 걸까? 왜 익숙한 폭력은 응당 견뎌야만 하는 폭력으로 여겨질까? 위력의 행사? 피해자인 내가 가해자인 그를 스스로 변호할 정도로, 피해자인 내 친구가 가해자 앞에서 입도 뻥끗할 수 없었을 정도로, 자신이 인간이 아닌 살덩어리로 다뤄지는 모멸을 느끼면서도 ‘사소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스스로 기만하고 자괴감을 짊어질 정도로, 우리는 위력이 행사되는 공간에 산다. 왜 어떤 말은 더 믿기 쉬운가? 익숙한 것은 더 믿기 쉽다. 익숙한 것 뒤에는 침묵당한 목소리가 있다.
안희정 전 지사 1심 판결을 보니,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왜 새벽에 담배를 사다 문고리에 걸어두지 않고 방 안으로 들어갔는지” 묻는다. 왜 더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는지 묻는다. 이 모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피해자가 새벽에 담배 심부름을 거부할 수 있었다면, 문고리에 걸어두고 “가져가시라” 문자를 보낼 수 있었다면, 싫은 걸 싫다고 말할 수 있었다면, “위력이 행사”되는 관계가 아니라는 증거일 수 있겠다. 위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굳이 협박할 필요가 없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위력은 있지만 평상시에 위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는데, 새벽에 담배·맥주 심부름까지 문자로 그것도 한 단어로 시키고, 상대는 바로 대령하는 상황이 위력 행사가 아니라면 애정의 행사로 보이는가? 어떻게 해야 위력을 행사하는 것일까? 왜 위력에 이토록 관대할까? ‘당연히’ 하는 일이기에 위력 행사가 아닌 게 아니라, 위력의 ‘당연한’ 행사 아닌가.
지난 8월25일 ‘헌법 앞 성평등’이 주최하는 ‘그들만의 헌법’ 집회에 갔다. 환장하게 덥던 여름이 언제인가 싶게 초가을 바람이 불었다.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시위대엔 남자도 여자도 있었다. 나는 시위대 사이에 끼지 못하고 1m쯤 떨어진 계단에 웅크리고 앉아 구호를 기어드는 목소리로 따라 했다. 그들의 당당함이 눈부셨다. “‘피해자 따위’는 아니야”라고 나를 속였던 내가 부끄러웠다.
자괴감은 이제 그만 됐다. 어쩌면 상처받은 사람은 축복받은 자다. 상처는 새로운 시각을, 타인을 향한 문을 열어준다.
“반대로 억압받는 자의 시각에서 기존 사회를 보면, 이들의 타자성은 새로운 사회에 대한 상상력과 지성을 가능하게 하는 자원이 된다.”(정희진, ) 또 “사람들은 모두 편견의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편견을 이해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할지 알게 된다.”(앤드루 솔로몬, ) 그 노을에 반짝이는 상처와 분노를 보고 있자니, “이제 여자들이랑은 같이 일 못하겠네”라고 말하는 사람이, 일을 할 수 없는 세상이 올 것 같다.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흔들리는 부산 “나라 말아먹은 보수가 보수냐…그런데, 뚜껑은 열어봐야”
![[단독] ‘쿠팡 가만 안 둬’ 스코틀랜드 3위 연기금, 총대 메고 소송 전면전 [단독] ‘쿠팡 가만 안 둬’ 스코틀랜드 3위 연기금, 총대 메고 소송 전면전](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5/1217/53_17659590361938_241707891273117.jpg)
[단독] ‘쿠팡 가만 안 둬’ 스코틀랜드 3위 연기금, 총대 메고 소송 전면전

김성태 “검찰 더러운 XX들…이재명, 말도 안 되는 것들에 엮여”

“키 206cm 트럼프 아들을 군대로!”…분노한 미국 민심
![이 대통령 지지율 65% 또 최고치…경제·부동산 긍정 평가 [갤럽] 이 대통령 지지율 65% 또 최고치…경제·부동산 긍정 평가 [갤럽]](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06/53_17727600161918_20260306500848.jpg)
이 대통령 지지율 65% 또 최고치…경제·부동산 긍정 평가 [갤럽]

‘이란 정권교체’ 노골적인 트럼프 “지도자 선정 관여하겠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식으로 국민을 속이나 [박용현 칼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식으로 국민을 속이나 [박용현 칼럼]](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04/53_17726118413306_20260304503108.jpg)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식으로 국민을 속이나 [박용현 칼럼]

이 대통령, 정유업계 정조준…“기름값 조작은 중대범죄, 대가 치를 것”

법원, 배현진 ‘당원권 1년 박탈’ 징계 효력정지

전한길판 ‘윤 어게인’ 신당 나오나…“작년엔 윤석열이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