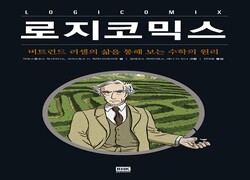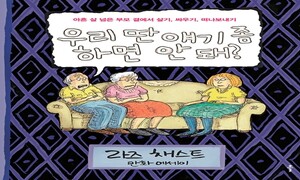사라 레빗의 어머니 미리암은 1998년 치매 판정을 받았다. 치매는 52살의 쾌활하고 아름다운 여인을 서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잠식했다. 그녀의 언어와 지각 능력은 시들어갔고, 사랑했던 모든 것들의 의미가 점차 하얗게 가리어졌다. 급기야 가족조차 알아보지 못하게 됐으며, 자기 자신마저 잃어버렸다.
가족 가운데 환자가 있다는 것은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이다. 그것을 감당하기에 우리 마음은 충분히 강하지 못할 때가 많다. 아픈 가족을 보는 것만으로 영혼이 천 갈래, 만 갈래 찢어지는 고통을 받는다. 그래서 위선적인 행동을 하곤 한다. 자신의 상처를 감추기 위해, 그리고 진심으로 하고 싶은 말을 삼키기 위해, 육체적 고단함을 핑계로 환자를 원망하기도 한다.
레빗의 가족도 마찬가지였다. 가족은 어머니를 정성껏 돌보지만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듯한 모습에서 깊은 상실감을 느꼈다. 그리고 상실감은 모두의 폐부로 스며들어 마음을 병들게 했다. 하지만 어느 날 레빗은 노트를 꺼내들었다. 그리고 어머니와 가족 모두에게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그녀와 가족에게 좋고, 또한 어머니와의 소중한 기억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다. 레빗은 아름다운 추억뿐만 아니라 괴로운 순간까지 고스란히 담았다. 틈틈이 어머니의 얼굴을 스케치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녀의 기록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6년이나 계속됐다. 이 여정을 통해 레빗은 자신의 정체성을 고찰하고, 자신과 어머니의 관계를 새로이 정비할 수 있었다.

(우리나비 펴냄)은 그때의 기록을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정리해 출간한 작품이다. 레빗은 이야기한다. “나는 아프기 이전 엄마의 모습과 투병 중일 때 엄마의 모습, 그리고 엄마의 달라진 모습과 끝까지 변치 않고 남아 있던 모습들을 기억하기 위해 이 책을 썼다.”
이 작품은 치매나 다른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의 가족들이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 병간호로 몸과 마음이 지친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등대가 되어줄 것이다. 또한 이 작품은 ‘가족 사랑’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자유롭고 귀여운 그림체와는 다르게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가슴이 난도질당하는 느낌을 받는다.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작품이지만 내 가족에 대한 후회와 반성으로 몸이 얼어붙는다. 당신은 이 작품을 읽고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만약 그렇다면 당신에게는 아직 충분한 시간이 있는 것이다.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이란, 카타르·쿠웨이트·UAE·바레인 미군기지·예루살렘에 미사일”

트럼프, 이란 국민에 “우리 작전 끝나면 정부 장악하라”

이스라엘, 이란 공격 시작…미국도 공격 참가

미·이스라엘 작전명 ‘장엄한 분노’…“이슬람 공화국 체제 붕괴 목표”

장동혁 “2억 오피스텔 보러도 안 와…누구처럼 똘똘한 한 채 아니라”

송언석, 천영식 8표차 부결에 “당 의원 일부 표결 참여 못해, 사과”

이 대통령 “개 눈에는 뭐만”…‘분당 아파트 시세차익 25억’ 기사 직격

트럼프의 공습 ‘이란 정권교체’ 가능할까…중동 장기광역전 우려
![한밤중 다리에 쥐나는 ‘하지정맥류’…“자연 회복 불가능, 빨리 치료” [건강한겨레] 한밤중 다리에 쥐나는 ‘하지정맥류’…“자연 회복 불가능, 빨리 치료” [건강한겨레]](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27/53_17721570592077_20260227501013.jpg)
한밤중 다리에 쥐나는 ‘하지정맥류’…“자연 회복 불가능, 빨리 치료” [건강한겨레]

대법관 ‘14명→26명’ 증원법 국회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