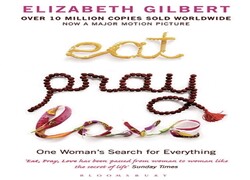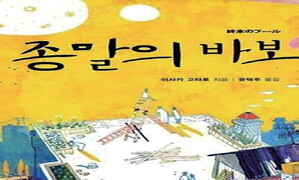1
심리학 전문지 의 칼린 플로라는 에서 우리는 저 사람과 친구가 될지 안 될지를 본능적으로 알아채며, 그것을 판단하는 데 불과 몇 분도 안 걸린다고 말한다. 취향이 비슷하니까, 자주 보니까, 같은 집단에 있으니까, 라는 이유로 친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다. 많은 연구자들이 말하길 사랑도 그렇다. 우리는 누구와 사랑에 빠질지 본능적으로 결정하며, 순식간에 예감한다. 그래서 달달함에 빠진 연인들이 즐겨 하는 일 중 하나가 ‘처음 만났던 때’를 곱씹고 또 곱씹으며 자신들의 운명론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사실 그 순간은 잠깐 스쳐간 아주 짧은 시간에 불과한데 말이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사랑의 시작만 예감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끝도 예감한다. 그리고 그 예감이 현실이 되면 끝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찾아낸다. 그 사람 성격에 문제가 있었으니까, 장거리 연애는 힘들었으니까, 집안의 반대가 심했으니까 등등. 그 이유의 대부분이 시작할 때도 이미 알고 있던 것이라는 게 확인되고 나면, 밀려오는 것은 쓸쓸함이다. 원래부터 통과할 수 없었던 시험에 응시한 기분이라고 할까.
는 끝날 것을 알면서도 시작하는 연인들을 위한 응원 같은 소설이다. 이미 수많은 베스트셀러를 쏟아낸 존 그린의 작품이며, 올해 개봉한 영화 의 원작이다. 이 소설은 말기암 환자인 16살 소녀 헤이즐과 골육종을 앓고 있는 17살 소년 어거스터스의 러브 스토리를 그린다. 이 작품은 흔히 접하는 ‘무늬만’ 불치병인 스토리와 완전히 다르다. 누군가의 죽음으로 끝날 것이 뻔한 이 사랑을 우리는 과연 시작할 수 있을까? 이 작품은 그런 상투적인 질문과 예상을 가볍게 뛰어넘는다. 연애를 할지 말지는 얼굴을 처음 마주한 순간 눈이 맞은 두 사람에게 이미 과거다. 심지어 어거스터스의 전 여자친구도 말기암 환자였고, 그녀는 이미 죽었다. 이들의 고민은 다른 데 있다. “난 그 애가 먼저 죽어서 내가 죽어가는 걸 모르게 하고 싶어요.” 어거스터스가 죽은 다음에 발견된 편지가 말해주듯, 그들은 상대방에게 사랑이 끝나가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고통을 느끼게 하고 싶지 않다는 소망만을 가지고 있다.
나아가 “이 세상을 살면서 상처를 받을지 안 받을지 선택할 수는 없지만, 누구로부터 상처를 받을지는 고를 수 있어요. 난 내 선택이 좋아요”라는 대사에 이르면, 예정된 슬픈 결말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이 이토록 생기롭게 전개될 수 있는 이유를 알게 된다. 예정된 것이라 해도 함께하는 동안에는 예감하지 않겠다는 저 씩씩한 자세라니. 살아 있는 모든 연인들에게 창피함과 동시에 용기를 일깨우지 않는가.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스케이트 날이 휘면 다시 펴서…아픈 누나 곁 엄마에게 메달 안긴 아이

전남·광주 행정통합법, 법사위 통과…충남·대전, 대구·경북은 보류

이 대통령 “다주택 자유지만 위험 못 피해…정부에 맞서지 마라”

설 곳 없는 전한길 ‘윤어게인’ 콘서트…킨텍스, 대관 취소

쌓여가는 닭고기, 못 받는 쿠팡 주문...‘배민온리’에 갇힌 처갓집 점주들

‘무기징역’ 윤석열 항소…“1심 모순된 판단, 역사에 문제점 남길 것”

“국힘, 봄 오는데 겨울잠 시작한 곰”…윤석열 안고 가도 조용한 의총

이 대통령 “담합 신고 포상금 몇백억 줘라…‘로또보다 낫다’ 하게”

‘사법개혁 3법’ 통과 앞…시민단체들 “법왜곡죄, 더 숙의해야”

동사무소 직원 ‘점 하나’ 실수로 남동생이 남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