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미국에서는 무식하다는 말을 할 때 누군가의 이름을 붙여 부르는 일이 많단다. 얼마나 멍청한 실수였는지 말하기 위해 배우 실베스터 스탤론의 이름을 따서 ‘원 스탤론’ ‘투 스탤론’ 하는 식이다. 마침 지방선거가 코앞인 한국에서도 모욕어 사전 페이지가 불어나고 있다. 하지만 후보자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일상적으로 쉽게 모욕당하고 모욕한다. 서로 은밀하게 공격하는 일을 막기 위해 모욕은 때때로 게임이 된다. 1960년대 미국 흑인들은 모여서 상대 가족들을 얼마나 잘 모욕하는지를 겨루는 ‘다즌스’라는 게임에 열중했다. 최근 미국 케이블채널
도대체 왜? 책은 인간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깊은 관심을 갖도록 진화해왔기 때문에 서열을 흔들거나 공고히 하기 위해 모욕이 동원된다고 설명한다. 상대의 분수를 깨우쳐주고 싶거나 자신이 상대보다 더 낫다는 걸 알리고 싶은 욕구 때문에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모욕한다. 누군가에게 모욕을 당하면 똑같은 모욕으로 되갚아주려 하거나 시기심에 떠밀려 누군가를 모욕하는 것도 자신의 사회관계나 서열에 불안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누군가 나를 모욕하면 그 사람이 우리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생각에 상처받게 된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상처는 커진다.
책은 우리가 가진 모욕의 무기고가 얼마나 방대하고 무시무시한지를 꼽은 뒤 방어력도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모욕적인 말을 재치 있게 되돌려주곤 하던 처칠처럼 메아리 전법을 쓸 수도 있고, 스스로 자신의 연설을 조롱하기 잘하던 클린턴처럼 자기 비하 전법을 쓸 수도 있다. 책에서 추천하는 방법은 모욕을 받았을 때 내적·외적으로 그 욕이 자신을 전혀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모욕 평화주의’다.
쉴 새 없이 서열 경기가 벌어지는 사회에서 요즘 우리는 비슷한 감정적 골짜기에 다다른 걸까? 얼마 전 나온 이라는 책에서는 사회학자 김찬호가 귀천에 대한 강박, 힘겨루기의 일상화 등으로 우리에게 굴욕과 수치심을 주도록 제도화된 사회를 비판하면서 “모욕을 쉽게 주는 사회 못지않게 위험한 것이 쉽게 모멸감을 느끼는 마음”이라고 경고했다. 근원적인 자존감이 파괴된 사람은 어떻게든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되갚아주는 방법으로 생존을 모색한다.
이에 비해 은 모욕(당하지 않는) 기술에 대한 실용서에 가깝지만 그 충고를 실천하려면 정신적 무장이 필요하다. 사회적 서열 경기에 관심이 없는 스토아학파는 모욕 사슬에서도 자유롭다. “모욕적인 것은 우리를 욕하거나 때린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모욕적이라고 판단한 우리의 생각임을 잊지 말라.” 스토아철학자 에픽테토스의 충고다.
남은주 문화부 기자 mifoco@hani.co.kr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공천헌금 1억’ 혐의 강선우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

스케이트 날이 휘면 다시 펴서…아픈 누나 곁 엄마에게 메달 안긴 아이

이 대통령 “다주택 자유지만 위험 못 피해…정부에 맞서지 마라”

쌓여가는 닭고기, 못 받는 쿠팡 주문...‘배민온리’에 갇힌 처갓집 점주들

트럼프, ‘공유사무실 쓰는 5인 원전 기업’에 일본 투자금 36조원 퍼주나

“집주인들 잔뜩 겁 먹었다”…서울 곳곳서 호가 낮춘 매물 쏟아져

‘어디서 3·1절을 팔아?’…전한길 콘서트, 허위 신청으로 대관 취소

‘계엄군 총구’ 안귀령 고발한 전한길·김현태…“탈취 시도” 억지 주장

몸에 피 한방울 없는 주검이 되어 돌아온 새 신랑

‘건진법사’ 전성배 징역 6년…김건희에 통일교 금품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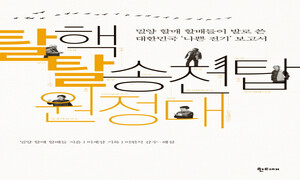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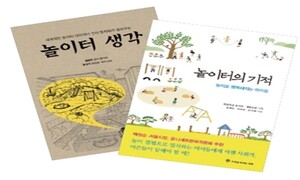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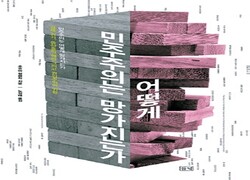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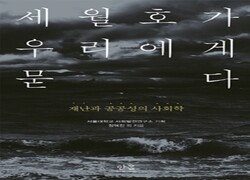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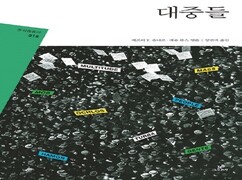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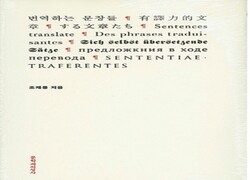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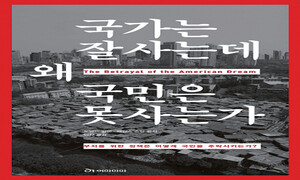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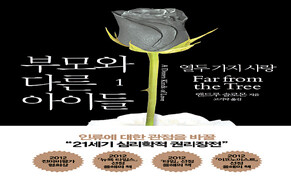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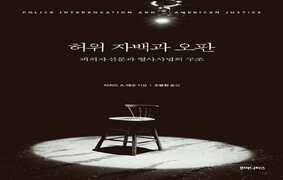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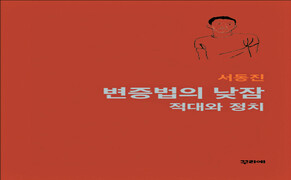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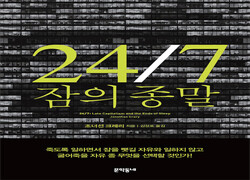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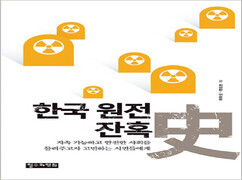




![[속보] ‘공천헌금 1억 수수’ 강선우 체포안 가결 [속보] ‘공천헌금 1억 수수’ 강선우 체포안 가결](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24/53_17719178646426_20260224503154.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