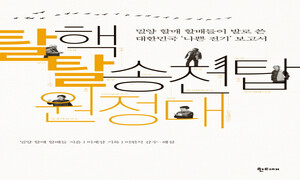1
만들기 쉽게 하겠다더니 너무 쉬웠던 것일까. 협동조합법이 2012년 12월 발효된 뒤 1년, 3천 개의 협동조합이 등록했다고 하는데, 그중 반은 개점휴업이다. 1호 협동조합도 딜레마에 빠졌다고 한다. 업체의 수수료를 낮추고 그 돈으로 기사의 복지를 향상시키려던 대리운전 기사들의 협동조합이었다. 협동조합의 이사장은 이렇게 말한다. “수익 모델이 문제였다. (…) 수익을 우선적으로 조합원 복지비에 쓰려고 한다. 그러면 투자자가 가져가는 몫이 적어진다. 반대로 투자자의 수익을 키워주려면 조합의 취지가 퇴색된다.”(제991호 특집 ‘만개한 협동조합 열매로 이어질까’) 아이디어로 승부할 수 있다, 적은 출자금으로 누구나 할 수 있다는 말은 이제 그만할 때가 되었다. 좀더 무르익은 협동조합 논의가 필요하다.
처음 시작하는 협동조합이 꿈꾸는 ‘롤모델’에 가장 가까이 가 있는 존재는 아이쿱생협이 아닐까. 아이쿱생협은 2013년 조합원 20만 명, 연매출 4270억원에 이른다. 생협 현장을 20년 이상 지켜온 아이쿱생협 생산법인의 경영대표인 신성식은 ‘장밋빛 꿈’만으로 생협을 유지할 수 없음을 에서 이야기한다.
저자의 가장 큰 고민은 자본주의 시장 안에서 자본과 어떻게 경쟁할 것인지다. 문제는 곳곳에서 터진다. 계약재배를 한 농민 조합원 중 일부가 약정가격보다 시장가격이 높다며 약정을 파기한다. 그러고는 다른 상인에게 판매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원래대로 약속을 이행한 농민 조합원은 이중의 손해를 입는다. 시장 출하를 하지 않아 손해를 본다. 이 농민은 다음에도 협동조합에 납품하는 약속을 이행할 가능성이 높은데, 약속 불이행 조합원으로 인해 협동조합의 신뢰는 하락했으니 그 또한 손해다. 소비자가 조합원으로 참여해 공동구매를 하는 협동조합이 있다고 하자. 소비는 책임이 아니라 권리에 가깝다. 공동구매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그에게 강제할 수는 없다. 조합원의 책임감은 한없이 작아질 수도 있다.
저자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협동조합만이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상품이 필요하며, 이 새로운 상품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 살아남기가 ‘자본주의’와 경쟁하는 ‘또 다른 자본주의’로 비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협동조합이 자본주의의 틀을 모방하느냐는 논쟁거리다. 아이쿱생협의 ‘효율성 우선’에 대한 비판, ‘국가 로컬푸드론’에 따른 농산물 공급 등에 대한 비판이 있었고, 책 뒤에 이에 대한 반박을 싣고 있다. 협동조합에 관한 논쟁도 무르익고 있는 것이다.
전체적인 틀을 짠 뒤 만들어낸 책이 아니라, 고민이 생길 때마다 그 테마로 글을 썼다. 경험한 사람,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고민을 나눌 만하다. 어렵고 정리되지 않은 부분도 적잖다. 친절하지 않다는 말이다. 문학동네 계열사를 벗어나 협동조합 체제로 바꾼 출판사인 알마에서 펴냈다.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장동혁에 발끈한 전한길, 야밤 탈당 대소동 “윤석열 변호인단이 말려”

김어준 방송 ‘정부-검찰 공소취소 거래설’에…민주 “황당함, 기 막혀”

한국 사회와 자존심 싸움…쿠팡 김범석은 ‘필패’ 한다

‘친윤’ 김민수 “장동혁 ‘절윤 결의문’ 논의 사실 아냐…시간 달라 읍소했다”
![[영상] 트럼프 “기뢰선 10척 완파”…CBS “이란 최대 6천개 보유” [영상] 트럼프 “기뢰선 10척 완파”…CBS “이란 최대 6천개 보유”](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11/53_17731951174124_1517731949679662.jpg)
[영상] 트럼프 “기뢰선 10척 완파”…CBS “이란 최대 6천개 보유”

이란 안보수장 “트럼프, 제거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국힘, ‘오세훈·김태흠’ 후보 신청 안 하자…“접수 기간 더 늘려요”

사흘 만에 입 연 장동혁 “의총 결의문이 국힘 입장”

미 국방 “오늘 이란 공격 가장 격렬할 것”…전투기·폭격기 총동원 예고
![[단독] 조희대 대법, ‘재판소원법’ 대응 TF 꾸린다…헌재도 실무 준비 [단독] 조희대 대법, ‘재판소원법’ 대응 TF 꾸린다…헌재도 실무 준비](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10/53_17731217429546_20260127500444.jpg)
[단독] 조희대 대법, ‘재판소원법’ 대응 TF 꾸린다…헌재도 실무 준비